- 좋은 드라마라는 자부심과 애정을 갖고 썼던 〈시티홀>은 작가주의가 아니냐는 공격까지 받은 적이 있고,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로맨스 드라마는 대중의 신데렐라 콤플렉스를 건드렸다고 비판받았다. ‘잘 만든 드라마’와 ‘사람들이 좋아할 법한 드라마’ 사이의 고민이 작가에게 늘 있었을 것 같은데 〈더 글로리>를 쓸 때는 어땠나.
= 예전엔 밤 10시에 지상파 3사 드라마가 동시에 방영돼 시청률을 줄 세우고 성패가 결정됐다. 요즘은 드라마 성공 기준이 매우 세분화되어 있다. 시청층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더이상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드라마는 나올 수 없다. 전체 시청률만 보는 게 아니라 2049 시청률을 살피고 4%에서 10% 정도만 나와도 성공했다고들 한다. 〈시티홀>은 정치에 대한 사심도 많이 들어갔던, 내가 무척 좋아했던 작품이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김은숙 이제 망했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작가주의’라는 표현을 돌려서 썼다. 사실 정답은 있다. 사람들이 좋아할 법한 드라마를 잘 만들면 되는데 그게 정말 어렵다. 시대에 따라 작품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도 한다. 예전에 정말 재밌게 본 드라마를 다시 보면 어떤 가치가 편향돼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지 않나. 그래서 ‘재미’와 ‘의미’ 중 하나라도 얻으면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더 글로리>는 흥행과 상관없이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였다. 결과에 연연하고 싶지 않았는데 정작 결과가 좋아서 연연하게 됐다. 사람 일은 모른다, 진짜. (웃음)
- ‘나 이만큼 잘 쓸 수 있는 사람이야. 보여줄게’ 하는 마음으로 집필했을 거라고 상상했는데. (웃음) 재미와 의미를 모두 가져갈 수 있는 작품 아닌가.
= 그렇지는 않았다. 나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부지런히 글을 쓰지 않으면 계약을 다 털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을 안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작품을 써야 할까. 사실 TV드라마를 하면서 시청률을 받아 보는 일이 그간 너무 괴로웠다. 그래서 OTT에서 작품을 하게 된 거다. 칼을 갈았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웠다. 나는 욕심껏 무언가를 잘해내서 계속 스스로를 증명해야 했던 작가다. 한번 잘하면 그다음 것을 더 잘해내야 하는 상황에 많이 지쳐 있었다. 어차피 이제 망한 것 같은데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욕심 없이 써보고 싶었다. 시청률이 나오지 않는 플랫폼이라 오히려 부담을 버릴 수 있었다. 재미와 의미를 모두 충족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내공이 있어야 한다. 대체로 재미와 의미를 모두 가져가려고 의식하다 보면 오히려 대본이 밋밋해진다. 〈더 글로리>는 사회적 이슈도 있었고 여러모로 운이 좋아서 사람들이 좋게 봐준 작품이다. 그런데 작가가 매번 그렇게 운이 좋을 수는 없다. 재미와 의미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단연 드라마는 재미가 먼저다. 우리가 드라마 얘기를 할 때 “그 드라마 재미있지 않냐?”고 하지 “그 드라마 정말 의미 있지 않냐?”고는 안 하지 않나. 후배들에게도 “드라마는 문학이 아니라 수학이다. 섬세하게 계산해서 써야 한다”고 늘 얘기한다.
- 전세계에 동시 공개되고 몰아보기가 가능한 OTT 플랫폼의 특성 때문에 TV드라마 대본과 다르게 접근한 부분이 있었나.
= 없었다. 처음에는 넷플릭스에서 19금으로 찍을 수 있으니 더 높은 수위에 도전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도 나눴는데 어쨌든 한국 시청자가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넷플릭스여도 한국 시청자가 가장 많이 봐야 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다시 작업했다. 다만 몰아보기가 가능하다 보니 모험적인 캐스팅을 할 수 있었다. 원래 각인되어 있지 않은 배우라도 각인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연배우들을 과감히 선택할 수 있었다. 하도영 역의 정성일씨가 그중 하나다. 그리고 직접 경험해보니 나와 넷플릭스가 잘 맞는다. 주 2회씩 방송되던 드라마는 짧게는 두달, 길게는 세달 동안 매주 평가를 받으며 작가가 소환되어야 한다. 20년 동안 그런 부담을 짊어지다 보니 많이 지쳤다. 그런데 넷플릭스는 한번에 비판이든 찬양이든 관심이 집중됐다가 다른 신작이 공개되면 소강된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잊힐 수 있어서 너무 좋다.
http://m.cine21.com/news/view/?mag_id=1040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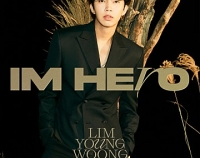



 실시간 기인 몸값 근황 ㅋㅋㅋㅋㅋ
실시간 기인 몸값 근황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