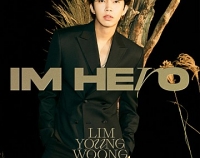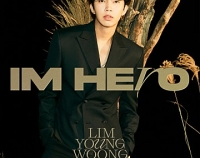![[프로듀스101/강다니엘] 요즘 사채업자들은 탈취가 취미인가요? 내 돈, 내 마음, 내 전부! (+ 투표 有) | 인스티즈](http://file2.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17/05/29/20/98798beec4edce17c2188552e77a2dcd.jpg)
엄마가 죽었다. 제 아버지가 자신의 유흥을 위해 끌어다 쓴 사채는 눈덩이처럼 불어 제 집을 주저앉게 만들었고, 결국 술에 거하게 취한 아버지는 직접 운전대를 잡고 그렇게 한 마디 작별 인사 없이 저희 곁을 떠났다. 이후 늘어가는 이자 덕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게 일상이 된 터라 집을 드나드는 사채업자들을 숱하게 봐온 저로서는 그런 엄마의 죽음이 이해가 가질 않았다. 대체 왜 그랬어? 그래, 그날따라 왠지 기분이 그렇더라. 여느 때와 다르게 친구들의 손길을 뿌리치고 들어선 집안은 평소보다도 싸한 공기로 저를 맞이했다.
" 엄마, 나 왔어. "
ㅡ ...
" 왜, 답이 없어... "
자신의 목을 천장에 매단 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엄마는 잔혹함 그 자체였다. 엄마, 엄마... 좁은 단칸방을 감도는 싸늘한 적막은 이내 무겁게 가라앉았다. 좁은 원룸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엄마의 주검이었다. 잔뜩 낡은 운동화도 벗지 않은 채 나는 그렇게 한참이나 현관에 서 아이처럼 소리 내 울었다. 3년, 집이 주저앉은 뒤 제가 집에서 처음으로 한 감정 표현이었다. 화장대 위 가지런히 놓인 편지 한 장과 통장 하나. 그것이 엄마가 자신의 목숨을 끊으며 열여덟인 제 딸에게 남긴 전부였다.
" 아직 상납일 안 됐잖아요. "
ㅡ 가시나, 까칠하긴. 그게 아니라 이번 달부터 니 찾아가는 새끼 바뀔 거라고, 거 전해 줄라고.
그렇게 엄마의 죽음과 더불어 저는 학교를 관뒀다. 퍽이나 아버지의 핏줄인 저라고, 부모님이 남기고 간 막대한 빚덩이는 모두 그의 딸인 제 몫이 되었다. 하루 종일 아르바이트를 뛰어가며 이자만 겨우 상납일을 맞춰 갚아나가던 참이었다. 여느 때와 다를 것 없이 상납일 하루 전, 혹은 이틀 전에 걸려오는 익숙한 전화에 저도 모르게 날을 세워 전화를 받기가 무섭게 들려오는 목소리가 뜻밖의 말을 내뱉었다.
근데 그게 뭐, 상관이 있나.
달랐다, 오늘은. 항상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 무작정 찾아와 제자리에서 상납까지 받아 가던 놈들이었기에 곤란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데 상납일을 하루도 어긴 적 없던 놈들이 오늘, 제 아르바이트 장소에 오지 않았다. 뭐, 내 알 반가. 지들이 급하면 알아서 연락하고, 알아서 찾아오겠지. 안일한 생각과 함께 제 집으로 통하는 골목길에 들어서자 제 집 앞에 보이는 낯선 인영 하나.
" ㅇㅇㅇ 씨 되십니까. "
" 네, 맞는데... "
검은색 수트를 반듯하게 차려입은 젊은 남자 하나가 제 이름을 나직하게 불러왔다. 밝은 갈색으로 물들인 듯한 머리는 오밤중 저희 사이를 밝혀 주는 등불이라도 되듯 제 위용을 드러냈다. 제 대답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남자를 보는데, 그러니까...
" 앞으로 ㅇㅇㅇ 씨 상납은 제가... "
" 아저씨. "
" 예? "
" 아저씨 존나 잘생겼네요. "
좆나게 잘생겼다, 요새 사채업자는 얼굴 보고 뽑나?
![[프로듀스101/강다니엘] 요즘 사채업자들은 탈취가 취미인가요? 내 돈, 내 마음, 내 전부! (+ 투표 有) | 인스티즈](http://file2.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17/06/05/16/bcc128710fdaa795ae2cba679f757865.gif)
강다니엘, 서른 살. 그 뒤로 남자는 정말로 제 상납을 도맡았다. 언제나 자주 바뀌던 게 저를 찾아오는 이였는데 이번에는 꽤나 오래 고정하려는 모양인지 벌써 남자를 본 것도 석 달이 넘었다. 그리고 그 석 달 동안 제가 알아낸 것이라곤 이름과 나이, 그 두 가지가 전부였다. 그래, 그렇게 잘생겼는데 얼굴값을 안 할 리가... 그래도 제게 다나까로 말을 뱉으며 딱딱히 할 말만을 하던 석 달 전과는 다르게 요즘은 제게 말도 까고, 농도 던지는 남자였다.
" 니 또 만 원 덜 보냈더라. "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널 보러 여기까지, 엉? 왔고. 그치, ㅇㅇㅇ 씨?
그랬다. 어느 순간부터 제 관심과 눈길이 부담스러웠는지, 혹은 그냥 오는 게 단순히 귀찮았던 건지. 계좌로 상납을 받는 그가 제 눈에 띄지 않자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이거였다. 만 원 덜 보내기. 그렇게 도박을 걸었던 제 시도는 다행히 성공이었다. 만 원을 덜 보낸 다음 날, 남자는 바로 저를 찾았다. 그리고 그게 벌써 두 달. 그렇게 남자는 제 새까만 속을 훤히 들여다봤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 원을 덜 보낸 다음 날이면 항상, 제게 찾아왔다. 그러니 만 원을 덜 보내는 걸 멈출 수도 없었던 거고.
" 제 얼굴 한 번 더 보고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 "
" 엉, 안 그래요. "
자연스레 남자에게 팔짱을 끼며 눈웃음을 흘리자 남자는 그런 저를 빤히 바라보다 이내 유한 웃음과 함께 시선을 돌렸다. 그래도 처음 제 팔짱까지 거부하며 딱딱한 모습을 보일 때와는 다르게 이 얼마나 장족의 발전일까, 싶기도 하고. 허나 그런 속마음과는 다르게 삐뚤어진 생각이 이내 필터링을 거칠 새도 없이 튀어나갔다.
" 아저씨 고자예요? "
" ... 뭐? "
아니, 그렇잖아. 이렇게 새파랗게 어린 기지배가 꼬시는 중인데 안 넘어올 건 또 뭐야? 진심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 열심히 미간을 구기며 남자를 흘기자 이내 남자가 어이없다는 듯 짧은 실소를 터뜨렸다. 그리고 이어지는 남자의 말이.
" 야, 너 몇 살이냐? "
" 저 열아홉이요, 그것도 몰랐어요? "
" 그래, 너 열아홉이지. "
그럼 난 몇 살인데. 아저씨는 서른이죠, 뭐 당연한 걸 묻고 그래? 제 나이도 모른다는 듯 뱉어낸 남자의 질문에 퍽 기분이 상해 자신의 나이를 묻는 남자에게도 퉁명스러운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자 자신에게 편하게 제 어깨에 어깨동무를 하며 제게 몸을 기댄 남자가 가만히 제 귀로 자신의 목소리를 흘렸다.
" 그러니까, 아저씨 잡혀가는 꼴 보고 싶어서 그르냐? "
아, 무슨. 요새 나이차 많이 나는 부부들 존나 많거든요? 누가 아저씨 아니랄까 봐. 좆나 고리타분해, 썅. 잔뜩 어긋나는 기분에 속이 뒤틀려 부러 좋지 못한 말을 뱉었다. 그러자 절 한 번 흘긴 남자가 이내 제게 기댄 자신의 몸을 떼어내며 자신의 마이 안쪽을 뒤적였다. 그리고 나타난 지갑에서 만 원짜리 아홉 장을 꺼낸 남자가 다시금 입을 열었다.
" 이게 니가 여태 나 불러내겠다고 빠뜨린 거, 아홉 장. "
그게 뭐요, 또. 웬일인지 제가 여태 빠뜨린 구만 원을 제게 들이밀며 꽤나 진지하게 얘기를 꺼내는 남자의 모습에 절로 긴장하며 숨을 죽였다. 아, 씨팔. 앞으로 짤 없다 그럼 어떡하지. 그렇게 쓸데없는 고민과 생각에 잠겨 제 세계에 잔뜩 빠지려는 찰나, 남자가 제게 기대며 다시금 제 귓가에 속삭였다.
" 이거 백 장 되는 날까지 보자, 그럼 다 크겠네. "
와, 씨팔... 내 돈, 내 마음에 이어 내 전부를 탈취할 기세인 이 남자 신고 가능할까요?
ㅡ 초록글, 댓글, 추천, 스크랩 모두모두 감사합니다. (--)(__) ~ 항상 빠짐없이 댓글 읽고 있으니 글에 관한 내용, 피드백모두 자유롭게 남겨 주셔도 괜찮습니다. ㅎㅎ
ㅡ 원하시는 단편 소재가 있으시다면 언제나 댓글로 신청 바랍니다.소재를 주신다면 어울리는 주인공과... 아무튼 제 기력이 닿는 데까지 열심히 적어오겠읍니다...
+ ) 그래요, 작가가 또 미쳐서... 갑자기 단편이 아닌 제목 뒤에 숫자를 하나씩 달아가면서 쓰는... 그거 있잖아요, 장편... 아무튼 그런 게 쓰고 싶은데 어떻게 투표 좀 해 주시면... 아니 진짜 쓰겠다는 게 아니라 고민만 조금 해 볼게요, 진짜... 근데 저 진짜 단편 아닌 글 쓰려면 스토리 구성하고, 글 적고, 뭐 하고 하느라 시간 진짜 오래 걸리는데 그래도 어떻게 투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투표로 결정하는 거 하나도 없고 진짜 딱 그냥 딱 여러분 생각만 보고 싶어서 진행하는 투표이니까... 아무튼 오늘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초록글
초록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