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가 민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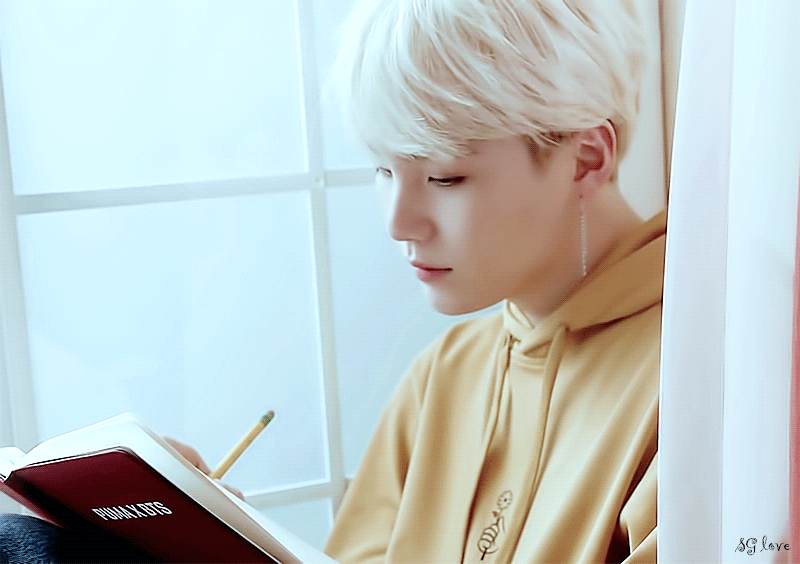
1930년 X월 X일
“이번 지령은 민윤기 동지에게 맡기겠네. 자네도 알듯이, 이미 우리는 너무 많은 노출을 당했네. 그나마라도 노출 되지 않은 동지가 자네와 김예빈 동지뿐이네. 미안하지만, 맡아줄 수 있겠나.”
단정하게 한복을 차려입고, 지긋이 연세를 드신 듯한 남성이 새하얗다 못해 창백할 정도에 피부를 지닌 젊은 남성에게 얘기했다. 젊은 남성은 한치에 망설임 따위는 없었다.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에 앞머리를 쓸어넘겼고, 앉아있던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굳게 다물었던 입을 열었다.

“알겠습니다. 대신.. 예빈이에겐 알리지 말아주세요. 알면 또 걱정하니까.”
그 말을 남긴 남성은 뒤이어 들려오는 대답을 듣지 않고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위치한 찻집에서 나왔다. 어딘가를 바라보는건지 모르는 초잠없는 시선과 삶의 의미가 없어 하는, 그런 걸음걸이로 골목을 앞질러 한참을 걷다 곧이어 무너질 듯한 작은 집에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마당에는 진돗개에 새끼로 추정되는 작은 강아지가 있었고, 그 강아지를 잠깐 쓰다듬어주고는 집안으로 들어가자 보이는 만삭에 여성. 늦은 시간까지 남성을 기다리다 잠든건지 이불조차 깔지 않고 마루바닥에 누워 잠에 들어있었다.

“기다리지 말라니까..”
그는 그런 그녀를 보고는 마른세수를 두어번 하고, 공주님 안듯이 그녀를 안아 방으로 들어갔다. 작고 허름한 방안에는 그래도 깨끗하고 단정하게 정리가 되어있었고, 깔려있는 하얀 이불에는 얼룩 하나 있지 않았다. 방만 봐도 잠이든 그녀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듯 했다. 깨끗하게 정리된 방을 그는 한번 둘러보고는 그녀를 이불 위에 눕혔고, 꼼꼼하게 이불까지 덮어준 뒤 벽에 걸려있던 옷으로 갈아입었다. 하얀 와이셔츠에 코트. 모자까지 꼼꼼하게 쓰고는 잠든 그녀에게 다가갔다.
“예빈아, 나 다녀올게. 걱정말고 있어. 아가, 너도 아빠 오기전에 나오면 안된다. 엄마 혼자 힘들테니.”
말을 끝내고는 그녀의 이마에 짧게 입을 맞추고, 배를 쓰다듬어준 뒤 집을 나섰다. 그리고 기차역으로 향했다. 이번 지령은 그와 그녀의 고향인 경상도로 가서 그쪽에 있는 동지에게서 폭탄을 전달받아 가져오는 것. 꽤나 위험한 지령이였다. 만약 폭탄을 들킨다면, 목숨을 장담할 수 없는 일이였다. 그렇다고 이 지령을 거절하고 싶지는 않았다. 사람들 모두가 망국이라 하지만, 그는 조선인이고 조국을 지키고 싶었다. 자신은 죽는다 한들, 그녀의 뱃속에 있는 자신의 아이만큼은 왜놈들의 눈치를 보며 배 곯으며, 왜놈들에게 빌어먹고 사는 그들의 발을 닦게 하고싶지 않았으니.

“성공하고 가서, 예빈이랑, 우리 애기 얼굴 한번 보고싶은데.”
그는 쓸쓸한 표정으로 기차에 올라탔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벌써 그가 이 곳에 올라온지도 2년이 넘었다.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고, 남부러울 것 하나 없이 자랐다. 그걸로도 만족했다. 자신이 왜놈 기분 맞춰가며 사는 부모님의 자식이여도.. 밖에 나가보면 같은 조선인 남자아이들을 보면 ‘아, 저렇게 사느니.. 나중에 돌 맞아죽어도 지금이 났구나.’ 하고 살아갔다. 하지만 그것도 어린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였고, 그가 19살 되던 해. 일본 경찰부장의 딸과 혼사가 오갔다. 그건 아무리 그였어도 죽기보다 싫었다. ‘그래도 나는 조선인인데..’ 혼사가 오가던 중, 그제서야 그의 눈에는 조선이 보이기 시작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그들은 불령선인이라고 칭했다. 그리고 왜놈들은 그들을 무차비하게 죽여갔다. 그때 그는 이대로 살아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그리고 무작정 자신에게 있던 돈을 들고 집을 나섰다. ‘그들이 이렇게 열심히 싸우는데, 나도 보탬이 되야 해.’ 그는 그 생각 하나로 집에서 나왔고, 독립운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만난게 김예빈. 그녀였다. 그녀도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소녀였고, 그녀에게 알수 없는 감정이 들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왠만한 독립운동가들이 숨어있는 은신처를 듣고 찾아갔다.

“오랜만이네. 이 곳도. “
그가 고향을 떠나오고 나서 처음 발을 들였다. 2년전과는 확실히 많이 변한 이 곳. 자신의 고향에 왔다는 생각에 조금은 설레기도 했지만, 이내 마음을 단단히 먹고 거래를 하라던 여관으로 발을 돌렸다. 그리고 주머니에 있던 그녀의 사진을 꺼내 보며 그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띄우며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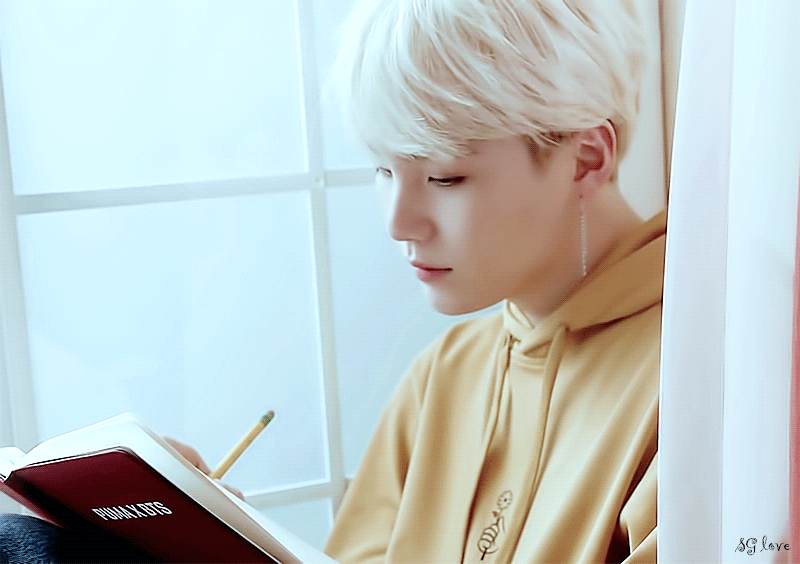
“예빈아, 아가. 내가 꼭 성곡해서 갈게. 예빈이 네 걱정대로.. 내가 우리 아기한테까지는 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을 물려주지 않을게. 사랑한다.”
그는 그 말을 남기고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아내의 사진을 보고 주머니에 다시 넣은 뒤, 여관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초록글
초록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