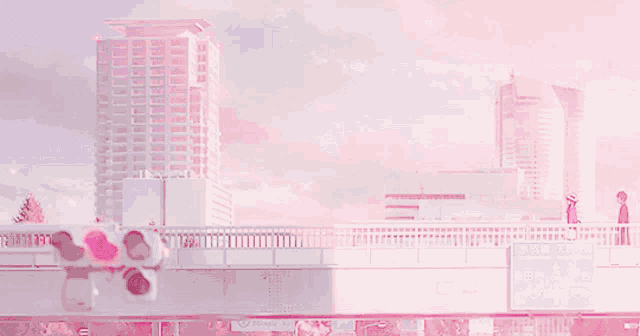오늘도 브금 재생해주기! 그러니까 기억을 되짚어보면... 2011년이지 아마. 난 소위 말하는 집순이였다, 그것도 최강 집순이. 주변에서 아무리 나오라고 해도 절~대 나가지 않는 그런 사람. 오늘 밤 그 말만은 말아요~! 왜 날 버리고 갔나요~! 그날도 어김없이 엠피쓰리에서 주구장창 흘러나오는 다비치의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를 들으며 한창 노래나 듣고 있었을꺼 울리는 전화에 인상을 잔뜩 찌푸리며 버튼을 꾹 눌러 받아냈다. “네에, 여보세요.” “어, 야 이름아. 마침 잘 받았다! 너 좀 나올 수 있어? 아니, 내가 이번에 사무실 새로 마련했잖아. 와서 짐 나르는 것 좀 도와주라.” “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소리는 개소리인가? 아니면 진정 사람이 말하는 소리인가, 아님... 21세기라서 사람이 짖을 줄 알게 된 걸까. 대뜸 주말 아침부터 전화를 걸어선 짐을 옮겨달라는 상대가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본인만 나랑 친한 줄 아는 복학생 선배임에 더 짜증이 확 올랐다. 거절을 하려고 입을 떼려던 찰나, “아니 친구 놈이 도와주러 온다고는 했는데, 이게 좀 손이 모자를 것 같아서. 진짜 미안하다야, 어?” “선배 저 근데 가봤자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짐만 될 것 같은...” “딱 한 번만 부탁할게, 니가 원하는 걸로 밥 쏠게! 금액 상관 없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결국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난. “...아 벌써 집 가고 싶은데.” 지하철을 타고 선배의 사무실이 있는 동네로 향하고 있었다.
전남친과 직장에서 재회할 확률은? (100점) 02 w. 보로 진짜 성이름 너도... 밥 사준다고 하면 쫄랑쫄랑 나가는 버릇 좀 고쳐라. 그와중에 사무실 개업 축하드린다며... 비타오백이 가득 채워진 박스며 뭐며 바리바리 양손에 들고 온 나도 참 호구지. 한창 후회를 하며 한숨이나 푹푹 내쉬고 있었을까, 사무실이 있다는 건물로 들어가니 빼곡해 보이는 계단들에 더욱 한숨만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사무실이 몇 층이라고 했지? 그래도, 올라가야지. 여기서 포기할 수 없, 아으윽 올라가기 시러잉.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었을까 뒤에서 들려오는 헛기침 소리에 몸을 파드득 떨며 급히 뒤를 돌아봤다.
“저기, 혹시 올라가시는 거예요?” “네? 아, 아.” 뒤에서 머쓱하게 선 채 머리를 긁적이며 말해오는 남자에 무슨 소리지? 하는 멍한 표정으로 바라보기만 하고 있었을까, 이내 계단을 통째로 막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눈을 동그랗게 뜨며 급히 옆으로 비켜섰다. 아웅, 민망해... 씨. 딴 것도 아니고 잘생긴 남자 앞에서. “아, 죄송해요. 그 올라가시는구나, 그쵸! 아니, 그쵸 당연히 올라가시겠죠... 여기가 1층인데 내려가실 리는 없을 테고. 네, 먼저 올라가세요! 죄송합니당.”
“네, 감사해요.” ...뭐지, 왜 웃지. 내가 웃긴가. 한참 외톨이 부르는 아웃사이더 마냥 속사포 랩을 쏟아내고 있었을까 웃음을 터트리더니 먼저 계단을 올라가는 남자에 갸우뚱하며 한창 뒤따라 한 2층 정도 올라갔을까, 갑작스레 뒤를 돌아보는 남자에 그대로 헉, 하며 동그래진 눈으로 멈춰섰다. “그 박스, 무겁죠. 들어드릴게요, 몇 층 가세요?” “네? 아뇨, 제가 들 수 있는데... 아 저는 5층 가요.” “5층? 아, 성민이가 불렀다고 하던 후배 분이시구나. 성이름, 맞죠 이름. 들어줄게요, 줘요. 어차피 같은 층 가는데요 뭘.” “네? 아 그 선배 친구 분이세요?” “네, 아 내 이름을 안 알려줬구나. 김선호예요, 성민이 친구.” 뭐지? 그 주제에 그 성격에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랑 친구야?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멍청한 생각을 한창하고 있으니 가벼워지는 손과 그렇게나 무거워서 두손으로 낑낑대며 들고 온 비타오백 박스를 한 손으로 거뜬히 들고 먼저 올라가는 남자, 아니 선배 친구 뒤를 입을 꾹 다문 채 졸졸 따라 올라갔다. 뭐지, 저 박스 저렇게 가벼운 게 아녔는데. “뭐냐, 너네 어떻게 같이 와?” “아 그ㄱ,” “이 앞에서 만났어, 넌 인마 불렀으면 앞에 좀 나오고 그러지. 이걸 혼자 들고 올라오게 하냐.” “야 이런 건 또 왜 사왔어, 그냥 짐만 옮기는 거 도와달라니까.” “그래도 처음 오는 건데, 빈손으로 올 순 없잖아요.” 저 새끼는 사와도 지랄... 안 사와도 지랄... 뱉지도 못할 말들은 속으로 삼키며 꾹꾹 누르며 주먹을 꾹 눌러쥐었다. 내가 오늘 일 끝나고 밥만 얻어먹으면... 기필코 저 새끼 차단 박고 잠수 탄다. ~ “다 끝났네! 니네 아녔으면 나 혼자 옮기다가 뒤졌을 걸.” “이름 씨 고생했어요. 힘들었죠, 이것저것 옮길 게 워낙 많아서.” “네? 아니에요, 제가 오고 싶어서 온 건데요 뭘.” “그래도 되게 착하네, 넌 진짜 이런 후배 둔 거 복이다. 수고 많았어요.”
그러곤 웃으며 하이파이브를 하자는 둥 손을 먼저 들어보이는 것에 그대로 따라웃으며 팔을 뻗어 손을 맞댔다. ...이 사람 주변 사람들한테 진짜 인기 많겠다. 백퍼 여친도 있겠지 뭐. 잘생기고, 성격까지 좋은 사람들은 백이면 백 여자친구가 있는 걸 알았기에, 맘 같아선 번호라도 물어보고 싶지만 그대로 맘을 꾹 눌러담은 채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성이름 너 뭐 먹고 싶은데, 다 말해봐.” “진짜 다 말해도 돼요?” “야, 당연하지. 내가 그 정도도 못 해주겠냐?” “그럼 저는요, 소고기로 사주세요.” 그대로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아버리는 성민 선배와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소리 내어 웃기 시작하는... 선배 친구, 아니 선호 오빠를 본 건 분명 착각이 아니었다. ~ “저기요, 성이름 씨. 얘, 내 말 들리는 거 맞지?” “...어, 어? 어. 아 미안, 나 잠시 딴 생각했나봐.” “어쩐지, 애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안 하더라. 야, 근데 김 팀장님 손 봤어?” “손? 갑자기 무슨 손.” “아니, 반지 말이야. 끼고 계신 반지. 여자친구 있으신 것 같지.” “어?” 한창 처음 만났던 날을 회상하고 있었을까 들리는 지영이의 목소리에 겨우 정신을 차렸다. ...뭐 반지? 지영이의 말에 커지려는 눈과 목소리를 애써 억누르고 김 팀장, 아니 김선호가 앉아있는 자리를 눈으로 좇기 시작했다. 깔끔하게 넘긴 머리야 뭐... 어제랑 똑같고, 사원증 메고 있고, 그리고 손에는 반지가... 뭐야, 저 반지? 분명 없을 거라는 제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네 번째 손가락에 정갈하게 끼워져있는 반지에 그대로 벙쪄버렸다. 아니, 여자친구가 있다고? 그치, 우리가 헤어진 지 벌써 2년이나 되긴 했는데. 그래 여자친구 있을 수 있지, 있을 수 있어. 근데 그럼 어제 번호 안 바뀌었다고 말하고 갔던 건 뭔데? 연락하라는 거 아녔어? 어젯밤 연락을 먼저 보낼까 말까 고민하다 결국 괜한 자존심 때문에 보내지 못한 내 자신이 삽시간에 미워지기 시작했다. 다정함은 범죄야, 죄악이야. 지가 착각하게 만들어놓고... 어? 밀려오는 억울함과 분함에 입술을 꾹 말아물고 한참 일하고 있는 옆얼굴을 뚫어져라 보고 있으니,
‘일 안 합니까?” 입모양으로 말하는 것도 얄미워, 미워죽겠어. ~ 어김없이 다가온 퇴근 시간에도 아까 손가락에 끼워져있는 반지를 본 뒤로부터 팍 상한 빈정에 애꿎은 짐만 푹푹 눌러대며 싸기 시작했다. 저 먼저 들어갑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사무실을 나서는 것에 주변 눈치를 보다 지영이며 팀원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발걸음을 급히 해 엘레베이터로 향하니 보이는 낯익은 얼굴에 그대로 올라타 닫힘 버튼을 꾸욱 눌렀다.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에라 모르겠다, 싶은 마음에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저기 팀장님.” “네.” “...어제, 번호 그대로라고 하셨던 거, 왜 알려주신 거예요?” “아, 그거요.” 이게 뭐라고 괜히 긴장 되는 거야. 아, 하며 제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말을 이어오는 것에 괜히 손톱 밑 살을 괴롭히고 있으니 돌아오는 대답에
“이제 같은 팀에서 일할 거니까, 업무 때문에 어떻게든 연락하게 될 일 생길 거잖아요. 번호, 알죠? 따로 알려줄 필요 없이 그걸로 저장하시라고요.” 난 그대로 벙찔 수 밖에 없었다. - 아~,, 참 미운 사람... 암호닉은 계속 받고 있어용 완결되고 나면 텍파,,, 암호닉 한정으로 보낼예정 [똑딱이] [왈왈] 고마워요잉(^з^)-☆


![[김선호] 전남친과 직장에서 재회할 확률은? (100점) 02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0/12/03/16/35c3d51c89f9a517c76c645a7dd9b4f7_mp4.gif)
![[김선호] 전남친과 직장에서 재회할 확률은? (100점) 02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0/12/05/22/ee75bffb87d4b9d353d678b3ce9068fb_mp4.gif)
![[김선호] 전남친과 직장에서 재회할 확률은? (100점) 02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0/12/01/1/4963bfc199351ab87e516be45cf3801e_mp4.gif)
![[김선호] 전남친과 직장에서 재회할 확률은? (100점) 02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0/12/05/22/6f754cf532b7eee0ffaf15fe93256a1a_mp4.gif)
![[김선호] 전남친과 직장에서 재회할 확률은? (100점) 02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0/12/05/22/9ba66e4233dde33b2cfb50085b92d101.gif)
![[김선호] 전남친과 직장에서 재회할 확률은? (100점) 02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0/12/05/22/17717c75e193551224b368c765ebadeb_mp4.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