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가 길어져 늦었습니다.
/
“어. 왔냐.”
“예...”
교무실로 가자 담임은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그저 내 얼굴을 보기만 했다.
“...왜요?”
평소 친한 쌤이긴 했지만
남의 얼굴을 눈 앞에서 찬찬히
감상중인 사람은 누구든 부담스럽기 마련이다.
나는 대체 이 선생님이 뭐하는건가,
싶어 먼저 말을 꺼냈다.
“김한빈아. 니 어디 아프냐?”
“예?”
“얼굴이 영 아니긴 한데. 골골대는 거 같지는 않고...
고민있냐?”
젊어서 그런가
애 같은 구석이 있는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워낙에
아이들에게 신경을 많이 쓰는 선생님이기도 했다.
작년에 김여주랑 같은 반일 때부터
좋아했던 쌤이었다.
물론 김여주도.
그래서 아주 아-주 가끔 질투를 하긴 했지만.
고민상담은 물론, 가끔 연애상담도 해주곤 하시는
좋은 쌤이다.
“김여주랑 싸웠냐?”
“...”
“맞네, 싸웠네, 싸웠어.”
“....선생님이 할 일도 없나. 남의 일에 관심이 많아요...”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하거든여? 학생은 신경끄시져?
그리고 니 일은 신경쓸거거든요? 나는 선생이니까.“
“...이런 것도 권력남용인거 같은데요.”
쌤은 내말을 깔끔히 무시했다.
“짜식아. 그 나이땐 말이야. 좀 더 사랑해도 돼.”
“네?”
내가 예상했던 대화 주제와는 다른
사랑타령에 나는 조금 놀랐다.
“나처럼 나이 들면 어차피 사리게 돼있어. 그러니까
어릴땐 더 맘껏, 더 열정적으로 좋아해도 된다고.
어린 놈이 뭐가 그렇게 무섭냐?“
“별로...그런거 아닌데...”
아, 물론 조금 찔리기도 했다.
솔직히 ‘쌤...귀신이신가?‘ 싶었다.
“어릴땐 다 괜찮아.
자존심 버려도, 미친 듯 매달려도, 세상 무너진 듯
울어도, 어려서 그랬다. 한마디면 다되는 나이라고.“
“아...”
“그러다 나중에 후회한다? 불을 보고도 뛰어들지 못한
한낱 고상한 나비가 된 걸. 두고 두고 후회할거다.“
“...쌤...”
역시나 국어선생은 말발부터 달랐다.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
교무실에서 선생님을 만난 길에
김여주의 담임선생님께 붙들렸고,
한가지 일을 맡아버렸다.
바로 학급행사 준비위원인 김여주의 일을
도와주라는 것이었다.
이 일을 맡게 된 이유는
첫째, 내가 눈에 띄어서
둘째, 김여주의 남친이라는 이유로.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하는지
김여주의 담임에게 저희 헤어졌어요, 라고
말할 수도 없었다.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아서였다.
이미 기정사실이긴 하지만
말하고 나면 정말로
얼굴보기도 힘들까봐.
그냥 입을 꾹 다물었다.
물론 지금도 얼굴을 보기는 조금 힘들지만.
이런 나를 아는지 모르는지
김여주의 담임쌤은 내게
김여주랑 방과후에 남아 일을 하라고
일거리를 잔뜩 안겼고,
나는 어쩔 줄 몰라하다 결국
그 일을 들고 반으로 돌아와야했다.
우리 반 담임은 그런 내 모습을 보고도 눈도 깜짝 안했고,
종례를 마치자마자 친구 녀석들도 빠르게 귀가했다.
정말이지...
다들 짜고 치는게 아니고서야
어쩜 이렇게도 녀석과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지는 건지.
“아니지, 굳이 같이해야 돼? 혼자하면 되지.”
혼자 남은 교실에서 그 궁상을 떨었더랬다.
항상 이놈의 오기가 문제였다.
처음 이별을 맞았을 때였던 거 같다.
그때 헤어지자는 말을 꺼낸 것은 너였다.
나는 그때 너의 남사친인가 뭔가 하는 주변남자들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있었다.
그래서 헤어지자는 너의 말에 나도 홧김에 그래 그러자 했다.
지금에서야 깨달았지만
너는 그때 많이 힘들었던 것 같다.
그냥 아는 사람이고 친구일 뿐이라는 네 말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속으론 전혀 믿지 않았던
나를 보며 너는 점점 지쳐갔던게 아닐까.
고집이 센 나 때문에
그때 우린 다시 만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었다.
항상 너에게만 고집불통이라 놀리며,
그 성격 좀 고치라 타박했지만
정작 고쳐야할 사람은 나였을지도 모른다.
그때 뜬금없이 울리는 전화의
수신자는 엄마였다.
“여보세요...”
-“어, 아들. 아직 학교야?”
“어.”
-“해도 져가는데? 학교가 학생한테 무슨 일을 그렇게 시킨다니~?
그것도 꼭 너랑... 아, 아니다.”
“뭐야, 갑자기. 왜 그러는데?”
-“아니, 별건 아니구... 혹시, 아들. 지금 여주랑 같이 있니?”
“어? ...아닌데.”
우리 엄마는 나랑 김여주가 사귄다는 것을 알고있었다.
그건 김여주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아니, 오늘 엄마가 여주네 놀러를 갔잖니?”
게다가 두 분은 친하기까지 하셨다.
하지만 두 분 다 우리가 그동안 몇 번이나 헤어진 걸 전혀 모르셨다.
헤어질 때 마다 타이밍을 놓쳐서 일수도 있고,
굳이 그런 걸 알려서 두 분 사이까지 망칠
필요있나 싶어서 였기도 했다.
어쨌든 나는 지금 엄마의 뜬금없는 김여주의 이야기에
이게 하루에 몇 번이나 듣는 김여주 소식인가 싶었다.
대체 다들 왜 나만 보면 김여주 이야기인가...
주변사람들은 마치 우리를 부록처럼 항상 엮어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그게 싫지가 않았다.
-“글쎄, 여주가 아직도 안들어 왔대. 전화도 안되구.”
![[iKON/김한빈] 문제적 커플 번외 - 5 | 인스티즈](http://file2.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15/11/14/21/0d2a168ca19242142dbdb6f2da53a7e1.png)
안 들어와?
-“여주 엄마가 안 그런 척 해도 걱정을 엄청 하더라구~
난 또 너랑 있는 줄 알고.
아직 시간도 얼마 안됐는데 곧 들어오겠거니~ 했지.
어쩌나...“
갑자기 김여주가 사라졌다는 얘기에 나는
엄마의 전화를 그냥 끊어 버렸다.
분명히 김여주네 담임선생님께서
내게 녀석과 남아 일을 마무리하라 했었다.
그럼, 녀석이 있어야 할 곳은 당연히
녀석의 반이라던가, 학생회실 정도?
어쨌든 학교 안에 있어야 할 터였다.
이상하게 불안한 마음에
뛰쳐나가 온 학교를 뒤졌지만
녀석은 보이지 않았다.
이 기집애가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나는 지금 내가 무슨 상황인지 생각도 못한 채
익숙한 11자리를 눌렀다.
신호음은 가는데 받질 않는 전화에
몇 번이고 다시 했지만
전혀 받지 않았다.
답답함에 휴대폰을 던져버릴려다가 힘을 뺐다.
그래, 내가 뭐라고.
걔 걱정을 해.
어디서 놀고 있겠지.
나는 책상에 산더미처럼 쌓인 일거리를
쳐다보았다.
“일은 또 왜 이렇게 많아?”
본능적으로 또 신경질을 내버렸다.
생각해보니 너는 이렇게 많은 일도 늘
너 혼자 해냈다.
너는
변덕스럽고 까칠하기는 또 하늘을 찔러서
같이 일하는 애한테 늘 화내기 일 수 였다.
나중엔 본인도 후회를 하면서도
버릇을 고치기가 영 힘들어보였다.
결국엔 선생님께 혼자 일을 하겠다고 까지
말해버려서 이 사단이 나버렸다.
이 많은 양을 어느 세월에 다하려고...
이런 일엔 늘 적극적인 김여주 때문에
방과 후에 잘 놀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괜찮다, 괜찮다 하다가 결국엔
한번 빵 터져버린 일도 있었다.
있는 고집을 모두 부려 일을 해결하겠다는 김여주와
없는 고집도 다 부려 놀러를 가고 말겠다는 나와
아무도 없는 교실에서 소릴 높여가며
싸웠었다.
결국 둘 다 지쳐서
선생님께 마감을 늦춰 달라 부탁하곤
신나서 놀러 나갔었다.
그때 재밌었는데...
이런 저런 생각에 빠져 넋을 놓자 해가 거의 다 저물어
버린게 보였다.
이대로 있으면
김여주와의 추억에 빠져 벗어날 수 없을까봐
교무실로 가 선생님께 마감을 늦춰 달라 부탁했다.
“아, 그래 그럼. 알았다.”
“네, 죄송합니다.”
“아니야~ 여주가 아프다는데.
그동안 여주가 일을 얼마나 잘해줬는데.“
“아, 네...”
“아, 맞다. 전에 말이야.
내가 여주 일하는 거 똑소리 난다고, 다음엔
위원회장 좀 맡아달라고 했는데.
글쎄 그 여시 같은게 뭐라는지 아니?“
선생님은 뭐가 그렇게 재미있으신지
쿡쿡 웃으며 여주 자랑 아닌 자랑을 해대셨다.
“회장하면 바쁘잖아요. 남친이랑 데이트할 시간 없어서 안돼요.
이러는 거 있지? 기집애가 눈 똥그랗게 뜨고~
그때 내가 어찌나 웃기던지.”
선생님의 말을 듣고 나는 그동안
일한다고 바쁘다던 녀석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래, 너는 항상 일이 있다 말하면서
섭섭함을 감추지 못하는 내게 늘 미안해했다.
생각해보면, 그럴때마다 너는 주말마다 친구들과
약속도 취소하고 나와 놀아주었다.
나는 어쩜 너에 대해 이다지도 소홀했고
알려하지 않았던 걸까.
그러고 보니 너의 친구들도 내게 그랬다.
‘어쩜 김여주에 대해 그렇게도 모르냐?’
![[iKON/김한빈] 문제적 커플 번외 - 5 | 인스티즈](http://file2.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15/11/14/21/fc21b633ec83802989404b912cfbf67b.jpg)
“하...”
지금 당장 너를 만나야겠다.
/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다음 편이 마지막인거.
PRAY FOR PAR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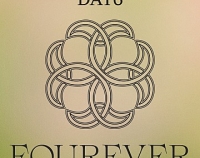






 시상식에서 자기배우가 종교 얘기하는거 어때?
시상식에서 자기배우가 종교 얘기하는거 어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