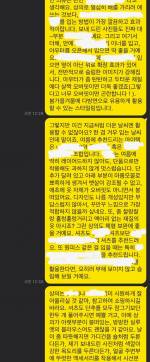미루감화서
w.규닝
00.
부러 옷감이 구겨지지 않게끔 앉아있었던 것이 무색하도록, 성규의 옷매무새가 있는대로 흐트러졌다. 더욱이 도포 끝자락을 밟고 선 유생 덕택에,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말끔했던 도포에 흙자욱도 하나 추가될 게 뻔한 일이었다. 성규가 소리 나게 침을 꼴깍 삼켰다. 번뜩이며 쳐올렸던 눈이 수려한 얼굴과 마주하게 되자 발소리만으로도 쿵쿵 뛰었던 심장이 한층 더 크게 울어댔다. 유생의 턱 끝에서 달랑거리던 갓끈이 성규의 얼굴 가까이로 내려왔다. 느릿느릿하게 허리를 숙여 앉은 그가 고개를 기울였다.
“여우 쭉쟁이처럼 생겨먹은 게….”
성규가 다시금 침을 삼키자 그의 목울대가 일렁였다.
“입고 있는 옷이나 행색을 보아하니, 재직이나 수복은 아닐 터.”
“…….”
“몇 주 전부터 도서고의 책들이 사라진다는 말이 들리던데 뜬소문이 아닌 모양이구나. 그동안 걸음하지 아니했더니, 신삼문 층계에 언제부터 쥐구멍이 나 있었던거냐?”
유생의 고개가 한 뼘 정도나 가까워졌다. 일부러 빈정거리는 목소리가 성규의 혀를 바싹 태워왔다. 뭐라도 변명은 해야 하건만, 마땅히 둘러댈 만한 게….
“도둑은 아닙니다.”
“그럼 도적쯤은 되겠지.”
“그게 아닙니다! 소인은 제생원에서 의술을 배우고 있는 의학도이며 도적질에는 요만큼도 전과가 없습니다. 혜민서 도제조 대감께오서 성균관 약방 전담으로 보내주십사 들른 것뿐입니다.”
“허면 지금 이곳은 약방이요, 네놈이 손에 든 것은 약제렷다?”
유생이 성규의 말을 따내어 한껏 빈정거리며 어깨를 으쓱했다. 저것도, 또 저것도 전부 다 약제였던 것이로구나. 사방 천지에 널려있는 책장이며 고서들을 가리키던 손가락이 별안간 접혔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성규의 눈이 초조하게 감겼다 떠졌다. 성규의 등으로 식은땀이 줄줄 흘렀다.
“나는 여태껏 이곳이 우리 상유들을 위한 도서고인 줄 알았더니, 쥐새끼가 넘나드는 약방이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군.”
도포자락을 밟은 유생의 발에 힘이 실렸다. 그의 등장과 함께 얼떨결에 등 뒤로 급하게 숨긴 서책을 금방이라도 놓칠 것 같아, 보고 있던 곳에 끼워 넣은 손가락에 힘을 주자 경련이 일었다. 성규는 너무 세게 쥐어 거의 튿어질 것 같은 서책을 등 뒤에서 바로 붙잡았다.
“상유께서 말씀하시는 서생원이 아니라, 서생이오만….”
“제법 말장난도 하는구나.”
유생의 흥미로운 듯 눈을 치켜떴다. 성규가 밟히고 있던 제 옷자락을 발 끝으로부터 힘주어 빼내며 옷깃을 털었다.
“말장난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나가라.”
“예?”
성규의 눈이 크게 떠졌다. 물론 낯선 인기척과 맞닥뜨렸을 때부터 감내하고 있었던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납득할 수 없음이었다. 성규가 목소리를 죽여 발끈했다.
“어째섭니까?”
“유생도 아닌 주제에 이곳이 마치 네 놀이터인 양 대드는구나. 혜민서에서 나왔다더니, 반궁도 그 곳처럼 아무 서민이나 들락거려도 될 곳 정도로 여기는 거냐?”
“그것은 아니지만…”
“네 놈을 잡기로 혈안이 돼 있는 서장의에게는 말하지 않겠다. 하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너를 못본 척 두겠다는 말이 아니다. 쥐새끼와 맞닥뜨려 기분이 더럽기는 이 쪽도 매한가지인 터라.”
성규의 눈썹이 억울하게 내려갔다.
“왔던 것처럼 조용히 나가라.”
“헌데, 상유께서도 이 시간에 존경각에 걸음하셔선 아니되시는 것 아닙니까?”
“뭐야?”
“현재 방방례 이후 은영연(과거에 급제한 사람의 영예를 축복하여 임금이 내리던 연회)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 명륜당과 존경각의 출입을 금하라는 어명이 있던 걸로 아는데…”
성규의 입에서 또박또박 입바른 소리가 뱉어졌다. 그에 따라 유생의 눈초리가 사납게 변해가던 것도 잠시, 꽤나 소란스러운 소리와 함께 성규의 몸 위로 제 것과는 상반되는 값져보이는 도포가 덮어졌다. 아니꼬운 눈으로 성규를 노려보던 유생의 얼굴이 순식간에 가까워져 있었다. 무언가에 놀랐는지 악 소리를 내지를 틈도 없이 달려든 유생에, 가까이 얼굴이 붙어버린 탓에 갓이 겹쳐 상대적으로 낡은 제 갓이 머리 뒤로 넘어가려는 것을 눌러 당겼다. 따져 말하느라 정신이 팔려 쭉 째졌었던 성규의 눈이 휘둥그레 떠졌다.
‘쉿.’ 다급하게 제 입술로 손가락을 갖다 대는 유생의 말 따라 반쯤 벌리고 있던 입을 꾹 다무니, 이제껏 저희의 말소리밖에 들리지 않던 도서고 안으로 낯선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대사성의 간 곳을 모른다니 말이 되는가?”
절반도 넘게 열려있던 문 저편에서 한껏 상기된 목소리가 새어 들어왔다. 아마 성규보다 한 발 빠르게 다른 이의 인기척을 느낀 탓에, 제가 앉았던 곳까지 한달음에 뛰어 들어와 바짝 붙어 앉은 유생의 어깨 너머로ㅡ 보일 듯 말듯하게 스치는 유건에 놀란 빛을 가득 담은 눈이 빠르게 깜빡여졌다. 졸지에 유생의 어깨 위로 제 턱을 얹어 놓은 성규가 퍼뜩 숨을 굳힌 그를 따라 들이마셨던 숨을 소리 나지 않게 뱉었다.
“유가 행렬이 코앞인데 간 곳을 모르다니, 성균관을 위해 걸음한 문무과 대신들을 기만하는 게 아니고서야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거의 호통에 가까운 목소리가 칼벼락처럼 떨어졌다. 그에 서투르게 숨을 뱉던 성규의 호흡도 일순간 멈췄다. 마치 눈앞의 유생이 그랬던 것처럼, 몰래 존경각에 들어와 책을 읽던 저에게 떨어지는 불호령인 것만 같아 눈앞이 찡 돌았다. 아마 그래서인지 퍼득이며 굳은 몸이 더욱 안쪽으로 숨어들어가려 움직였던 것인지도 몰랐다. 안듯이 붙어 섰던 유생이 부들부들 떠는 성규의 팔을 단연 붙들었다.
“움직이지 마라.”
“…….”
“네 말이 전부 맞다. 오늘은 존경각 출입을 금하는 날이라 와서는 아니되었다는 것도.”
“…….”
“그러니 너와 나와 진배없다.”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바깥의 목소리에, 한껏 높이를 줄인 목소리가 사근사근히도 귓가에 박혀왔다. 성규가 침을 꼴깍 삼켜내며 가까이 붙어 온 그의 뺨을 흘깃거렸다.
“무슨 뜻입니까?”
“나란히 경을 치기 싫으면 고 입 다물란 소리다.”
조용히. 유생은 혹여라도 저희의 말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갈까 성규의 입을 틀어막으면서 단단히 일렀다. 말은 제가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으면서, 난데없이 입을 틀어 막힌 성규가 두 눈을 끔뻑이며 고개를 뒤로 뺐다. 오래된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 때마다 회초리같이 날선 눈이 성규를 쏘아보았다.
자꾸만 간 데 없는 대사성을 찾는 목소리가 존경각 문 앞에까지 가까워졌다 이제야 저만치 멀어져가는 것 같았다. 성규의 입을 틀어막고 조금 더 보이지 않는 곳으로까지 슬금슬금 자리를 옮기려던 유생의 움직임이 뚝 멈추었다. 결국은 가까이에서 쿵쿵 발을 굴리던 소리가 사라지고 나서야 유생의 몸이 어느 정도 멀어졌다. 성규는 제게서 떨어져, 잔뜩 긴장했었음이 분명한 숨을 고르는 유생을 빤히 쳐다보았다. 답답한 듯 갓 모양을 이리저리 가다듬던 유생의 고개가 홱 하니 돌아왔다.
성규는 저도 모르게 화들짝 놀라며 책장 쪽으로 등을 붙였다. 그러자 잠시 후에는 여지껏 밉게 타박만 해오던 유생의 입꼬리가 묘하게 올라갔다.
“몰래 드나들던 전과가 있는 놈이라서 그러한지, 숨 하나는 고요히 잘 죽이는구나.”
“…….”
“서생원.”
성규는 또다시 저를 ‘쥐새끼’라고 지칭해오는 말에 바짝 약이 오른 숨 뭉텅이를 뱉었다.
궁중 뜰에서부터 존경각까지는 꽤 거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악공들의 주악 소리가 여늘거리며 흘러들어왔다. 오래된 고서의 묵은 향과 기악 소리는 서로를 연주하듯 뒤섞여 존경각의 공기를 아우르고 있었다. 은영연의 가운데. 임금을 직접 대면한 것도 아닌데 꼭 그에 버금 갈만큼 팔딱팔딱 뛰는 심장을 붙들어 매기에 바빴던 오시.
하해와도 같은 성은을 입은 탓에 발목을 잡혀버린, 이상하고도 복잡한 인연의 줄에 불이 올랐다.
*
혜민서[ 惠民署 ]
조선시대 3대 의료기관 중, 의약과 일반 서민의 치료를 맡아본 관청.


 초록글
초록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