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turn(가제)
"그렇게 싫어…? 내가 네 위에 있는 게?"
마디가 굵은 손가락이 혜성의 뺨을 훑었다. 눈물이 잔뜩 번져서 몸서리치던 혜성은,
갑자기 동작을 멈춘 정혁의 사타구니에 엉거주춤하게 앉아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는 정혁의 눈동자를 바라봤다.
"...알았어. 후..., 일어나 봐."
"-!!!"
어찌할 줄 모르고 멍하니 듣고만 앉은 혜성의 겨드랑이에 손을 끼워 일으킨 정혁은, 멀찌거니 떨어져 말을 이었다.
"침묵은, ...긍정이지? 안 할게. 이젠 절대로 너랑 안 할거야. 내가 밑에 있는 건 아무래도 좀 징그러울테니까,
네가 바란다면 너한테 절대로 손 안댈게."
"...헤어지자는 거야?"
"…그런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아무튼 지금 내린 결론은 내가 너한테 신체적 접촉을 최소화 하겠다는 거야. 어-, 이런 거 맹세할 때 소중한 걸 거는거지?"
"… …."
정말 거짓말처럼 대뜸 손바닥을 내보이며 허리를 세운 그가 결의에 찬 표정으로 무어라 읊어대기 시작했다.
"나 문정혁은, …너를 걸고. 더 이상 네가 싫어하는 짓 하지 않을게. 선서. …순서가 바꼈나?"
"됐어, 그만 둬."
"선서했으니까 나 이제 씻으러 간다. 괜찮지? 나 급해."
혜성은 소스라치게 놀라서 정혁의 얼굴을 올려다본다. 아무렇지 않은 얼굴. 평소와 다를 것이 없는 얼굴. 혜성은 그 속에서 차가움을 느낀다.
태연한 말투에서 이질감을 느낀다. 뭐가 어떻게 되었건 이미 달아오른 몸인데, 이유모를 싸늘함 앞에 식어버린다. 반면 아직 꼿꼿한 정혁은,
그대로 욕실문을 닫아버렸다.
문 열고 씻어. 너 왜 그래? 아무렇지 않은 듯이 굴지마. 아무리 봐도 지금 너, …네가 아니잖아.
혜성이 말한다. 소리없이. 본인 스스로도 알지 못할 만큼, 아무도 모르게 소리치고 있었다.
rrrr-
"…응, 선호야. 아니야, 괜찮아. 지금? 지금은 좀… 그건 아닌데, 조금 피곤해서. 응. 그래. …너도."
그러고보니 도착했다는 정혁의 전화를 받고 헐레벌떡 뛰어나오느라 선호에게 인사도 제대로 못 하고 나왔다. 목소리에는 생각보다 어색함이 없었다.
먼저 입술을 부비고,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타 이끌던 혜성의 기억에 아마도 수줍어하는 선호의 모습은 없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주섬주섬 옷을 입는다.
샤워기 소리가 끊임없이 들렸다. 거울을 들여다본다. 잔뜩 부은 두 눈이 밉살맞다.
"…머리 아파."
관자놀이를 두어 번 문질렀다. 이미 옷은 다 입었다. 혜성은 이유없이, 방을 서성인다. 가만히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 거울을 본다. 부어오른 입술이 뾰루퉁했다.
"머리 아파."
이마에 손을 짚어도 당연히 열은 없다. 스트레스성 두통이라고, 누가 그랬는지는 잘 기억이 안난다. 스트레스성. 그는 나에게 그런 존재일까. 생각해본다.
또 머리가 울렸다. 순간 혜성은 어느새 샤워기 소리가 멈췄음을 깨닫는다. 욕실과 방은 문을 한 겹, 사이에 두고 고요하다. 미동조차 없는 침묵.
거 봐, 너 아니잖아.
혜성은 또, 아니 어느 누군가가 소리없이 말한다. 자꾸만 부정을 내린다. 멍하니 욕실문만 바라보던 혜성이 벌떡 일어섰다.
나 안 가면 계속 그러고 서 있을 거 아냐.
부르튼 입술이 윗니에 짓눌렸다.
오피스텔을 빠져나와 도로변에 들어선 혜성의 휴대폰이 진동한다.
「니 가방에 두통약 넣어놨어.」
정말. 그 와중에도 이걸 넣을 생각은 어떻게 했을까. '고, 마, 워' 혜성은 문자를 썼다가 지운다. 우습다. '병주고 약주냐 새끼야.' 또 지운다.
그래, 지금은 뭘 해도. 뭘 해도 예전같지 않다.
"…나쁜 새끼."
하지만 정작 나쁜 새끼는 본인이라는 것을 혜성은 누구보다도 잘 안다. 딱히 선호에게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이고 싶은 꼬마애처럼, 그저 정혁의 앞에서 작아지기만 하는 자신을 선호 앞에서 크게 부풀려 보이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나도 너 같은 애 하나쯤 눕히는 거 어렵지 않아. 봐, 나 약하지도 않고 여성스러운 건 더더욱 아냐.
그런 알량한 자존심. '소중한 걸 거는거지?' 왜인지 모르게 입꼬리를 올리던 얼굴이 떠올랐다. 그러다 문득,
"우리… 연애하는 사이였나?"
실은 둘 사이에 '헤어짐'이라는 단어는 애초부터 존재할 이유가 없음을 깨닫는다. 일기예보는 빗나감에 거리낌이 없었다.
비 내리는 하늘 아래, 혜성은 우산이 없었다.


 초록글
초록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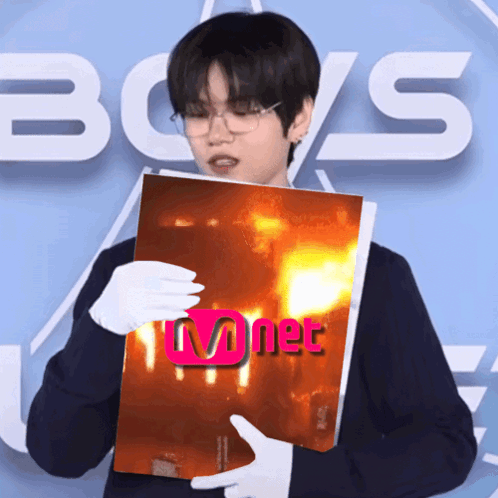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싶어 이분 넘 예쁘심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싶어 이분 넘 예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