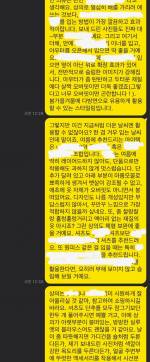반대편 노선 2
written by_작가1996
"빨간불이다."
"……."
소년의 향이 아니다. 내 손목을 잡은 그 손에서부터 남자의 향이 물씬 풍겨왔다. 사실 초등학교때 이후로 남자를 만나본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확신했다. 그는 소년이 아니라 남자라는걸. 나를 감싸오는 그의 향에 눈앞이 아득해졌다. 아무말도 할 수 없었고 벙찐채 그의 눈을 바라볼수 밖에 없었다. 그 눈은 아침마다 날 바라보는 곧은 눈빛 그대로였다. 금새 내 손 안에 땀이 가득찼다. 그 소년, 아니 그 남자는 나를 좀 더 안전하게 길로 끌어당겼다.
"왜 저쪽길로 안가"
"……."
"집 이쪽이잖아"
그는 날 알고있었다, 생각했던것 보다 많이. 그는 반대쪽으로 내 몸을 돌려세워줬고 내가 방금 건너려던 횡단보도를 건넜다. 그가 다시 다른 세계로 멀어져가는 느낌이였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가 왜 그쪽길로 가는지 난 궁금하지 않았다. 그의 집은 나랑 반대편이니까. 그러고보면 나랑 그는 말한마디 나눠본적도 없는 사이였지만 서로의 집방향을 알정도로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있었다. 고개를 저었다. 그가 무엇이든, 내가 무엇이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다. 걷기 시작했다. 몇걸음 걸었다고 생각도 안했는데 벌써 횡단보도 앞이였다. 내일은 지각하지 말아야지. 그의 시선을 견딜수 없을것 같았다.
"다녀왔습니다."
엄마는 나를 흘끗 쳐다보고 그래라고 대답했다. 그래 이게 내 세상이지. 온통 흑백 투성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면 공부하는척 하고 친구들과 쓸데없는 얘기나 몇마디 주고받고 그리고 집에와서 엄마와 한마디 나눈 뒤 방에서 다음날 아침까지 썩는. 내가 사는 이 세상은 온통 칙칙함 뿐이였다. 걱정이 되긴한다. 커서 뭘해야 될지. 꿈도 없고 재능도 없다, 이쁘지도 않아서 돈 많은 남자에게 시집가는건 꿈도 꿀 수 없었다. 생각해보니 평범해도 너무 평범해서 내가 불쌍했다. 가슴이 묵직해졌다. 나는 매일 밤 듣는 라디오를 듣기위해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내 머리맡에 두고 누웠다.
눈을 감았다. 그날 밤 꿈 속엔 낯선 남자가 나왔다. 낯선 남자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나는 낯선 남자가 그 남자이길 바랬다. 멍청이 같으니라고. 난 위험을 자처하고 있었다. 연애한번 못해본 바보같은 여고생이지만 그 남자의 변태스런 시선을 즐기고 있던것이다. 부끄럽다. 나는 꿈 속에서 낯선 남자와 손을 잡고 계속해서 걸었다. 어딘지 알 수 없는 흑백 세계를 계속해서 걸었다.
다음날 하교하는 버스에서 내릴 때 까지 나는 그를 볼 수 없었다. 아쉬웠다. 오늘 아침에 늦게 나섰다면 그를 볼 수 있었을까. 난 이제서야 어제 들었던 그의 목소리가 생각났다. '왜 저쪽으로안가, 집 이쪽이잖아.' 얼굴이 달아올랐다. 정말 미쳤나보다. 그의 목소리가 너무나 매혹적이였다. 또 다시 듣고 싶었다. 난 가방끈을 한번 꽉 쥐고 골목 모퉁이를 돌았다. 이 모퉁이를 돌아서면 그가 서있길 바랬다.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봐줬음 했다. 그리고 어제처럼 손목을 잡고 나에게 나지막히 속삭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없다. 내가 미쳤나보다. 지독하게 흑백인 내 세상 가운데 색을 입히고 싶었다. 조금은 달라지고 싶다고 처음 생각했다.
계속해서 그를 볼 수 없었다. 나는 바보였다. 그가 내 손목을 잡고 나에 대해 뭘 안다는 듯이 떠들어대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들떠있었다. 바보같은 ○○○. 그에게 난 아무 존재도 아니야. 그는 그저 바보같은 나에게 잠시 호기심을 가진것 뿐일거야. 지독한 내 세상에서 난 평생 벗어날수 없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다. 온몸이 얼얼했다. 그를 볼 수 없다. 한방울 남은 내 빨간색 물감은 그렇게 증발해버렸다.
1년이 지났다. 정확하게 말하면 5개월 밖에 되지 않았지만 난 고등학교 2학년이 됐다. 5개월동안 나는 나름 많이 바뀌었다. 아버지의 사업이 나름 잘 돼서 메이커가 붙은 옷이나 가방, 신발을 가질수 있었다. 살도 빠졌다. 5킬로그램이나 빠져서 나름 숙녀테가 났고, 머리도 어깨에 닿을만큼 길렀다. 중학교때의 모습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진짜 여고생이 된 것이다. 더이상 내 세상에 대한 불만도 없었다. 이대로도 충분했다. 더 이상 그에게 얽히고싶지도 않았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오늘 저녁에 외식할거니까 바로 집으로 와야한다."
"네"
나는 새학기라는 설레는 말에 들떴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버스정류장으로 향했다. 몸이 너무 가벼웠다. 버스를 기다렸다. 150원을 오른손에 꽉 쥔채 버스가 올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직 버스가 올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나는 반대편 버스정류장으로 시선을 돌렸다. 갑자기 숨이 턱 막혔다. 그였다. 5개월만에 그가 버스정류장에 모습을 보였다. 긴 시간을 잊은듯 그 남자는 여느때와 같이 나를 훑었다. 그의 무표정이 나를 죄여왔다. 몸이 굳어버렸다. 어떻게 해야될지 몰랐다. 언젠가 그를 다시 마주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곤 했다. 그때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을거야, 난 이제 그를 잊었으니까. 그 남자는 나와 아무상관 없으니까. 그런데 아무렇지 않기는 커녕 어깨에 백킬로그램이나 되는 모래주머니를 올려놓은 기분이였다.
그는 시선을 조금 더 아래로 내렸다. 그래 통통했던 다리가 이젠 가녀린 아가씨 테를 내고 있으니 그도 무시할 수 없을것이다. 나는 괜히 우쭐해졌다. 나도 이제 어른테가 제법 난다고. 그의 시선을 피하지않았다. 부끄럽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가 날 더 봐줬으면했다. 그는 인상을 찌푸렸다. 그리고 그가 의자에서 일어섰다. 나는 겁이났다. 그가 횡단보도를 건너서 이쪽으로 와버리면 어쩌지. 하지만 바로 버스가 도착했다. 나는 허둥지둥 버스에 올라탔고 내가 탄 버스를 멍청하게 서서 바라보고있는 그 남자를 똑같이 바라볼 수 밖에 없었다. 그와 함께 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 아... |
망했네요 망했어..이게뭐야 ㅠㅠㄹ이이잉기익ㅇ그ㅏㄱㅇ 여러분들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것같네여여어어어우어유ㅠㅠ 왠지 이대로가다가는 불마크가 언젠가 한번 뙇하고 나올것같네요..히히히부끄뎡 1편보다 더 길게썼어요!! 아마 평일엔 연재가 더딜것같아서 ㅠㅠ ㅇ흐엥 여러분 재미없다고 떠나기 있기없기?!!?
아참 그리고 1편에 댓글 달아주신
대훈대훈님, 깡통이님, 뾰로롱님, 똥코렛님, samsung님 그 외 익명의 독자님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랑합니다^0^~♥ |


![[기성용망상] 반대편 노선 2 | 인스티즈](http://file.instiz.net/data/cached_img/upload/b/2/b/b2ba5fc93d76fb76bfeac99237fee26e.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