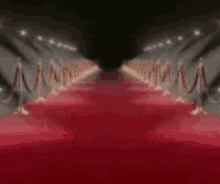헉- 하는 소리와 함께 채리가 눈을 떴다. 멍했다. 뭐였지. 정말 나 네임인가. 아닌가 꿈이었나. 생각하며 손을 들어 네임을 찾았다. 없었다. 어디에도 네임을 보이지 않았다. 아- 꿈이었구나.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데 바로 옆에서 뻗어 나온 팔이 허리를 감고 채리를 끌어당겼다. 꼼짝없이 안긴 상태가 된 채리는 익숙한 재민이의 향기에 취해 더 깊숙이 파고들었다.
“채리야 잘 잤어?”
“아니. 완전 악몽 꿨어... 진짜..”
“무슨 꿈이었는데?”
무슨 꿈이었는지 말해야 하는 걸까. 채리는 순간 선택을 했다. 하얀 거짓말을 하기로. 불안한 건 나 하나면 충분하니까. 그냥 괴물에게 좇기는 꿈을 꿨다고 웅얼거리며 말한 채리는 힘을 주어 재민이를 꽉- 안았다.
“채리야- 나 아픈데-”
“참아. 다 너 사랑해서. 내 사랑이 넘쳐서 그러는 거야.”
“그런 거면 꾹- 참아야지.”
평소 표현이 서툰 채리의 조금은 독특한 사랑 표현에도 재민이는 히죽거리며 웃었다. 곁에 있었던 재민이 덕에 금방 꿈의 잔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채리는 손을 뻗어 시계를 확인했다. 7시였다. 알람이 원래 8시에 맞춰져 있으니까. 시간은 충분했다.
“재민아 졸려?”
다분히 의도가 가득 담긴 채리의 물음에 두 사람은 눈을 마주했고, 재민이는 손을 뻗어 내려온 채리의 머리칼을 귀 뒤로 넘겨주었다.
“아니-”
머리를 넘겨주는 손길을 받으며 재민이의 위로 올라간 채리는 천천히 재민이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금방이라도 코가 맞닿을 듯한 거리에서 멈춘 채리는 손가락을 뻗어 재민이의 눈, 코 그리고 입술까지 간지럽히듯이 쓸어내려 갔다. 손으로 채리의 허리를 마치 소중한 것을 다루듯이 쓰다듬던 재민이는 애가 탔는지 한 손으로 채리의 목을 감싸며 다급히 채리의 입술을 감춰 물었다.
씻고 나온 채리는 학교에 갈 준비를 했다. 아침부터 넘치는 사랑을 나눈 재민이는 채리의 등에 찰싹- 하고 달라붙어 떨어질 생각이 없었다. 물론 채리도 떼어낼 생각이 없었고. 현관에서 헤어질 때는 아주 눈물겨웠다. 재민이는 채리를 꼬옥- 껴안고는 놓아주지 않았다.
“이제 우리 내일도 못 보고.. 내일모레 보겠네.. 보고 싶어서 어쩌지..”
“괜찮아. 견딜 수 있어. 우리 재민이 화이팅.”
자신만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살짝 심통이 난 재민이가 안았던 손을 풀고는 채리의 아랫입술을 살짝 깨물듯이 물었다.
“나 으프..”
아프다는 채리의 말에 금방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입술이 쭈욱- 나와있는 재민이의 모습에 웃던 채리는
“나도 보고 싶을 거야. 재민아. 우리 못 보는 대신 영상통화도 하고, 전화도 하고, 사진도 틈틈이 보내고, 톡도 하면 되잖아. 그치?”
“응...”
그렇게 재민이를 달래면서 쪽- 또 신발을 신고 쪽- 현관문을 열려다 다시 와서 쪽- 역시 이채리. 나재민 어르고 달래기 자격증 보유자 다웠다. 입가에 미소가 만개한 재민이는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듯이 손을 흔들었다. 마침내 현관문이 닫히고 금세 재민이는 시무룩해졌다. ‘방금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어...’ 채리도 마찬가지였지만 감상에 젖어들 시간이 없었다. 지각 위기였기 때문에 발에 땀이 나도록 뛰었다. 다행히 세이프였다.
이번 학기 수강 신청을 망친 채리의 하루는 바쁘게 돌아갔다. 빡빡하게 짜인 강의를 다 듣고 그러고는 또 알바가 있었다. 그 사이 틈틈이 재민이에게 사진을 찍어 보내고 통화도 했다. 치열하게 하루를 보내고 자신의 집에 도착한 채리는 씻고 바로 뻗어버렸다.
한참 꿈나라에서 놀고 있던 채리를 건드린 건 손가락의 간지러움이었다. 여름이니 모기인가? 싶었던 채리는 그냥 손가락을 긁으며 계속해서 잠을 잤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채리는 뭔가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다. 뭐지. 뭐지. 누워서 계속 고민하던 채리는 무심코 왼쪽 손바닥을 확인했는데 약지에 이상한 점 같은 것들이 보였다. 딱 반지로 가려질 만한 위치였는데, 이게 뭐지 싶었던 채리는 침대에 자세를 바로 앉아 손바닥을 자세히 살폈다. 점들은 서서히 많아지더니 뭔가 글자를 이루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까지도 채리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는데, 다시 눈을 비비고 제대로 확인해보니 ‘이제노’라는 이름이었다. 그제야 어제 꾸었던 꿈이 생각이 난 채리는 으아악-!!!! 소리를 질렀다.
금방 자신의 집이 원룸이라 방음이 똥이라는 걸 생각해낸 채리는 베개에 얼굴을 묻으며 무음으로 소리를 질렀다. 망했다. 진짜 망했다. 미쳤다. 이건 진짜 네임이라니 내가 네임이라니. 말도 안 된다. 난 재민이가 있는데 이제노는 누구야 알고 싶지도 않다. 채리는 핸드폰을 들어 네임 제거 수술을 검색했다. 네임 제거 수술은 위험했다. 운명을 끊어내는 수술이라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계속 검색하던 채리는 가격을 보고는 핸드폰을 껐다. 드럽게 비쌌다.
머릿속이 복잡해진 채리는 씻으면서도 아침밥을 먹으면서도 온통 네임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그 사이 핸드폰은 불이 나게 울리고 있었다. 전화를 받지 않는 채리에 늦잠을 자는 줄 알았던 재민이는 계속해서 채리에게 전화를 했고, 뒤늦게 전화가 오는 걸 확인한 채리는 당연히 네임의 ㄴ도 꺼내지 못하고 미안하다고 말을 하며 다시 연락하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망했다. 단단히 망했다. 채리의 결론이었다.
원래는 불편해서 커플링도 안 끼는 채리는 집 안 구석구석을 뒤져 예전에 샀던 커플링을 찾아냈다. 다행히 반지가 적당히 두꺼웠던 터라 아슬하게 네임을 가릴 수 있었는데, 손이니까. 안 보이게 조심하자. 채리는 그런 다짐을 하며 집을 나섰다.
학교 수업이 끝나고 자신이 알바하는 카페에 도착한 채리는 같은 시간대에 일하는 동혁이에게 인사를 건냈다.
“안녕-”
“누나 안녕- 어? 무슨 반지? 커플링?”
눈썰미가 좋은 동혁이가 반지에 대해 묻자 조금은 잊고 있던 네임이 떠오른 채리는 어어- 얼버무리며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갔다.
“오늘 손님 겁나 많네.”
“그니까 누나. 미쳤다.”
또 문이 열리고 손님들이 들어왔다. 흔치 않게 굉장히 잘생긴 외모에 채리는 속으로 감탄을 했지만 이내 ‘우리 재민이도 잘생겼는데’라는 생각하며 포스 앞에 서서 비즈니스 미소를 지었다.
“주문하시겠어요?”
“어.. 아메리카노 한 잔이랑요. 초코 라떼 한 잔이랑 야- 제노야 너 뭐 먹는다고 했지?”
“나 바닐라라떼”
“바닐라라떼 한 잔도 같이 주세요.”
“네, 12500원입니다. 네- 결제 완료되었습니다.”
제노? 설마 이제노인가. 내 손에 적힌 그 사람인가. 아씨. 물어볼 수도 없고. 온갖 생각이 다 들었다. 하지만 한 가지도 명확한 생각은 없었다. 그냥 망했다. 가 전부였다. 하- 채리는 음료를 다 만들고선 진동벨을 울렸다. 아까 그 이름이 제노이신 분이 음료를 찾으러 오셨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보통 네임이랑 손을 스치면 찌릿- 한다는데 손도 안 스치고 다행히 스무스하게 넘어가는듯 했다. 동혁이가 채리의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는.
“채리 누나! 이거 뭐예요?”
음료가 담긴 쟁반을 들려던 제노가 멈칫하더니 채리의 얼굴을 슬쩍- 확인했다. 그러고는 곧바로 자리로 돌아갔다. 채리는 동혁이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심장이 자이로드롭을 탄 느낌을 받았다. 제노가 자리로 돌아가자 동혁이에게 종종- 빠른 걸음으로 다가간 채리는 자신에게 등을 보이고 있는 동혁이를 노려봤다. 동혁이가 잘못한 건 없으니 뭐 어쩔 수도 없고. 아유- 하고 말았다. 다시 들이닥친 손님들에 네임에 대해 생각할 틈도 없이 바쁘게 일을 한 채리와 동혁이는 녹초가 되어 마감을 했다. 동혁이와는 가게 앞에서 헤어지고 버스를 탄 채리는 재민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응- 채리야 어디야?”
“나 버스- 거의 다 와가.”
“목소리가 안 좋네. 힘들었구나. 손님 많았어 오늘?”
“응 완전.. 헬이었어.”
채리가 툴툴거리며 오늘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을 하며 버스에서 내렸다. 버스에서 내리자 바로 앞에 재민이가 있었다.
“왜 여기 있어? 나 지금 너네 집 가는 중인데? 더운데- 집에 있지.”
“채리가 너어무- 보고 싶어서 데리러 왔어.”
왜 왔냐는 듯이 툴툴거리는 말투와는 다르게 샐쭉- 웃는 채리에 자신도 모르게 웃음 지은 재민이는 채리의 손을 잡아끌어 채리를 꼬옥- 안았다. 그에 채리도 손을 들어 재민이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둘은 그렇게 한참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