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아는 미영에게 어마무시한 창피함을 당하고 난 뒤 그녀의 패거리들과 함께 별관 뒤쪽에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평범한 여고생들의 담소라고 보기엔 다소 질이 떨어졌다. 몰래 편의점에서 사온 얼음컵에 든 얼음을 씹어먹으며 유리는 물었다. "니 쪽팔려서 어떡하냐, 큭큭." "왜?" "니네 4반에 황미영 알아?" "황미영?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나 걔 알아. 걔 왜?" "걔가 아까 얘 존나 갈궜잖아." "진심?" 윤아는 별관 뒷문 계단에 앉아 아무 말이 없었다. 유리가 먹던 얼음컵을 달라고 손을 뻗기만 했다. 유리는 그런 윤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계속 얘기했다. "헐, 대박이네. 임윤아 넌 가만히 있었어?" "얘도 빡쳤지. 그래서 얘가.." "야!" "...." 갑자기 소리를 지른 윤아 때문에 무리엔 정적이 돌았다. 유리가 놀라 윤아를 쳐다보았다. "얼음 좀 주라고, 병신아." "쳐먹어라." 윤아가 얼음을 먹자 유리는 윤아를 쳐다보다 물었다. "야, 근데 왜 안때렸어?" "뭘." "걔, 황미영. 분명히 또 한번 깝칠텐데." "귀찮아." "야, 그래ㄷ.. 잠만. 발소리 들리는데?" 유리가 살금살금 걸어 코너 가까이 다가갔다. 유리가 코너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보았다. 태연이 고개를 푹 숙이고 걸어오고 있었다. 유리는 씨익 웃고 태연을 불렀다. "야!" 태연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유리를 보고선 그 자리에 서서 멀뚱히 있었다. 유리는 그런 태연이 내심 귀여워 태연에게 다가갔다. "너 임마, 여기 왜 왔어?" "....그... 윤아.. 같이 있어?" "임윤아? 있지. 걔 왜, 누가 불러?" "그.. 할.. 얘기가 있는데.." 유리는 한 번 의문심에 고개를 갸웃 하더니 태연에게 손짓을 하고 무리들이 있는 곳 가까이로 태연을 데려왔다. 윤아는 이미 태연이 온 것을 알고 쳐다보지 않았고, 무리들은 전부 태연을 노려보며 경계했다. 태연은 그 시선들 덕분에 손을 좀 떨었다. 덜덜. "야, 임윤아 얘가 할 말 있대." 무리 내에서 계속 정적이 돌고 있었음에도 불구, 태연은 쉽사리 입을 떼지 못했다. 얘기를 하려다 말고, 하려다 말고 계속 움찔거렸다. 윤아는 그런 태연을 쏘아보았다. "아, 씨발. 진짜." "..." 유리가 윤아의 팔을 툭 하고 쳤다. 살살 하라는 무언의 충고였다. "뭔데." "..." "뭐냐고." 유리는 윤아의 표정을 한 번 살피더니 슬그머니 일어섰다. 심상찮은 기운을 뼛속부터 감지하고 유리는 무리들을 이끌었다. 유리는 무리들의 등을 떠밀며 별관 뒷뜰에서 움직였다. 윤아는 멀어지는 무리들의 발소리를 듣기만 하며 태연을 계속 쏘아보았다. 금방이라도 일어서 태연의 뺨을 아주 세게 후려칠 기세였다. 태연은 정말로 뭐라도 말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에 겨우 입을 떼려고 윤아를 쳐다보았다. 윤아가 태연을 노려보다가 입을 먼저 뗐다. "갔어?" 태연은 무슨 소린가 싶어 멍하니 쳐다보았다. 윤아는 멀어져서 이젠 말소리조차 잘 들리지 않는 그 무리들의 뒷꽁무니를 살폈다. "아, 하여간. 권유리가 눈치 하난 진짜 죽여." 윤아가 씨익 웃으며 태연을 쳐다보았다. 태연은 긴장이 풀려 고개를 푹 떨궜다. 그러고선 이마를 손으로 쓸었다. "이리 와, 앉아." 태연은 다리가 후들거려 저도 모르게 주저 앉을까봐 얼른 윤아의 옆에 좀 떨어져 앉았다. 윤아는 그런 태연을 쳐다보다가 다시 또 누가 오는지 살폈다. 그러고선 태연을 다시 쳐다보고 상태를 살폈다. 그다지 좋아보이진 않는 것 같았다. "..먹을래?" 윤아가 얼음컵을 들어 보여주자 태연은 고개를 저었다. 윤아는 흠, 하는 콧소리 섞인 바람을 내뱉고 얼음을 하나 입에 털어넣었다. 한 2분 정도를 말 없이 앉아 있다가 태연이 드디어 말문을 열었다. "나, 아무렇지도 않, 않으니까.." "..." "사과.. 안해도 돼." "..." "징계, 받은 거.. 그렇게, 힘들지 않아." "..." "그, 그리고.." "..." "아까 일은, 내, 내가, 대신 사과할게." "됐어." "..." 윤아는 아그작 아그작, 하고 얼음을 씹었다. 태연은 속에 있는 자신의 얘기를 할 때면, 당최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하고, 손동작을 어째야 하며. 숨을 고르게 쉬는게 좋을지 조금 떠는게 좋을지 감이 오질 않았다. 자기가 하는 얘기가 너무 어색하고 꾸며낸 얘기 같을것 같았다. 태연은 작게 한숨을 쉬고 머리를 긁적였다. "야, 오늘 거기 가자. 저번에 갔던 클럽." "..." "절대 안걸리니까 나 믿어." "아, 아니." 태연은 벌떡 일어서 섰다. 윤아는 그런 태연을 올려다 보았다. "아, 괜찮다매." "..." "지난번에 그 일 때문에 그래?" 태연은 말 없이 듣고만 있다가 몸을 돌렸다. 윤아는 그런 태연을 따라가 어깨를 붙잡고 세웠다. 그러고선 태연의 앞에 서 다시 말했다. "화 풀린거 아니었어?" "..." "말을 좀 해, 씨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 "화 안 풀렸으면 안풀렸다, 풀렸는데 가기 싫다.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냐." 둘 다 아니었다. 태연은 그냥 윤아의 인생에서 쭈욱 사라져 주고 싶었다. 어차피 윤아와 자신의 생활은 어울리지도 않을 뿐더러, 급수 차이가 너무나도 심하게 났다. 군데군데 이끼가 끼고 여름이면 냄새가 올라오는 태연의 수조와, 행여 조금이라도 더러워질세라 모두가 나서서 닦아주고 치워주는 윤아의 수조는 너무나 달랐다. 두 수조가 한데 섞이려면 결국 한 쪽의 아가미는 터져야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윤아에게 설명하냔 말이었다. 이걸 무슨 수로 답답해하는 윤아에게 조리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 태연은 수많은 글자들의 침체를 이겨내기 위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다. 추석 연휴 말미에 미어 터지는 고속도로의 신호등처럼. "아.. 존나 답답해.." 윤아는 두 손으로 자신의 머리칼을 콱 하고 잡았다. 태연은 그런 윤아의 팔을 잡았다. 윤아가 팔을 내리고 태연을 쳐다보자 태연은 손을 뗐다. 윤아는 그 상황이 지독하게 싫었다. 너무 답답했고, 속이 터질듯이 짜증이 치솟았다. "야, 나중에 얘기해." 윤아는 태연의 옆을 휙 하고 지나쳐 얼음컵을 퍽 하고 차버렸다. 태연의 눈에선 눈물이 질끔질끔 새어나왔다. - 미영은 내내 속이 좋지 않았다. 그래도 하나의 생명체에게 이렇게 저주의 의미를 담은 말은 직접적으로 해본 적이 없는데. 속이 더부룩 한게 여간 불쾌할 지경이었다. 아까부터 어떤 모르는 애가 자신의 친구들과 떠드는 것도 꽤 신경에 거슬렸다. "야, 나 아까 급식실에서 니들 봄." "아- 얘?" "웅. 임윤아랑 존나 싸우더라?" "ㄴㄴ. 얘만. 얘가 원래 한 성격 하거든." "나, 나 얼마전에 병원 갔던거. 그거 임윤아가 그런거잖아." 미영은 흘끔 옆을 쳐다봐 그 모르는 애의 얼굴을 보았다. 뭐야, 멀쩡하네. "그 시발년이 머리만 존내 때려서 맞은 티도 안나. 씨발." "헐 진짜? 존나 미친년." "내말이. 진심 개돌았다니까. 내가 뭐 지 옷을 칼로 긁어놨다는거야. 미친년이." "ㅋㅋㅋ미친. 니가 아무리 쳐돌았어도 뭐하러?" "그니까. 시발. 갑자기 지랄하면서 존나 때리더라니까?" "미친년 진짜 존나 고삐풀렸네." 미영은 계속 아무 말 없이 얘기를 들으며 속으로 뜨끔했다. 그렇게 말하는 아이를 맞게 한 게 자신이라는걸 숨기며 가만히 있었다. "그래서 내가 걜 신고했거든? 학교 폭력으로?" "진짜??? 미친년- 올- 깡 존나 좋아." "근데 존나 소름돋는게 뭔지 알어?" "뭔데." 미영은 온 신경을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에 집중했다. "아까 걔 있잖아, 김태연. 그년이 내가 임윤아 옷 씹창냈다고 임윤아한테 꼰질렀다는거야. 임윤아가." 그 애의 말이 끝나자 얘기를 듣던 미영의 친구들이 모두 미영을 쳐다보았다. 경악스러운 표정과 삭막한 정적은 덤이었다. 미영은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다. "헐, 걔 허언증 있대?" "그런가보지. 시발년이. 그래서 그년도 같이 신고했지롱." "야, 존나 잘했네. 아 그래서 아까 급식 퍼주던 거였구나?" 미영은 눈 앞이 까마득해져 눈을 감은 채로 상황을 천천히 정리했다. 그러니까, 미영은 그 날 태연의 자켓 등이 터져 있는 걸 보고 꼭지가 돌았다. 그래서 임윤아 몰래 임윤아의 자켓을 똑같이 만들어 주었다. 임윤아는 그걸 저 애가 한 짓인 줄 알고 저 애를 뚜드려 팼다. 그래서 저 애는 학교 폭력으로 임윤아를 신고 했고, 임윤아는 진술 과정에서 태연에게 덮어씌우려 거짓 진술을 한 것이다. 그리고 태연은 그 댓가로 임윤아 대신 징계를 받아 급식실에서 땀을 흘리며 밥을 퍼주고 있었던 거였다. 미영은 사지에 모든 힘이 쫙 풀렸다. 아무것도 모르는 미영의 친구들은 태연의 뒷담화를 하기 시작했다. "미친년, 진짜 생각할 수록 또라이네." "그치? 존나 싫어." "아니, 지가 봤대?" "그렇게 말했겠지, 임윤아한테." "허, 진짜 허언증있나보네." "미친년이, 임윤아가 놀아주니까 같은 급인줄 알았나보지." 임윤아, 임윤아가 또라이라는 건 진즉에 알았지만, 이정도로 우주의 끝을 내달리는 또라이인 줄은 몰랐다. 그리고 무엇보다 태연에게 너무나도 극심한 화가 나기 시작했다. 태연에게 그렇게 행동했던게 너무 속상하고 후회스러워 무조건 미안했다고 빌어야겠단 생각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태연은 자신에게 그 어떤 말도 해주지 않았다. 임윤아는 태연이 자신의 죄를 뒤집어 쓴게 미안해 태연에게 접근한거고, 미영은 그런 상황이 있을 거라곤 절대 상상도 못했다. 미영은 정말로 태연이 자신을 친구로조차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은 느낌에 열불이 났다. 금방이라도 얼굴이 터질 것 같이 빨개졌다. 미영은 홧김에 교실 뒷편에 있던 사물함 문을 쎄게 열었다 꽝! 하고 닫았다. 미영의 친구들과 반 아이들이 전부 놀라 미영을 쳐다보았다. - 건필하겠습니다. 야호
이런 글은 어떠세요?


 초록글
초록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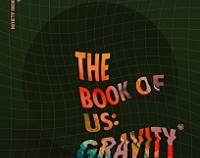

 잘생겼는데 연애 안하는 선배 왤까…
잘생겼는데 연애 안하는 선배 왤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