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풍난양
화창한 바람과 따스한 햇볕
밤이 물러가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 왔다.
“으으....”
원우를 보는 꿈을 꾸었다.
어릴 적 그 모습 그대로 자랐기에 망설임없이 알아볼 수 있었다.
한마디 말없이 그에 의지해 집으로 돌아온 것 같았다.
“지금 몇시..”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볕이 따갑다.
늦잠이라도 잔걸까 나
“아씨”
“아직 주무십니까?”
“여주야?”
여러 번 불러도 여주는 대답이 없다.
“아가씨는 아침 일찍 나가셨어요”
대답 없는 방을 향한 나의 물음이 답답하였는지 계집종 하나가 대답해 준다.
“그리고 그분도 아침 일찍 나가셨어요.
칼을 차고 오신 분 말입니다”
원우가..꿈이 아니었다.
“아가씨 언제 나가셨느냐 무얼 한다고 하셨느냐”
“별말씀 없이 아침 일찍 대감님을 뵙고는 나가셨습니다”
제발..아니었으면 좋겠다 여주야
제발 니가 원우를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달려 나가는 발이 바빠졌다.
----------------------------------------------------------
방이 붙은 것을 보러 나왔다.
어제 그 사람의 말에 따르면 아마 내가 맞는데..
벌써 여름날이 오려는지 날이 더웠다.
이제는 쓰개치마를 가지고 다니기도 힘들었다.
부채질을 하는 손이 바빠진다.
“들었수?그 처자를 찾는 거 말이요. 아마 포상도 준다지?”
“하루만에 포상까지 써붙이는거 보면 엄청 급한가벼”
“어떤 처자기에 그리 안달이신가 전하”
“엄청 하얗고 엄청 까맣고 그러다면서”
“그렇다던디..근데 저 처자말여..”
부채를 한없이 펼친 채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야했다.
내가 그 정도로 하얀가..하긴 해를 몇 년을 못 봤는데..
써 붙여진 방에 다가갈수록 쳐다보고 수군대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났다.
부채는 점점 얼굴 가까이에 있었고 고개는 점점 숙여졌다.
바로 앞에 나에 대한 설명이 붙어 있었지만 고개를 들고 확인할 수가 없었다.
“낭자”
뒤에서 누군가 내 부채를 뺏어 들었다.
얼굴 양 옆에서 펼쳐지는 두 개의 부채
하나는 내 부채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어디선가 본 익숙한 부채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
홍지수..
“내가 가려 줄테니 고개 좀 들어봐요”
팔을 어깨 위로 들어서인지 흘러내려간 소매 사이로 부채 끈인지 붉은 무엇인가가 그의 손목에서 선명했다.
그리고 내 눈앞에 글도 선명했다.
“이설명이 나를 향한 것일까요”
“그날 내가 본 왕의 행차에서 쓰러진 여인이 그대가 맞다면”
“당신도 그날 나를 보았나요?”
“그 공간 그 시간에 함께 있었다는 것은 엄청난 운명 아니겠습니까”
그만 알고 있던 운명이 함께 했던 운명으로 뒤바뀐다.
“다들 이 여인한테 궁금증이 많은 눈빛들인데 미안하지만 내가 먼저 데려가겠소. 왕한테로 말이오”
붉은 띠가 있는 손목이 붉은 띠가 있는 손목을 잡고 달린다.
----------------------------------------------------------
“이곳이 궁입니까?”
“설마 내가 진짜로 왕에게 데려가리라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멈춘 곳은 한적한 골목길이었다.
“도련님”
“예 낭자”
“제가 궁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들어가야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들킨다면 말이죠“
들킨다면....
“어제 찾아온 손님이 계셨는데 말입니다.
제 손님은 아니었지만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신은 왕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라고...“
“낭자, 그건 들킨 것이 아니라”
“아니라..?”
“잡힌 것이지요 마치 물고기....”
그렇구나...나 물고기 신세가 된 거구나..
“전하는 저를 왜 찾는 것일까요”
“난 전하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꽃이라면 벌과 나비는 몰려들 수밖에요”
“향기 없는 꽃도 많습니다”
“꽃이 그대라는 것은 인정하는 것인가요?”
“그것이 아니고...!”
얼굴이 붉어지는 것이 느껴진다. 당황해서 목소리도 컸던 것 같다
부끄러워
“제가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대를 구해 줬으니 내게도 보답을 해야 하지 않겠소?”
보답? 무슨 보답...
“이름 석 자 정도는 내게도 알려줄 수 있지 않소?”
“아..그 정도라면 왜 못해 드릴까요. 박이가의 여주라고 합니다 박여주요”
내 이름을 들은 그의 눈꼬리가 휘어진다. 여자만큼 아름답다.
“박여주 낭자 내가 준 노리개는 어디에 박혀 있습니까?”
“아..그것은”
“선물을 한 다섯 개쯤 해주면 그 중 하나는 해주실껍니까?”
아무래도 자신과 갈 곳이 있다는 말과 함께 그는 골목길을 나서는 길로 앞장섰다.
----------------------------------------------------------
해질녘이 다 돼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순영이..?”
내 방문 앞에 순영이가 앉아 있었다.
“어딜 그렇게 다녀와”
“아..그게”
“아침 일찍 나간 애가 해가 다 질 때까지 들어오지도 않아
어디 간다고는 말도 안해뒀어
혼자 나간 건지 왕 심부름 노릇이나 하는 애랑 나간건지 알 수도 없어
방 붙어 있는 길바닥에 가서 물어보니 어떤 남자가 데려갔다고들 해
내가 걱정이 안돼?명색이 그래도 너 지키라고 있는 사람인데
지키는건커녕 어디 있는지조차 내가 모르는 게 어떤 기분일 것 같아”
“순영아..”
“제발 나한테 말도 없이..아니 그냥 나 없이 아무데도 가지마”
“알겠어. 미안해 내가 생각을 못했어..”
“그건 다 뭡니까”
“아..이거”
홍도령이 선물이라며 사준 쓰개치마와 노리개 꽃신 머리 장식 그리고 은장도..
정말 5개나 사주었다...
“홍도련님을 만나서..그분이 그 길에서 날 데려가신 분이야 사람들이 알아보고 수군거려서..”
“...들어가서 쉬세요. 힘들었을 텐데”
방으로 올라가는 여주
“순영아”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는 순영
“나..궁에 들어가야 할까?”
대답 대신 고개를 숙이는 순영이와 그를 등지고 있어 보지 못하는 여주
“내가 왜 망설이는지 모르겠는데말야..왠지 들어가면 안될 것 같아
왠지 들어가면말야..”
“운명이 꼬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여주는 방문을 닫고 들어간다.
그리고 흉터가 남은 왼쪽 손목을 쓰다듬는 순영
“운명이라는 게 한 사람과 한사람만이 묶인 실일까 여주야”
대답 없는 혼잣말만이 바닥에 가라앉는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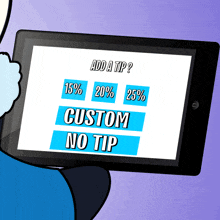



 생선회는 아닌 회... 다 드실 수 있나요?
생선회는 아닌 회... 다 드실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