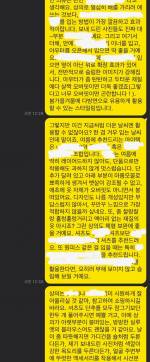이게 현실일까? 아니면 제 눈이 드디어 볼 수 없게 되어 미쳐버린 걸까? 올라오지 말라고 한빈은 스스로에게 명령하면서 숨을 쉰다. 얼마 없는 음식을 겨우 삼킨 것인데 다시 뱉어낼 수 없었다. 두 손으로 자신의 입을 막고 고개를 돌린다. 하지만 고개를 돌릴때 마다 자신의 앞으로 로키가 터벅 터벅 걸어온다. 처음에는 원래대로다. 한발을 움직이니, 로키의 머리에서 무언가와 부딧힌 소리가 난다. 두발을 움직이니, 로키의 머리에서 피가나 그의 얼굴이 빨갔게 되었다. 눈안에 검은색이 사라지고 하얀색만 존재한다. 한빈은 온몸을 움직이려 노력했다.
"일어나!"
스스로에게 그렇게 명령하면서 자신의 다리를 몇번이고 내리친다. 그의 손에 무언가가 쥐어진다. 한빈은 그것의 정체를 알고 그것을 저 멀리 던져 버렸다. 피로 색이 빨강이 된 돌, 그것은 한빈이 로키를 내리친 돌멩이였다. 한빈은 돌을 던져 버리고 강제로 무릎을 세워 일어났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고, 바로 앞에 있는 로키의 얼굴과 마주했다. 한빈은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입을 깨물었다. 그에게서 도망친다. 계속 발을 헛디디고 넘어진다. 그때, 바닥에 흥건한 피가 한빈의 옷에 묻었다. 그 피는 조금식 한빈을 타고 올라간다. 피가 팔을 타고 목까지 올라온다. 높은 비명 소리가 피에 막혔다. 한빈은 스스로 비명을 지르지도 못했다. 그렇게 피가 한빈을 집어 삼켰고, 한빈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음을 기다린다.
'같이 가자.'
살아 있지 않은 로키의 목소리였다.
***
지독한 꿈에 빠져 들었다가 잠깐잠깐 정신이 들 때마다, 점점 더 무시무시한 것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눈을 뜰 때마다 '드디어 끝났구나'하는 생각이 아닌, 다시 시작이구나 하는 고통 뿐이다. 얼마나 많은 악몽을 꾸어야 할까? 얼마나 많은 로키의 죽음을 보아야 하며, 얼마나 많은 피를 보아야 이 것이 끝날까? 한빈은 정신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축축해진 몸으로 한참이나 누워 있었다. 그냥 몸을 움직이는 데도 엄청나게 힘들었다. 꿈과 함께 몸이 돌이 된거 같아 온몸이 차갑게 내려 앉았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겨우 몸을 일으킨다. 마른 모래 속, 힘들게 발견한 돌로 만들어진 구덩이 였다. 찬우는 그것을 동굴이라 불렀다.
"..."
아직 밖에서 빛이 나지 않았다. 그럼 그리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은 것일 것이다. 한빈은 고개를 돌려 모두를 보았다. 그리고 머리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입으로 하나, 둘, 하며 그들을 세고 있다. 몸을 작게 만들어 자는 동혁을 보며 하나를 세고, 그를 안고 자는 진환을 보며 둘을 셌다. 천을 던지고 자는 준회를 보며 셋을 셌고, 옆으로 누워자는 찬우를 보며 넷을 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를 골며 자는 바비를 보며 다섯을 세고, 여섯이 되지 않는 것을 알았다.
"...윤형이형."
한빈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무도 깨지말라는 생각이었지만, 그 움직임에 진환이 눈을 떴다.
"어디가?"
진환의 목소리에 한빈은 윤형이형 찾으러.라고 짧게 말한다. 진환은 그말에 고개를 돌려 윤형을 찾아보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난다.
"같이가자."
더 자라고 해도 들을 진환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다. 한빈은 알았다는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다. 진환은 자신이 덥고 있던 천을 동혁이에게 덥어주었다. 한빈과 진환은 바위를 모아서 최대한 동굴 입구를 잠추었다. 멀리서 보면 적으로 돌맹이가 이리저리 쌓여진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일을 당하고, 그들은 숨어 지내야 한다는 것, 자신들 말고 다른 것은 믿으면 안된다는 것을 배웠다. 달이 지는 것이 바위 틈 사이로 보인다. 밤이 되면 떠오른 것이 달이라고 불린다는 것은 수용소 안에 어른들에게 들어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본것은 불과 몇일이 되지 않았다. 진환은 한빈을 잡고 음식을 조금 내밀었다. 한빈은 고개를 저었지만, 진환 역시 지지 않았다.
"...하아."
결국 한빈은 그가 준 음식 몇개를 입안에 넣었고, 그제서야 진환의 표정이 조금 펴졌다.
"또 물가에 갔겠지?"
"응. 아마도."
윤형은 매 이른 시간마다 우물에 물을 뜨러 간다. 간혹 다른 애들이 윤형이 일어날 때 깨서 그를 못가게 막지만 않으면 그는 계속해서 물을 뜨러 갔다.
"괜찮아. 그 정도 시간이면 돌아다니는 사람도 없고, 걷는 연습도 하고."
이 때문에 발음이 제법 어눌해 졌지만, 그는 변한게 없었다. 자신이 만든 다리로도, 아니 다리가 문제 였던 이전 보다 더 잘걸었다. 먹는 음식의 양이 작아지고, 자주 손으로 가슴을 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주 먹은 것을 뱉어내는 것만 빼면 말이다. 그가 가는 곳은 이곳에서 멀지 않은 우물이었다. 흙이 제법 섞여 있었지만 물을 퍼놓고, 시간을 두면 흙이 가라앉아 제법 먹을 만한 물이 된다. 다만 많이 오랜 시간을 두어야 많이 가라앉고, 먹어도 아프지 않은 물이 되기 때문에 윤형이 그렇게 일찍이 물을 가지러 가는 것이었다.
"저기 보인다."
모레가 가득한 것을 몇번 넘고 나니, 우물이 보이고 윤형이 보인다. 한빈은 순간 윤형을 부르려다, 소리를 듣고 멈칫했다. 그리고 곧장 진환에게 말했다.
"형, 도망쳐요."
"뭐?"
"빨리!"
한빈이 소리치는 순간, 누군가 한빈을 덮치더니 바닥에 눕히고는 양 무릎으로 한빈의 어깨를 내리 누른다. 한빈의 팔이 꺽여 더이상 바둥 거릴 수도 없었다. 당황하여 움직이지 못한 진환이 한빈을 소리쳐 부른다.
"한빈아!"
순간, 누군가 진환의 목을 후려쳤다. 진환의 목소리가 확실하게 사라졌다. 진환의 기침을 내뱉는 소리가 들린다.한빈은 눈을 감으며, 앞으로 찾아올 아픔을 견딜 각오를 한다. 동굴을 바위로 숨겨두고 와서 다행이다. 그리고 빨리 아프지 않게 죽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지금 한빈이 하는 생각이었다.
"멈춰요! 제 친구들이예요!"
순간 윤형이 목소리가 들렸다.
![[IKON/다각] Inhumanity(비인간성) 09 | 인스티즈](http://file2.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16/09/18/14/999af0c8dd0061869edd76262d4fd5b3.jpg)
짧음으로 0p로 올립니다.


 초록글
초록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