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 후 3개월, 재희는 침대에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곳은 원룸이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끝이 없는 회색 방 같았다.
침대 옆에는 반쯤 마신 맥주 캔과 어젯밤에 보려다 만 드라마의 정지된 화면이 켜진 노트북이 있었다.
아침은 늘 어둑했다.
빛이 커튼 틈으로 희미하게 새어 들어오긴 했지만, 일어나야 할 이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몇 시간 더 누워 있다가 침대 옆 작은 책상으로 손을 뻗어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스크롤을 내리며 한때 동료였던 사람들의 소식을 확인했다.
그들은 여전히 바쁘게 살고 있었다. 출장 사진, 팀 회식 자리, 승진을 축하하는 댓글.
재희는 폰을 내려놓았다.
자신이 그곳에 남아 있었다면 지금쯤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려 했지만, 그리운 마음이 곧 부끄러움으로 변했다.
책상 한쪽에는 사직서와 함께 인수인계 자료를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회사에 다녀온 날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퇴사하던 순간의 결의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손으로 머리를 쓸어넘기며 한숨을 내쉬었다.
주방으로 걸어가 커피를 내렸다. 오래된 드립포트에서 나는 소리가 정적을 깨트렸지만, 그것조차 어딘가 지친 소리였다.
냄비와 접시가 산처럼 쌓여 있는 싱크대 위에 커피잔을 올려놓았다.
다 마시지도 않을 것을 알면서도 커피를 따르는 행동은 그에게 남아 있는 유일한 습관이었다.
창문 밖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딘가로 향하는 자동차들이 지나갔다.
그는 이따금 창밖을 보며 자신이 이 흐름에서 떨어져 나간 존재처럼 느껴졌다.
“왜 그때 떠났을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질문이었다.
새로운 길을 찾겠다며 나왔지만,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몰랐다.
이력서를 열 번도 넘게 작성했지만, 보내지 못했다.
더 나은 곳으로 갈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은 이미 어디론가 사라진 지 오래였다.
책상 위에는 작은 상자가 있었다. 그가 마지막 날 들고 나온 그 상자였다.
열어보지 않은 채로 쌓아둔 그 상자를 오늘도 그냥 지나쳤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과거가 있었다.
재희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문득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봤다.
어딘가 초췌해진 얼굴이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그에게 무언가 말을 걸었지만, 그는 답할 수 없었다.
퇴사란 새로운 시작일 거라 믿었던 그는, 이제 과거의 문 앞에 머물러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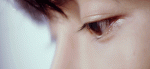


 잘생긴 신림 붕어빵 사장님 충격 근황.JPG
잘생긴 신림 붕어빵 사장님 충격 근황.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