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준/준형] 사랑, 알 수 없는 (아주 짧은 조각) | 인스티즈](http://file.instiz.net/data/cached_img/upload/1/c/d/1cd8f7b1543b8a051d0618905ca75715.gif)
![[두준/준형] 사랑, 알 수 없는 (아주 짧은 조각) | 인스티즈](http://file.instiz.net/data/cached_img/upload/0/e/a/0ea01db538eae8968e3f8482ff00ebb1.gif)
누구나 한 번 쯤, 이러한 순간이 오지 않을까. 평소엔 이해조차 안 되던 것들에 어느 순간 '녹아들고' 있다던가, 누구나 그렇 듯 '편함' 만을 추구하던 내가 불편함의 정도를 뛰어넘을 '불편함' 을 지속하고 있다던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정답은 단 하나 일 것이다. '사랑', 이 한 단어에 모든 의미를 담아낼 수 있다. "사랑아." "오글거린다고, 좀." "내 사랑이 인 걸 어떡해?' 저 구석에서 저의 얼굴을 절반이나 가리는 검은 뿔테안경을 쓰고 붉고 퉁퉁한 입술을 삐쭉 내밀며 대답하는 '사랑' 이가 바로 나의 '녹아듦' 과 '불편함' 이다. 두꺼운 소설책을 허벅지에 받쳐 놓고 집중하며 읽고 있는 사랑이의 모습이 아름다워 사랑아, 하고 불렀건만 무뚝뚝하기 짝이 없는 내 사랑이는 그저 '오글거린다' 며 내 말을 피한다. 평소에도 이렇게 냉정한 반응을 보이기 일쑤다. 콧망울까지 내려온 큰 뿔테안경이 심히 거슬려 보인다. 혹여 올려주기 위함으로 사랑이에게 다가가면, 제가 먼저 금방 안경을 톡 올려버리곤 한다. 그 때 마다 한 손에 꽉 차게 들려있는 책이 떨어져 사랑이가 읽고 있던 페이지를 놓치는 건 아닐까, 하고 위태위태하다. "윤 두준." "왜?" "음… 그냥." "왜, 사랑한다고?" "글쎄." 입에 물고있던 책갈피를 읽고있던 책 사이로 끼워넣고 나를 넌지시 바라보며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랑이. 종종 나의 이름 석 자만 부르고 홀랑 내 뺀다. 장난을 쳐 봐도 애매한 반응을 보일 뿐이다. "책갈피는 아무래도 맛이 없다." "응?" 난 이게 좀 더 맛있는 것 같아, 책을 바닥으로 내팽개치고 급하게 다가오는 사랑이의 입술에 잠시 당황했다. 부드럽게 밀려 들어오는 사랑이의 혀에 당황은 잊고 부드럽게 리드했다. 입천장을 간지럽히는 사랑이의 혀는 태어나 여태껏 먹었던 단 물질 중 훨씬 달콤하고, 내 입맛에 맞는 것 같다. 사랑이를 조금 더 끌어안고 사랑이의 입 속을 천천히 느꼈다. 10년 뒤에 생각해도 이 맛이 생생히 기억 나도록. 사랑이와 만난 지 퍽 오래 되었지만, 아직은 사랑이에 대해 잘 모른다. 무엇을 좋아하고, 또 누구를 좋아하는 지. 사랑이 특유의 스타일이란 어떤 것인지, 나는 아직 잘 모른다. 아무래도 그런 것이다, 사랑이란.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겠는, 그런 간질간질한 모든 것. * 처음 글잡에 올리는 글이라 이렇게 올리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네요 ^_ㅠ 슬럼프 중 쓰인 글이라 재미가 있을 지, 없을 지 또한 모르겠고 그래요. 엉망인 글 읽어주시느라 수고하셨어용 키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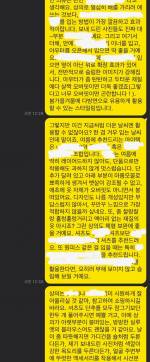







 초등학생과 9번 성관계한 초등교사
초등학생과 9번 성관계한 초등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