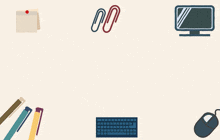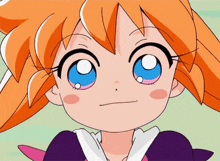00 |
위악은 위선보다 나쁜거야.
어지러운 숨소리가 내 귓가를 울렸다. 숨은 점점 가빠져 왔고 마음속에선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꿈이길 바랬다. 제발 꿈이길 바랬는데 그럴 수 없어서 더 아프고 괴로웠다.
3년전 고등학생때, 그 철없는 열여덟 어린나이에 치기 어린 기억들을 하나하나 새기고 되돌아 보면 웃음이 나오는 기억도 있고 조금 쓸쓸했던 기억도 있었다. 하지만 이 기억만은 아니었다. 생각만 같아선 그 아이에 대한 기억을 모두 지워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아무리 기억을 태우고 태워도 마음속에 있는 상처마저 태워버리기엔 역부족 이였다. 이제 그 트라우마로 인해 그 사건에 연루된 모든 아이들의 모습은 내 기억에서 지워진지 오래였다. 아마 그 빌어쳐먹을 새끼들도 지금쯤 모두 다 있고 헤실헤실 길거릴를 멀쩡하게 쏘다닐 것이다. 역겹다.
성재는 자신이 더럽고 추했다. 얼굴은 기억 안나지만 그때 들렸던 말, 몸짓, 분위기는 살갗 깊은 곳에 새겨져 있다. 작은 몸집의 아이가 주변 아이들에게 모질게 괴롭힘 당 했다. 그 아이는 맞고 또 맞고 또 맞았다. 어떤 아이들은 그 소년에게 차마 입에 담을수도 없는 욕짓거리를 내뱉기도 했다. 그때마다 그 소년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칼날 이 박혀서 그 소년에게 씻기 힘든 상처를 주었을지 생각하자 마음속 한구석이 답답해졌다.
지금 후회해봤자 아무런 값어치가 없었다. 자신은 그때 그 소년을 그저 모른체 했다. 더러운 위선덩어리, 육성재.
이제 돌아오는건 후회와 수많은 자책밖에 없었다.
그 소년의 이름을 알기 위해 힘들게 찾은 옛 친구의 사진을 본적이 있었다.
'이민혁'
해맑으면서도 귀여운 그와 잘어울리는 이름이였다. 언뜻 보기에 교복 마이가 어깨에 맞지 않아 헐렁한 느낌을 주기도 했지만 그것 나름대로 그 소년에게 잘어울렸다. 그러나 왕따를 당한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질나쁜 아이들에 의해 소년의 얼굴은 칼질로 엉크러져 있었다. 얼굴은 모르지만 목소리만으로도 알수 있었다. 그는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사람들에게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었다.
그는 원래 학교에서 서글서글한 성격과 귀여운 얼굴로 인기가 많았다. 친구 사귀귀를 그다지 좋아하는 편이 아닌 성재와 다르게 늘 주위에는 친구들이 북적거렸다. 그러던 어느날, 학교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의 아빠가 호스트바를 운영하고 있단 근거없는 소문에 그에 뒤따른 소문들, 예를 들어 몸을 판다, 누구와 사귄다 더럽다, 등과 같은 이상한 말들이 떠돌기 시작했다. 평소 그 아이를 좋아했지만 늘 티없고 강한 성격이였던 그를 무너뜨리고 싶은 욕구에 앞뒤 못가리는 이상한 아이들이 몇몇 있었다. 그 아이들은 왜 그를 망가뜨리려고 했을까. 하찮은 열등감 따위에 져버린 짐승만도 못한 아이들인걸까.
따돌림을 당하게 되자 북적이던 그의 주위는 하나둘씩 사라졌고 그에게는 쓰레기와 온갖 욕설들만이 남아있었다. 그렇게 티없는 아이가 저리된거에 성재는 어느정도의 죄 책감을 느꼈지만 그다지 신경쓰이지는 않았다. 물론 책상에 써있는 '게이 새끼' 라는 욕설을 지우는 걸 보며 가끔 이미없는 상실감과 이상하게 마음이 아려오는걸 느끼긴 했지만 자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며칠전 오랜만에 꿈에 나타난 그를 보았다. 흐릿한 잔상만이 희미한 그에게 나는 하고 싶은 말을 모두 쏟아부었다. 괜찮냐고. 별일없냐고. 그는 말이 없다.
"육성재, 듣고 있어?"
"어."
"걔 죽었대."
'누구?'
'그 왕따새끼 말이야.."
와르르. 쿵. 쾅. 자신은 지금 슬퍼하는걸까 놀란것일까 아님 다행이라 생각하는 걸까. 성재는 도통 구분이 가질 않았다. 친구가 죽었다. 얼굴도 잘 모르지만 별로 친하지는 않지만 친구는 친구였다. 친구가 죽었다.
친 구 가 죽 었 다
죽음이란 말을 이렇게 가까이서 들여다 보긴 처음이였다. 말이 없는 성재를 보며 일훈이 되물었다. 육성재 듣고있어? 듣고 있냐고?
마치 자신이 인식하지도 못한채 마음의 절반이 빼앗긴 기분이였다. 묘하게 찝찝했다. 찝찝함은 어느새 분노와 슬픔과 무력감이 뒤섞인 감정으로 점차 변했다. 그 사실을 잊어보려고 술을 마시고 어떻게든 머릿속에서 몰아내려고 애를 썻지만 어쩔 수 없이 이지경까지 왔다.
자신의 손목에 날이선 칼을 들이대며 성재는 어이없는 헛웃음을 지었다. 나한테 그 새끼가 뭐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무너지고 죄를 짓고 해야하는지 끊임없이 속으로 되물 었지만 대답은 똑같았다.
"멍청이"
이제 더는 살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며 손목에 칼 특유의 시린 한기가 느껴질 정도로 댔을때.
누군가 갑자기 자신의 손목을 잡더니 칼을 빼서 던져버렸다. 손목을 잡은 손은 작지만 따뜻했고 이 정체불명의 누군가가 어떻게 내집에 들어와서 내 손목을 잡고는 남의 인생에 초를 치는가 상황파악을 하기도 전에 낯선이의 입이 열렸다.
"멍청이."
|
이런 글은 어떠세요?


 초록글
초록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