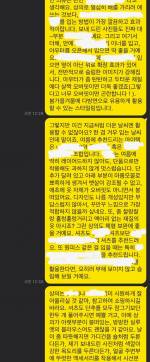우리는 열일곱. 어쩌면 대한민국에 흔해 빠진 고등학생이었다. 늘 성적과 일상에 치이고 학업에 몰두하며 신경 쓸 게 많은 그런 열일곱 말이다. 그런 우리가 평범하지 않은 열일곱이 된 건 그해 여름 일이었다. 움직이지 않아도 이마에 땀이 맺히는 날씨에 우리는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에게 입맞춤을 했다. 가끔식은 벽 건너편에서 보고 싶다는 애틋한 사랑 고백도 했었다. 그렇게도 우리는 지난 여름이란 한 계절을 뜨거운 더위 속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지나가길 바라왔다. 너는 내게 이따금씩 의미심장한 말을 하곤 했다. "앞으론 네가 더 보고 싶어질지도 몰라" 앞으로? 그치만 나는 항상 네가 보고 싶은걸. 뱉고 싶었던 말이 목구멍에서 먹혀 들어갔다. 낯 부끄러워서 그랬다.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심장 소리만 들어도 아니까. 그만큼 나는 너를 너는 나를 사랑하니까 말이다. 그리고 나는 이내 사랑한다는, 보고 싶다는 말 한마디 못 뱉은 지난 날의 내 자신을 아지랑이 피어 오르는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내팽겨치고 싶었다. 너는 그날 새벽 방 문고리에 목을 맸다. 멍청한 열일곱의 나는 네가 악몽을 꾸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너의 낡고 거친 넥타이가 숨통을 조여오는 줄도 모르고 콘크리트 벽에 대고 사랑한다는 말이 담긴 자장가를 부르고 있었다. 내가 불렀던 자장가 속 담긴 말을 네가 듣긴 했을까. 그날 이후 우리는 평범한 고등학생이 될 수 없었다. 너의 자살을 말리지 못 했다는 죄책감에 나는 학교를 그만 뒀고 아직도 열일곱에 멈춰 있는 너는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하얀 가루가 되어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작은 나무 상자 속에 갖혀 있기 때문이다. 열일곱의 나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었다. 나 또한 열일곱의 너의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고 너와 나의 콘크리트 벽엔 금이 가고 철근이 튀어 나와 내 목을 조여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글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