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전/태운지코] 그것만이 내 세상 - 3
W. 양김
스크랩O
수정X
| 더보기 |
끔찍할 정도로 느껴지는 고통에 느릿느릿, 간신히 일어나 앉아 몸을 훝어보니 가관이다.
손목을 포함한 어깨, 복부 등 곳곳에 시퍼렇고 붉은 멍이 벌써 올라와있는데다가 입이고 아래고 할 것 없이 뚝뚝 떨어지는 피...
요즘은 뒷골목의 싸구려 창부도 이런 취급은 안받을텐데.
남아있는건 구겨진 마이, 바지, 검은 티셔츠 정도다.
교복의 질이라는게 원래 좋아봤자인 것이라, 까슬한 감각에 인상이 찌푸려진다.
다리 사이에 불쾌한 감각으로 감겨오는 정액까지도 모두 훔쳐냈다.
이미 다음 교시의 시작을 알리는 종이 울리고 있었다.
평소엔 어울리지도 않게 비교적 수업에 충실한 우지호지만, 가끔 이렇게 한두교시씩 통째로 얼굴조차 비치지 않을때가 있다.
열심히 관계대명사에 관해 소리를 지르다시피 수업을 하던 교사가 그제야 빈자리가 눈에 띄었는지, 약간 짜증스럽게 물었다.
"우지호 자린데요."
"갠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는거야? 인생 막 살기로 작정 했대?"
말한마디 살갑게 하지 않는 놈이라 무서워하며 다가올 엄두를 못내는 애들은 둘째치고라도, 눈에 띄게 녀석을 한심해하는 선생들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교사들이 아무리 차별을 해도 그녀석은 늘 예의있게 대했다. 다른 학교와 싸움이 붙을 때가 많긴 하지만, 그건 꼭 그새끼들이 어디서 헛소리를 듣고 와 먼저 시비를 걸었을 때 뿐이었고, 그때마저도 우지호는 선을 넘지 않으려 애썼다.
나만큼은 안다.
우지호가 왜 문제아야. 왜 한심해. 왜 그딴말을 들어야 하는데?
-드르륵.
아, 깜짝이야. 왜 소리는 지르고 난리야, 저 미친년이.
..말을 해도 꼭.. 저딴식으로 하지. 그런데...우지호가 좀.. 잠깐.
얼굴이 새하얘져서는, 눈가가 좀 붉은것 같고... 입술 끝에 터진 흔적까지 있다.
뭐야.. 왜저래.
"왜...소리 질러요."
"뭐..? 지금 그게 네가 할 소리야, 이자식아?!"
힘없이 낮게 깔리는 목소리가 먼저 들려왔다.
"......"
"죄송합니다."
딱 봐도 상태가 좋지 않아보이는 사람이, 몸이 안좋아 보건실에 다녀왔다는데 더이상 무슨 말을 하겠는가.
그 말을 끝으로, 살짝 잡고 있던 사물함에서 천천히 발을 옮겨 내 옆자리로 다가오는 지호의 움직임이 힘겹다.
미묘한 시선이다. 동정? 걱정? 그것도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일까.
안색도 나쁘긴 했지만, 더 심각한 건 왼쪽 볼 아래쪽부터 턱까지 커다랗게 생긴 시커먼 멍 자국이다.
보나마나 어디서 패싸움을 하고 왔냐며 갈궈댔을텐데.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으며, 작게 앓는 소리를 내는 지호는 지금 보니, 셔츠도 마이도 없는 반팔 티셔츠 차림이었다.
이런 날씨에.. 몸도 아픈 놈이, 미친거 아냐?
지금껀 진짜 아니다 싶은 표정으로 모든 아이들이 올려보자, 금세 큼큼거리며 덧붙인다.
아프긴 확실히 많이 아픈가 보다. 색색거리는 숨소리에서까지 열기가 나오는것 같아 땀이 맺힌 이마를 슬쩍 만져보니,
굉장히 지쳐보이는 얼굴로 엎드려 있는 지금, 건드려봤자 좋아질건 아무것도 없을것 같다.
그제야 약하게 바들거리는 하얀 팔이 눈에 띄어, 마이를 벗고 조심스럽게 덮어주었다. 옷은 어디다 팔아먹은거야..
뭐야... 이건.
흰 손목에 휘감기듯 남은, 시퍼런 손자국 모양의 멍. 그리고...
머리아파....
"..계단에서 굴렀어."
"지랄하고 자빠졌네. 빨리 안 말해?"
"누구랑? 어디학교였는데, 한성?"
"...얼굴 못봤어. 사복이었어. 됐냐? 이제좀 조용히 가자, 씨발."
오늘따라 집이 멀게만 느껴진다. 허리가 미친듯 욱신거린다.
교실로 오기 전, 손에 들린 옷을 잠시 내려다보고 일부러 소각장 쪽으로 빙 돌아갔다.
한번 더 옷을 들여다보고, 진한 체취가 묻어나있는 그것을 곧장 불 속으로 던져넣었다. 타닥거리는 소리를 내며 천천히 굽어졌다 바스라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다가, 교실로 돌아갔었다.
머리카락을 태우는 듯했던 그 악취가 아직까지 코 끝에 맴도는것같아 얼굴을 찡그렸다.
체육복이라도 입으라며 몇번이나 내밀었지만 받지 않았다. 더러운 몸에 김유권 옷을 걸치고 싶지 않았다.
아직 영하를 웃도는 기온이지만 지금은 추위도 잘 안느껴지고.. 반팔 뿐이라 여기저기서 몰리는 시선이 별로긴 해도 어쩔수 없다.
문득 의식을 하니, 온몸 곳곳에 안아픈 곳이 없다.
"..자살을 하던가 해야지. 세상 드러워서, 씨팔."
"..알았다고. 좀 닥쳐 머리아파!! 존나 시끄러 김유권 진짜."
"야.. 진짜 니네집은 뭐 볼때마다 느끼는거지만 존나...좋다, 진짜."
다시 나를 부르는 김유권을 의아하게 쳐다보니..
"그리고..."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뒷통수를 벅벅 긁어대며 휘적휘적걸어가는 그 모습은,
사라질때까지 내게 무언가를 말하는듯 했다.
익숙한 6자리 수를 누르고, 문을 열었다. 어김없이 느껴지는 한기. 소름이 돋아 잠시 몸을 떨었다.
물론, 주위 시선을 의식해 손주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재산중 하나를 마지못해 내어준 것에 불과하지만.
탈칵.
은은한 조명이 옅게 퍼지는 곳에 들어서, 천천히 옷을 벗었다. 티셔츠를 벗으며 스치는 팔뚝이 얼음장처럼 차다.
쿡쿡 쑤시는 허리를 억지로 숙여 바지까지 벗어내고, 전신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니 헛웃음이 나온다.
그리고,
|
시발 지호를 건드리면 아주 좆되는거에요 태운아
우지호 때리지마


 초록글
초록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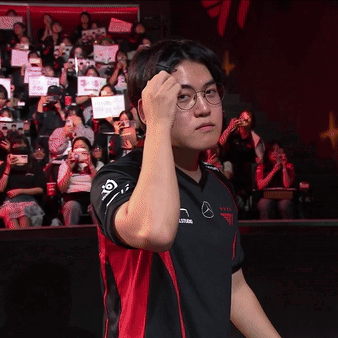
 ㅅㅍㅈㅇ 오겜3 박규영이 올린 사진임
ㅅㅍㅈㅇ 오겜3 박규영이 올린 사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