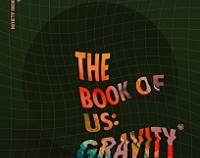선선하게 부는 바람에
문득 잠이깼다.
방금 잠에서 깨어난 나는,
놀람을 감추기 어려웠다.
우리집에서 이불 덮고
잠이 들은게 분명한데,
지금 나에게 보이는것은,
수많은 안개와 구름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보이는
아직 밤이 오지않은 초저녁의 연남색 하늘과
무채색의 풀과 나무로 뒤덮힌 울창한 숲.
그리고
가까워 보이는 큰 초승달.
지금상황이 무섭고, 어리둥절 하지만
왠지 저 달이 있는곳으로 가야 할것 같았다.
그래서 난 맨발로
한걸음 한걸음
걷기 시작했다.
이곳은 이상했다.
모든것이 무채색 이었다.
하지만 저 큰 초승달 만큼은
무서울 정도로 빛나는 황금색 이었다.
열심히 걸었다.
무채색이라도 숲은 숲인지
발이 아파온다.
그때, 내 발에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
발끝부터 점점 무채색으로 변하고 있었다.
난 순간 모든 이성을 잃은듯
멍하게 서있었다.
당황스럽다.
지금 이상황이..
울고싶다.
그때였다.
누군가 날 뒤에서 안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손은 내 허리를 둘렀고,
한손은 내오른쪽 손목을 잡았다.
그리고 몸이 떠올랐다.
아래를 보니
숲이 점점 회오리를 치며
아래로..아래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하마터면 큰일날 뻔했다.
난 나를 구해준
아직 얼굴을 보지못한 이사람이 고마웠다.
그리고 정적이 흐른듯 했다.
먼저 정적을 깬건 이사람이었다.
"너 여긴 왜왔어?"
"....네?"
"여기 왜 왔냐고"
"저도..모르겠어요.."
내말을 끝으로 그사람은 한숨을 내쉬었다.
뭐가 잘못 된건가..?
이내 그사람이 말문을 다시 열었다.
"여긴 죽은자들의 세계야,
너가 올곳이 아니라고"
나는 당혹스러움에 차마 대답을 하지 못했다.
죽은자..그럼 내가 죽은건가..?
하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잘 살아있었는데,
"너 지금 허튼 생각하지?"
"ㄴ...네?"
"너 아직 안죽었어 걱정마
딱봐도 넌 아직 색이 살아있잖아"
그러고 보니 여긴 나와 그사람
그리고 저 달을 제외하고 모두 무채색이었다.
"그..그럼 당신도 아직 안죽은 거에요?"
그사람은 말이 없었다.
이내.
말이 이어졌다.
"난 죽지않았어,
하지만 살지도 않았어,
중립이야.
.
.
적어도 여기선"
그리고 높은 돌위에 나를 내려주고 그사람도 내려왔다.
내가 처음본 그의 얼굴은
아름다웠던걸로 기억한다.
..
.
.
.


 초록글
초록글![[블락비몽환빙의글] : 그 달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1편" | 인스티즈](http://file.instiz.net/data/cached_img/upload/7/1/9/7195f62905d352a5cfe58597d1edc298.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