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XX/이홍빈] 철없는 이홍빈과 너 28 | 인스티즈](http://file.instiz.net/data/cached_img/upload/d/1/d/d1d883b6e5bedde8882bead32e98c7f8.jpg)
캄캄한 집 안, 홍빈이는 네 향기가 훅 풍겨오는 집에 혼자 발을 딛어.
한숨을 푹 쉬고, 소파 위로 엎어져 눈을 감아.
같이 티비를 보던것도, 밥을 먹여주던 것도 이젠 모든게 예전의 꿈이라 생각하니 다시 저절로 인상이 찌푸려졌어.
답답한 마음에 다시 벌떡 일어나 집안을 돌아다니며 마른 세수를 하다, 포기하곤 방으로 들어와 겉옷을 벗어.
침대를 보니, 다시 미쳐버릴 거 같았어.
집까지도 겨우 올라왔는데, 와서도 도저히 눈을 뜨고 있을 수 없어서 침대에 걸터 앉아 눈을 감고 고개를 푹 숙여.
그리고 몇일 뒤, 홍빈이는 군대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
도저히 제 손으로 짐정리를 할 수 없었던 홍빈이는, 원식이를 통해 네 짐은 네가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전했어.
일부러 하루종일 집을 비우고 들어오자, 정말 거짓말처럼 네 짐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
원래 혼자 살던 집에 네가 들어왔지만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이 집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
마시고, 먹을 수 있는 거라곤 술 뿐이였던 홍빈이는 여전히 냉장고를 열었어.
네가 간 뒤로 텅텅 비어서 지저분해지고 있던 냉장고가 깨끗하게 정리 돼 있었어.
썩어가던 반찬통도 없었고, 냉장고 사이사이가 깨끗했어.
끝까지 예쁜 짓만 하는 너 때문에 홍빈이는 냉장고를 열고 털썩 주저 앉았어.
차가운 바람이 피부를 스쳐 지나갔지만 여전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
한숨을 쉬며 침대로 몸을 던지고 아기처럼 잔뜩 몸을 웅크리다 이리저리 뒹굴거리는데, 뭔가 딱딱한 게 손에 만져졌어.
조심히 꺼내보니, 네가 그렇게도 열심히 쓰던 육아일기였어.
하루하루 병원에서 받아온 사진과 아기만큼 아기자기한 네 글씨가 보였어.
뭐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매일 저렇게 숨기나, 생각했었지만 홍빈이는 네가 생각보다 너무 소중한 걸 네 집에 놔두고 갔다는 걸 깨달아.
하나하나 조심스레 보다가 결국 홍빈이는 그대로 엎어져서 한참을 울다 잠들었어.
너는 열흘간 몸조리랍시고 꼬마와 학연이와 매일매일 나름 웃으며 지내왔고 결국 퇴원 날짜가 잡혔어.
"아, 나는 다음주 되면 퇴원하는데- 누나, 누나 조금만 더 늦게 퇴원하면 안돼요?"
"응, 안돼요-"
"아아, 누나아-"
벌써부터 천천히 짐을 챙기기 시작하는 네 팔에 매달려 끙끙거리는 꼬마였어.
"응, 벌써 짐 챙기고 있는거에요?"
오늘도 여김없이 찾아온 학연이야.
항상 깔끔한 정장차림으로 와서는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들어와.
"네,"
"아아, 누나 데려가지 마요-"
"이 꼬맹이가 뭘 안다고."
학연이는 꼬마의 머리를 장난스레 꾹 누르고 스무디를 건내줘.
그리고 너한테는 따뜻한 라떼를 건내줬어.
"애기는 애기애기하니까 이거나 먹고 앉아 있어."
"애기 아니거든요."
"오, 화낸거야? 싫으면 나 주던지."
"줬다가 뺏는게 어딨어요, 이리 내놔-"
투닥투닥하는 둘을 보고는 너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앉아서 라떼를 홀짝거려.
한참 싸우던 학연이가 꼬마를 떼어놓고는 뭔 할말이 있는 듯 네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어.
"뭐에요."
"그게..."
"뭐-"
"퇴원하면 집에 갈거에요?"
"글쎄, 그래야죠."
"부모님은 알아요?"
"내일 퇴원이신 건 모르는데... 연락하기가 좀 그래서."
"그럼, 그럼 말이에요-"
학연이는 뭐 마려운 강아지마냥 안절부절 하더니 갑자기 얼굴이 활짝 피어서는 두 손을 모으고 널 내려다보며 말했어.
"우리 집에 가요, 우리 집-"
독자님들의 의견으로 역시 꼬마 애기는 이름만은 혁이로ㅋㅋㅋㅋㅋㅋㅋㅋ
짧다고 서운해마요
다음글은 역시나
돌아온 부끄부끄 글일거니까
아하하하하하하하하


 초록글
초록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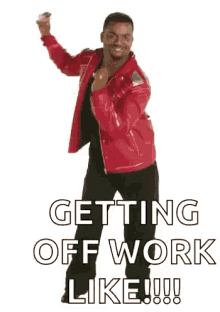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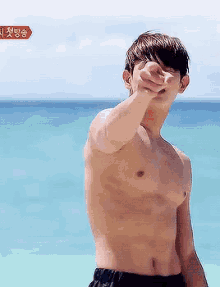
 소비에슈가 누군지 검색해 봤는데
소비에슈가 누군지 검색해 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