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지원한빈] Again and again
아침 햇살이 어슴푸레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2월이 되자 날씨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해 작년부터 지독하게 날 괴롭혀왔던 한파보다 훨씬 따뜻해졌다. 그러나 새벽은 여전히 추웠고, 숨을 쉴 때마다 입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건 여전했다. 목이 깔깔한 게 물을 마시고 싶었지만, 왜 목이 아픈가를 생각하니 다시금 울컥하며 갈증 대신 짜증이 치밀어 올랐다.
그건 순전히 김지원 때문이었다. 3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보내며 서로 사랑이니 뭐니 유치하고도 달콤한 로맨스를 속삭이던 사이였지만, 어제 오후 우리는 정말 누가 봐도 끝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대판 싸웠던 것이었다. 이제껏 차곡차곡 쌓였던 사소한 섭섭함이 폭발하여 전화를 잡고 서로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꼴이란! 어느 순간 너무 서럽고 화가 나고 어쨌든 온갖 감정이 한데 터져버리는 바람에 결국 먼저 쥐고 있던 스마트폰을 벽에 냅다 던져버린 건 나였다, 손에서 떠나 공중으로 날아오른 애꿎은 핸드폰은 벽과 찐한 재회를 했고, 그 대가로 제 몸에서 배터리를 잃어버린 채 바닥으로 곤두박질쳤다. 내 마음처럼 처참하게 갈라진 액정을 보면서 나는 온갖 서러운 곡조를 뽑아내다 종래엔 지쳐서 잠들어버리고 말았다. 저녁까지 이어졌던 기나긴 전쟁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그리고 그 전쟁이 남긴 후유증으로, 목이 이만큼 쉬어버린 것이다.
솔직히 지금 생각하면 어느 누구에게라도 쪽팔려서 털어놓을 수조차 없는, 우습기 그지없는 유치한 사랑싸움이었지만 아직도 그 서운함을 생각하면 비참하고 슬펐다. 다행히도 현재 퉁퉁 부어올랐던 눈은 제 모양새를 찾고 한층 가라앉아있었다. 안 그랬으면 밖에도 제대로 나가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눈가에 남은 잔고통이 자꾸 내 눈시울을 쿡쿡 쑤셔왔다.
눈도 아프고, 목도 쉬었다. 무엇보다도 마음에 먹구름이 우중충하게 낀 게, 세상이 온통 흐릿한 잿빛처럼 보이고 미친 듯이 짜증만 치솟았다.
“멍청한 김지원. 망할 밥씨눈. 너 때문이야…… 이 나쁜 새끼야!!”
오밤중이었지만 나는 괜히 허공에 대고 빽 소리쳤다. 분이 풀리질 않았다. 목소리가 갈라져서 더 기분이 나빠졌다.
김지원과 나는 따로 살고 있었지만 마치 집이 2개라도 되는 양 서로의 공간을 자연스럽게 드나들어왔고, 그 때문에 내 집이든 그의 집이든 서로의 흔적이 가득했다. 잠들었다 깨어난 그 순간부터 우리가 거의 끝이 났음을 알리는 싸움을 돌이켜봤는데도, 집안 곳곳에 새겨져있는 그의 향취며 흔적에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았다. 마음의 진정이 되질 않아 다시금 눈물이 눈가를 비집으며 비죽비죽 나오려 했다. 안정을 찾고 싶었지만 그러기엔 이 공간은, 아니, 이 도시는 김지원의 자취로 가득했다. 여기저기 잔뜩 묻어나는 그의 흔적에 구석으로 몰려버린 나는, 종래에 여행을 선택했다. 그게 내가 현재 기차역에 발을 디디고 서있는 이유였다.
그러나 다소 어이없게도 나는 김지원과 처음으로 1박 2일 여행을 갔던 곳에 가기로 결정했다. 그 이유인즉슨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먼저 내가 원체 길치였던 터라 그가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낯선 곳으로 가서 쓸데없이 길을 잃고 헤매면서 스트레스를 더 쌓고 싶진 않았다. 그리고 단지 어제 암묵적으로 쫑을 냈다는 이유로 혼자서도 괜찮아질 때까지 그의 자취라고는 전혀 없는 곳에 숨어 웅크릴 자신도 없었다. 어젯밤의 싸움판은 물론 어마어마했지만, 야속하게도 내 마음은 그걸로 쿨하게 끝내질 못했다. 결국 나는 적당히 추억을 아로새길 수 있으면서도, 그의 흔적도 향기도 이제는 희미한 곳으로 나 스스로와 타협을 내렸다.
다분히 충동적이었지만 부랴부랴 짐을 싸들고 새벽부터 발 동동 구르며 나와 있었던 덕분에 나는 가장 먼저 기차에 탑승할 수 있었다. 새벽 기차라 그런지 사람은 얼마 없었다. 짐을 올리고, 예약된 창가 좌석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았다. 며칠 전에 왔던 눈이 아직 녹지 않은 탓에 어슴푸레한 새벽이 절로 환해보였다. 눈이 쌓인 풍경은 정말로 예뻤다. 내가 지금 가려는 곳도 설경이 굉장한 곳이다. 아…… 그러고 보니 지원이 형도 눈 쌓인 경치 좋아하는데. 거기까지 생각에 미치자 헛웃음이 절로 나왔다. 여기도 김지원, 저기도 김지원, 그 망할 놈 잊으려고 여행이라는 도피나 택한 주제에, 여기저기서 잘도 떠올리는구나 싶어서.
멍하게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 기차가 출발했다. 뒤늦게 올라탔는지 누군가가 이제야 짐칸에 짐을 덜컹덜컹 실어대는 소리가 들렸다. 김지원도 꼭 저렇게 늦게 나타나곤 했는데…… 그 생각을 마음 한 구석에 꼭꼭 눌러두려 애쓰며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아주 가까이에서 나는 소리였는데도,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 그 사람이 내게로 다가올 때까지도 나는 창밖의 풍경에 온 신경을 쏟고 있었다.
“Excuse me, 앞자리 좀 앉을게요.”
……그걸 물은 목소리가 아주 익숙하지만 않았더라면! 난 건성으로 고개만 끄덕였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아니, 고개도 안 끄덕이고 풍경만 오롯이 감상했을 것이었다. 이건 아니어도 전혀 아니었고, 빨라도 너무 빨랐으며, 예상을 못해도 꿈에서조차 못할 법한 기막힌 조우였다. 드라마보다도 더 야속한 전개에 나는 신경질적으로 고개를 획 올려 어느새 알 없는 안경 너머로 능글한 웃음을 띠고 있는 남자를 한껏 쏘아봤다.
어제의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지쳐 잠들었던 밤은 잠깐의 휴전에 불과했었고, 2라운드는, 그리고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는 참이었다.
메일링을 원하시면 이메일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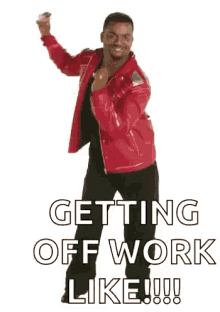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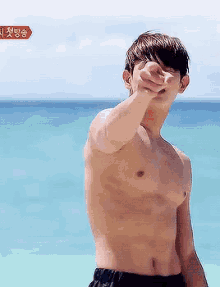
 현재 여론 폭발한 나솔사계 정숙 대우.JPG
현재 여론 폭발한 나솔사계 정숙 대우.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