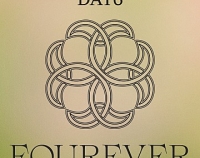"아오씨 내가 왜 남자까지.. 어떤놈인지 얼굴이라도 보자"
투덜투덜대며 얼굴엔 불만이 가득한 채 호스트바 실장을 따라갔다. 다다른곳은 특별실이었다. 돈이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비싼곳을.. 남자라는 생각에 무조건 내쳐야겠다는 생각만으로 왔는데 마음이 흔들렸다. 설마 40대 변태 아저씨가 기다리고있는 건 아니겠지? 속으로 불안불안했다. 아무리 남자라도 차라리 자기또래였으면 했다. 여자는 좀 늙어도 봐줄수있겠는데 늙은 남자는 다 벗고 얼굴만 마주봐도 토할 것 같았다. 긴장되는 맘으로 문을 조심스레 열었다. 고개를 요리조리 살피며 문틈새로 남자의 모습을 확인하려 했다.
"빨리 안들어가고 뭐해! 이게 물불가리고 있어"
호스트바 실장에게 한 소리듣고야 그제서 문을 열고 들어갔다. 들어가자마자 쿵!! 소리가 나며 문이 닫혔다. 하마터면 문에 찡길뻔했다. 돈없으니 이 취급받지 돈 많이 벌어서 이 호스트바 내가 다 따먹어야지 분한 마음이 가득했다. 안에 들어서서 방을 살피는 데 방엔 아무도 없었다. 왜 없는거지 하고 넓은 방안을 이리저리 휙 돌아보는데 어깨에 손이 딯는 게 느껴졌다. 소름이 확 끼쳐서 빨리 뒤를 돌아보았다. 40대 아저씨가 아니였다. 흰색 가운을 걸친채 방금 샤워하고 나왔는지 촉촉한 물기가 묻은 검은 머리칼에 꽤 곱상하게 생긴 얼굴을 가진 내 또래 아니면 동생일지도 형일지도 모르는 남자였다. 너무 의외여서 눈을 동그랗게 뜨며 그남자의 얼굴과 몸을 위아래로 계속 훑었다. 게이라는 단어랑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변태라는 단어랑도 멀어보였다. 외모때문에 주변에서 인기많을 것 같은 정상적인 남자 느낌이였다. 근데 도대체 왜 나를 부른거지? 이 생각에 혼란스러웠다. 몇 초 동안 정적이 흐르다 그 남자가 입을 열었다.
"뭘 멀뚱히 보고있어? 창남인 주제에 얼른 씻고와"
갑작스레 그 남자에게서 날카롭게 튀어나온 말이 가슴에 내리꽂아졌다. 어떻게 저리 담담한 표정으로 저런말을 하지 순간 자존심이 확 상해서 얼굴이 일그러졌다. 다시 표정을 피고 팔짱을 낀채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다.
"너는 남자랑 자고 싶냐?"
"니가 좋으니까 이정환."
내 귀를 의심했다. 이정환?.. 그 남자의 입에서 나온 건 분명히 내 본명 이정환이었다. 19년을 살면서 내본명을 들은건 16살때 이후로는 없었다. 17살때부터 살려고 호스트바로 들어왔으니까 그때부터 이 짓을 계속 해왔고 산들이라는 예명만 들어왔다. 그래서 내 본명을 잊을까봐 하루에 한번씩은 꼭 노트에 내 이름을 적곤했다. 그렇다면 내가 17살 이전에 본 사람중 한명이라는 거였다. 그 남자를 쳐다보며 기억을 떠올리려 애썼다.
아
문득 머리속에 과거의 장면들이 스쳐지나갔다. 하나하나 떠올릴때마다 마음이 바늘에 찔리 듯이 아팠다. 머릿 속 기억들은 생각할 수록 점점 뚜렷해졌고 그럴수록 마음속에 숨겨온 상처들이 훤히 드러나는 것 같았다. 눈물이 밀리듯이 올라왔다.
"개새끼"
"공찬식"
"네"
"이정환"
"이정환"
"이정환 오늘도 안왔니? 걔는 왜 맨날 학교를 빠지고 그래 하여튼 문제야"
"형이 아프대서요"
"노는건 아니고? 형이라고 감싸줄 필요없어 너라고 그런 형 좋겠니 겨우 2학년 다시 들어와서는"
거울 속에 비친 나는 처참했다. 교복 와이셔츠가 풀어져 뜯겨있고 머리도 헝클어져 산발이었다. 정신을 바로 잡을 수 없어 그대로 기절할 것 같았지만 계속 붙잡아야만 했다. 희미해져만 가는 정신을 붙잡으려 머리를 뒤로 쿵쿵 박았다. 그럴때마다 팔에 감겨져있는 수갑이 흔들려 부딪히는 소리가 시끄럽게 났다. 손목의 핏자국이 수갑에 물들여져 녹슬었다. 멍하니 거울 속 내 모습을 보자니 웃음이 났다. 아무 감정없는 웃음이 비참했다. 터진입술에 몸은 멍들고 상처투성이였다. 눈물은 얼굴에 번져 얼룩덜룩했다. 힘겹게 몸을 지탱하며 앉아있다가 나도 모르게 희미해진 정신에 몸도 철푸덕 쓰러졌다. 그렇게 쓰러져있기를 얼마나 흘렀을까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에 눈이 조금씩 떠졌다.
삐삐삐삐삐삐
현관문에서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곧이어 발소리가 들렸다. 이 방으로 향하는 발소리가 점점 커졌다. 내 심장박동도 같이 커졌다.
딸깍
내가 있는 곳 방문이 열렸다. 몸이 덜덜 떨렸다. 힘도 없는 나는 쓰러진채로 겨우 고개를 돌려 발을 봤다. 이제는 악을 써 힘이 빠진 목소리를 쥐어짜냈다.
"공...찬식..하..흐..나한테 왜...이..러는건데"
"니가 좋으니까 이정환."


 초록글
초록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