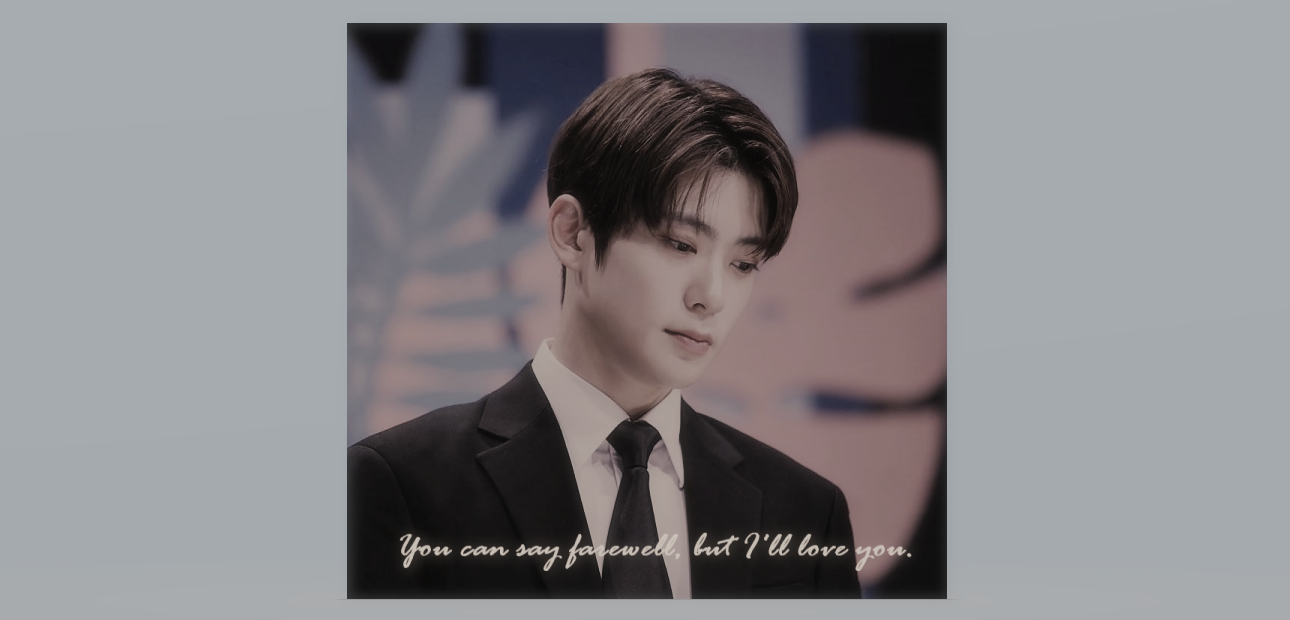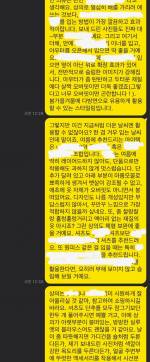![[NCT/재현] 당신이 사랑한 겨울 (그 남자의 기록)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0/12/07/18/262f07390509782c0d2d845453bddb2a_mp4.gif)
당신이 사랑한 겨울
정재현
한동안 많이 듣던 노래는, 전주만 들어도 한참 그 노래를 듣던 때의 나로 돌아가게 한다.
폴킴의 비
가을에서 겨울이 되는 그 즈음에서 눈 내리는 크리스마스까지 우리가 한참 빠져 있던 노래다.
니가 없이 맞는 세번 째 겨울에도 나는 여전히 그때의 우리를 추억하고 있다.
“이 노래가 왜 좋아? 비면 장마 때 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겨울 노랜데, 딱 싸비부분에 우리걷던~ 그부분 들으면 딱 겨울이야”
“그래?”
“진짜야 눈감고 들으면 눈앞에 겨울이야”
“하하하 알겠어”
“재현아 눈감고 들어봐, 눈이 쫘악- 깔려있는 예쁜 거리에 눈이 막 내리고 있어”
“눈이 막 내려? 어떤 거리인데”
“음 크리스마스 장식 되어있고, 가로등 있고, 예쁜 막 엄청 추운데 따뜻한 그런 느낌”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 거리에서 이 노래가 나오는 거야. 엄청 멋있는 남자가 혼자서 코트 쫘악 빼입고 서있어
“왜 혼자 있는데?”
“기다려 봐아, 지금 딱 설명 하려고 했어, 어, 어, 눈뜨지마”
“알겠어 ㅎㅎ”
“이 남자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랑 왔던 길이야, 근데 이제 헤어지고 나서 혼자 온 거지”
“응”
“그 때, 딱! 이노래가 나오면서 추억에 잠기는 느낌? 뭔 느낌인지 알겠어?”
“응, 알겠어, 멋진 남자가 헤어지고 나서 후회하는 노래네?”
“노래 진짜 잘만들었어, 눈감으면 막 앞에 그 거리가 보이잖아.”
“나 이제 눈 떠도 돼?”
![[NCT/재현] 당신이 사랑한 겨울 (그 남자의 기록)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18/04/21/18/d4e840a439926c508b4150e3369d1bcd.gif)
허락없이 눈 뜰 수 있는데 굳이 굳이 허락을 구한다. “응” 하고 대답하는 니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별것 아닌 일에도 니가 하는 말을 따라 주고 싶어서.
눈뜨자 마자 쫑알쫑알 말하고 있는 너의 얼굴을 괜히 한번 쓰다듬었다. 어쩐 그냥 보고 있는 것 만으로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둘이 걷던 이 길 위에 흘러나오던 멜로디를 흥얼거렸었지”
정말 오맨만에 웃었다.
잠시 네 생각하면서, 니가 해주던 이야기를 곱씹어 보면서 속없이 웃어버렸다.
그때 니가 눈감고 그려보라던 그 노래의 주인공이 나였나 보다.
눈이 내리는 하얀거리에
혼자 코트입고 서있는 남자
그 때 같이 듣던 그 노래에
사랑했던 사람을 추억하는 사람.
![[NCT/재현] 당신이 사랑한 겨울 (그 남자의 기록)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0/12/07/18/9210dacfec062160902faef0a00f3130.jpg)
“준희야. 겨울이 되니까 더 보고 싶다."
겨울을 참 좋아하던 너였는데,
이제는 옆에 없는 너의 이름을 담담히 뱉아내는 게 익숙해져 버렸다.
오랜만에 친구 놈들을 만나서 한잔했다.
각자 하루 산 이야기, 회사 이야기, 새롭게 시작한 사업 이야기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다가
또 금새 야구 경기 축구 경기에 열을 올리다가도, 한잔 두 잔 들어가면 사내놈들끼리 하게 되는 건 여자야기다.
새롭게 만나는 사람이 있다, 사내연애 하다 헤어져서 불편하다, 실없는 소리 속에서도 나에게는 요즘 누구 만나는 사람 없냐는 질문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몇 년 째 나만 한사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익숙해진 친구 놈들은 자연스럽게 연애 이야기를 할 때 나를 깍두기 취급해준다.
그러다가 더 취하면, 또 니 이야기를 하겠지.
아직도 나는 너 이후로 아무도 만나지 않고 있어서 더 취하면 니 이야기를 할 게 빤해서 적당이 마셨다. 술취해서 니 이야기를 하는 내 꼴을 니가 보면 싫어할 것 같아서.
들어주는 친구 놈들 질렸을 법도 한데, 누구 하나 이제 그만 잊으라고 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말을 하지는 않는다. 이래봬도 속 깊은 놈들이다.
소개팅 한 이야기, 처음으로 여자 친구랑 손잡은 이야기를 하는 친구 놈들 사이에서 소주잔만 만지작 거리면서 웃고 있었다.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할지 빤히 알고 있는 놈들이지만, 아무도 쉽게 니 이름을 니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
술자리가 길어지면서, 결혼한 친구 놈들은 하나 둘, 와이프가 너무 늦으면 싫어한다면서 자리를 뜨고 남아서 한잔 두 잔 기울이다가 한명씩 언제 오냐는 연락에, 아직 술 마시고 있냐는 걱정스러운 문자에 하나 둘 자리를 일어선다.
너를 보내고 한동안은 나도 술자리에서 취하면, 혹시 너한테 연락이 올 수 있지도 않을까 하면서 핸드폰을 계속 확인했었다.
그럴리가 없는데,
이제 니가 없는데 말이다.
머리로는 이해 하는데, 그냥 니가 없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그렜을 지도 모른다.
집에 들어서서 쇼파에 가방을 던지듯 내려놓고, 아침에 미처 하지 못하고 나갔던 설거지를 했다. 아침에 먹은 토스트에 아메리카도 그 자리 그대로 누구의 손길 도 닿지 않은 그대로 있다.
그게 뭐라고 다시 기분이 바닥까지 내려 앉는다. 니가 있을 때는, 언제 들어 오냐는 잔소리에 니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사서 들어왔겠지. 예쁜 짓 했으니까 봐 달라고 하면, 너는 또 잘생겨서 봐준다고 한번만 봐 주는 거라고 하겠지.
씻고 잠옷으로 갈아입고, 너무나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일들에 잠깐 잠깐 네 생각을 하게 된다. 니가 네 일상 그 자체 였으니까.
아직도 니가 너무 선명한데, 이제 조금씩 니가 없는 일상이 익숙해져 간다.
그 익숙함이 겁난다.
자려고 누운 잠자리에서 애들이랑 했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하는데, 핸드폰에 진동이 울린다.
이 시간에 연락이 올 사람이 없는데,
[기상시간 예약. 내일 오전 7시에 알람이 울립니다.]
핸드폰을 집으면서도 너에게 연락이 올 수는 없다는 걸 생각하고 있었다.
다시 곰곰히 생각해 보니, 오늘은 술을 마시는 동안 한번도 핸드폰 확인을 하지 않았다. 이제 오는 연락이 없다는 걸 나도 인지하고 거기에 익숙해져 간다.
![[NCT/재현] 당신이 사랑한 겨울 (그 남자의 기록)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0/12/07/18/dede66f2a0c1b449bdd3b601ff2d1131.jpg)
“미안해 준희야, 내가 계속 익숙해져가.”
.
.
.
“미안해.. 내가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미안해 나만 혼자 괜찮아져서 미안해”


 초록글
초록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