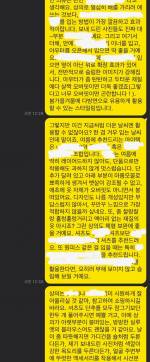“미안해요.”
그의 링거를 체크하고 있을 때, 그가 내게 건넨 첫 마디였다.
“미안해요.”
“그것뿐입니까.”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더 미안해요.”
나는 그의 독방을 나갈 채비를 했다. 그리고 그는 그런 내 손을 붙잡았다.
“도와주세요…….”
“…….”
“살려주세요…….”
그는 흐느끼고 있었다. 나는 감시하고 있는 교도관에게 손짓을 했다. 다행히 그 교도관은 그를 미워하지 않는 교도관이었고 그는 독방의 문을 닫고 나갔다.
“무서워요…….”
“무엇이 말입니까.”
“처음엔 당신이 제게 등을 돌리는 게 무서웠어요. 날 미워하는 걸까, 그래서 나한테 다시 그것을 건넨 것일까, 그래서 날 죽이려는 데에 동참한 건가.”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걸 건넨 건, 그냥, 내게 도피처를 건넨 거라고……. 나도 알아요. 말하기 어렵지만 어떤 마음에서 건넨 건지 알아요. 적어도 날 죽이려고 건넨 건 아니란 거, 그 정도는 나도 알아요.”
“…….”
“그런데 지금은…….”
“…….”
“지금은 모든 게 다 무서워요.”
나는 내가 그에게 다시 건넨 그 약통을 보았다.
그는 죽음, 그리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
어느 사형집행인의 일지
n일차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
마음이란 건, 감정이란 건 형용할 수 없겠지만 그가 하는 말은 다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에게 약통을 건넸는지 알고 있었다. 적어도 그를 죽이기 위함은 아니란 걸, 그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의 조카인 ‘그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그분’이 그를 어떤 경로로든 죽일 것이란 걸 알고 있었다. 그는 죽음 보다 ‘그분’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가 그 두려움을 내게 토로했을 때 나는 아무 것도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다. 그가 나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알고도 아무 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듯, 나 또한 그러했다. 그저 들어주는 것 뿐, 나는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를 다독일 수도, 그를 위로할 수도 없었다. 그것은 그저 보이는 것일 뿐이란 걸, 그도 나도 모두 알고 있었다.
그 또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를 아는 모두는 그것을 간과하고 있었다. 그도 사람이란 것을.
그도 두려움을 가질 수 있음을, 잊고 있었다.


![[VIXX/이재환] 어느 사형집행인의 일지 n일차 | 인스티즈](http://file2.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16/03/20/0/c94ea35c31d7636ba15a5cda6a87191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