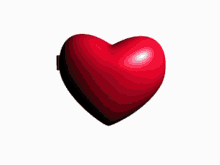"누구세,"
![[엑소/백도] 색리스 01 | 인스티즈](http://file2.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16/08/04/1/4b9bdc160f7800b93799836d7eea1c9f.gif)
"안녕, 세훈아."
![[엑소/백도] 색리스 01 | 인스티즈](http://file2.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17/01/07/0/a9e0f1bec4a206df57a98e913ea8a7ea.gif)
"..."
"어디 있어."
"또 왔네요. 모르겠는데요."
아침 일찍 부터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잠이 덜 깬 눈을 비비며 나간 세훈은 새벽녘에야 겨우 잠든 제 스승을 생각하며
어깨를 으쓱였다.
"미술 하는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을텐데."
"상관 없,"
"당장 네 스승만 봐도 알잖아."
"..."
"저번에도 말했지만. 좋게 말 할 때 데려와. 내 앞으로."
세훈의 뒤로 보이는 굳게 닫힌 방문을 바라보며 커프스를 손으로 만지작 거리던 백현이 세훈의 머리를 툭툭 쓰다듬고는
금방 세훈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엑소/백도] 색리스 01 | 인스티즈](http://file2.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1501101/f752a571450cd61744e6649d3407d724.gif)
"자꾸 미안해, 세훈아."
"더 자요."
혹시나 깼을까 싶어 방으로 들어간 세훈은 침대에 가만히 앉아 잔뜩 충혈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경수를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무섭도록 새빨간 암막 커튼은 이 방에 들어올 때 마다 적응이 되지 않는 세훈이었지만 아무렇지 않은 듯 커튼을 쳐주고는 방 밖으로 향했다.
잠이 가득 담긴 목소리가 세훈을 불렀다.
"깨우지마."
잠이 다 깨버려 몸을 웅크리곤 쇼파에 가만히 기대 눈을 깜빡이던 세훈은 물감이 다 굳어 울퉁불퉁해진 캔버스를 만지작 거리며 눈을 감았다.
굳이 보지 않아도 손가락 끝으로 느껴지는 쨍한 색감. 제가 가장 존경하던 화가, 경수의 그림이었다.
![[엑소/백도] 색리스 01 | 인스티즈](http://file2.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16/06/29/23/dc6de0d7552b269012add9898bff6cf6.gif)
"..."
어느새 훌쩍 커 제게서 경수를 숨기려 드는 오세훈부터 도경수의 상태까지 어느 것도 마음에 드는게 없었다.
"도화가 없어졌던 5년 동안 도경수한테 있던 모든 일 하나도 빠짐 없이 다 찾아서 보고해."
"네."
"당장 오늘 오후까지."
겨우 찾아낸 도경수였다.
바쁜 시간을 쪼개 작업실에 놀러갈때면 얼굴과 손에 물감을 묻힌 채 환하게 웃으며 날 반기던 도경수는 이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