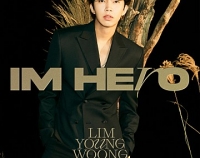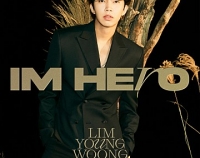여주는 정신이 나가는 아찔함을 느꼈다.
그저, 입술이 닿았다 떨어졌을 뿐인데 몸이 공중에 붕 떴다 아래로 추락하는 느낌이었다.
처음, 처음이었다. 첫 입맞춤이었다.
“대답을 강요하지는 않을게.”
“…….”
“그렇지만 무작정 밀어내지는 말아줘.”
“…김석진….”
이 또한 처음이었다. 반장이란 호칭 대신 이름으로 석진을 불러본 것 또한 처음이었다.
이름으로 부르게 되면 마음이 더 커질까 싶은 조바심에 혼자 몰래 불러본 것이 다였다.
##여주는 제가 죽는 날까지 그를 이름으로 부를 생각이 없었다.
이름을 부르게 되면 친밀한 사이가 된 것 같고 그렇게 느끼면 더 가까워지고 싶어질 테니까,
분명 그럴 테니까 조금의 거리감을 만들고자 항상 반장이라고 불러왔던 것이었는데….
“너… 그러면 안 돼….”
“뭐가?…”
“미쳤다고 할 거야.”
“…….”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곧 죽을 사람을 좋아한다고? 다들 널 미쳤다고 할 거야. 이건 아니야. 반장. 이건, 아니야.”
“##김여주!”
석진의 고함이 들려왔다. 예상했던 반응에 여주는 눈을 질끈 감았다 떴다. 냉정한 소리라는 것 쯤 알고 있다.
알고 있기에 하는 소리였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빛에 있었으면 하니까.
빛과 가까운 곳에 있었으면 하니까. ##여주가 많은 말을 속에 감추고 석진을 바라보자 그가 말했다.
“왜, 이건 아닌 건데…?”
“봐봐.”
“뭘!”
“난 이렇게 널 울리기만 하잖아.”
여주의 말에 석진은 그제야 제 시야가 흐리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슬픈 감정은 왜 이렇게 빠르게 전염되는 것일까.
그동안 여주가 참 눈물이 많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보니 저가 그런 말을 할 처지가 아니었다.
“울지 마.”
“…취소해….”
“…….”
“안 울 테니까 이건 아니라고 한 말 취소해.”
많이 유치해졌다. 석진은 그렇게 생각했다. 제 성격이 유치한 면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감정 앞에서도 이렇게 유치하게 나올 줄은 몰랐었다.
그는 눈물진 제 볼을 쓰다듬는 여주의 손을 꼭 붙잡았다.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듯 꼭 쥔 손이 아파왔지만 여주는 아픈 내색 없이 말했다.
“그래- 취소한다고 하자.”
“왜 가정이야.”
“병원에서 한 발도 나가지 못하는 환자랑 뭘 할 수 있는데?”
여주의 목소리에는 한숨과 체념이 담겨있었다. 석진은 그녀의 말에 순간 말을 잃었다.
입 안에서는 왜, 병원에 있는 게 뭐가 어때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여주의 말에 반박할 말이 가득 했지만 정작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한 단어도 없었다.
“있잖아. 반장.”
있잖아. 석진아.
“그러지 않아도 돼. 난 네가 나를 만나러 와주는 것 만해도 충분히 고마워하고 있어.”
나도 너 좋아해.
“그러니까, 그러지 마.”
슬픈 길이 뻔한 곳으로 발 디디지 마.
“…하!”
막을 수 없이 터지는 웃음을 뱉고 석진은 고개를 숙였다. 제 볼에 올려 있던 여주의 손은 어느새 내려가 있었다.
그는 물끄러미 그녀의 손을 바라봤다. 처음 봤을 때 보다 더 앙상해져 있었다.
그 앙상하고 작은 손을 바라보고 있자니 문득 언젠가 간호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 간호사는 이런 상황이 올 걸 알고 나에게 그런 말을 해줬던 것일까.
애초부터 마음 펼 생각하지 말고 접으라는 심산으로?
“…오늘은 이쯤하고 갈게.”
“…….”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석진은 가냘프게 떨리는 여주의 손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간다는 제 말에 여주는 대답이 없었지만 그는 가방을 챙겨 병실을 나왔다.
“왜- 넌 그 흔한 사랑조차….”
병실을 나온 석진이 벽에 몸을 기대며 중얼거렸다.
가슴을 메우고 있는 답답함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두 손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서있던 그가 긴 한숨과 함께 앞으로 걸어 나갔다.
늦게 올려서 미아내여...홍일점님8ㅅ8....
잘모태써(셀프맴매)
읽어주시는 내님들도, 독자님들도 모두모두 감사드린니당!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여'ㅅ'♥


 초록글
초록글![[방탄소년단/김석진] 나우이즈굿 11 | 인스티즈](http://file2.instiz.net/data/file2/2017/03/27/b/c/d/bcda679b90c6a0e9e5b48dcb58d9e25a.gif)
![[방탄소년단/김석진] 나우이즈굿 11 | 인스티즈](http://file2.instiz.net/data/file2/2017/03/27/e/5/7/e5703be08ea882ba6150b59b1076d734.gif)
![[방탄소년단/김석진] 나우이즈굿 11 | 인스티즈](http://file2.instiz.net/data/file2/2017/03/27/a/a/2/aa20159dc693dd7ce739f907676c0b74.gif)
![[방탄소년단/김석진] 나우이즈굿 11 | 인스티즈](http://file2.instiz.net/data/file2/2017/03/27/b/3/b/b3bedad28040dab36bea65b26bdfeed0.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