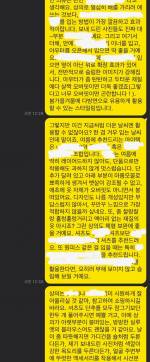'후회해요?'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차마 그의 눈을 바라볼 수 없었다. 아직도 그의 눈을 보면 뭔가에 홀리는 것 같았다. 아니, 정말 사람 마음을 빼앗아간다. 맑은 두 눈에 깊은 슬픔이 박혀 있어서, 나는 그걸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만 만날까요?" "내가 붙잡으면, 지금 붙잡으면 쓰레기일까?" "......." "내가 네 아픔까지 다 품을 수 있길 바라는 건 욕심일까?" 툭, 툭. 마지막으로 마주잡은 손 위로 차가운 눈물이 떨어졌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었다. 손을 뻗어 그의 눈물을 닦아 줄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그의 손을 놓을 수도 없었다. 쓰레기는 나인데, 욕심은 내가 부리는 건데. 그의 눈물이 떨어질수록 나는 점점 더 고개를 깊이 숙일 수밖에 없었다. 내 나름의 배려였으니까, 그건. 나는 이렇게 끝까지 이기적이니까. "나 그 욕심 좀 내게 해 주면 안 될까." 결국 나는 다시 그가 무너지게 해 버렸다. * "저는 그럴 여유가 없어요." "괜찮아." "왜 끝까지 다정해요, 왜." 진심이었다. 그가 내게 주는 사랑은 내가 받기에는 너무 과분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놓아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그는 나보다 더 좋은 사람에게, 나보다 더 예쁜 사람에게, 나보다 더 착한 사람에게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르구나, 우리는." "...." "너는 끝이구나, 나는 시작인데." * "분명 좋은데, 진짜 좋아요. 그런데요, 선생님. 왜 아프죠? 왜 힘들죠? 왜 그 사람 얼굴만 보면 눈물이 먼저 흐르죠? 그 사람 손도 더 잡고 싶고, 그 사람 품에 더 안기고 싶고,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여기가, 가슴이 막 간지럽고 두근거리는데... 왜 모든 것이 마음대로 안 될까요. 왜 엇나가기만 할까요, 전." "서툴러서 그래요." "네?" "사랑받는 게 서툴러서 그래요. 그리고 사랑을 주는 것도 서툴러서 그래요." 그 뒤로는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냥 그의 얼굴만 내 머릿속에 가득했다. 이제야 알 것 같은데, 이제야 제대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나는 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다. 그의 집이 어디인지, 어디에서 일하는 건지, 아무것도. "보고 싶어, 보고 싶어요. 임영민, 보고 싶단 말이야!" "나도 보고 싶어." 신은 처음으로 나의 손을 들어 주었다. 7월 8일 정식으로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글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