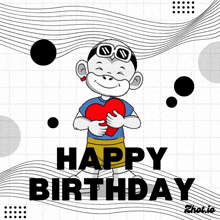목소리의 형태
그날부터 너는 학교에서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축제 때 너에게 불려주려 연습하던 노래는 그만 두기로했다.
들려주고 싶었던 것은 노래가 아닌, 내 마음이었더라. 들어줬으면 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느 것도 의미가 없었다.
하지만 너는 말없는 나의 기다림이 무색하게 축제도, 방학식도. 그 어느때보다 길었던 방학이 끝나고 졸업식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랜시간동안 들리던 시끄러운 눈물 섞인 웃음소리도, 여기저기서 들리던 카메라 셔터음도 모두 사라지고 운동장은 모래알을 굴리는 바람만 남겨져있었다. 스탠드에 앉아 그 멀리를 바라보다 내 손안의 너를 닮은 작은 꽃송이들에 눈을 옮겼다. 물을 잔뜩 머금고 있던 꽃잎들은 아침과는 다르게 꽤나 말라가고 있더라. 그게 마치 내 모습처럼. 과연, 나는 이 꽃을 네게 줄수있을것이라 생각한걸까. 더이상 나는 널 볼 수 없단걸, 이제야 피부로 와닿았다. 꽃다발을 앉아있는 옆자리에 내려놓았다. 눈을 꾹 감고 얼굴을 쓸어내리는 순간, 바스락 소리와 함께 자리에 앉곤 꽃다발을 무릎 위로 올려놓는 두 손이 보였다.
"...정수정."
"청승이냐, 혼자."
"청승은 무슨.. 안 가고 뭐하냐."
"가려다 보이길래. 꽃 예쁘네. OO가.. 좋아하던건가."
아픈 그 이름을 듣자 무의식적으로 정수정과 눈을 맞췄다. 내 눈을 나만큼 아프게 바라보더니 이해했다는 듯 운동화 코로 시선을 돌리며 나즈막히 읊조렸다. 'OO.. 안와. 전학 갔대.' 그 한마디에 나의 마음 속에는 천둥이 내리쳤다. 아, 꽤 깊게 너는 내 마음안에 있었구나. 송두리채로 누군가 너를 내게서 앗아가는 기분이다. 비어버린 그 곳이 시리도록 아팠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러면 그 허전한 곳이 채워질까봐. 하지만 이내 긴 한숨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빠져나가버리더라.
"걔, 오해하지는 마. 그렇게 자잘하게 괴롭힘 당하면서도, 너 구설수에 안올릴거라고 혼자 씩씩하게 버티던 애야. 가야만했던 사정이 있을거라고 난 생각해."
그것이 그토록 간절하던 너의 이유였구나. 너는 어렸을 때의 그 빛나던 사람 그대로였다. 너의 말대로 난 너를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았나보다. 그저 약한 애라고 생각만 했지. 내가 너의 옆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너가 나의 옆을 지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그 병, 난청도 같이 오는거래. 병원에서는 수술하면 현기증은 괜찮아질 수 있지만 청력은 놓칠 수 있다고, 그래도 해야한다고 그러는데 안한댔어, 걔가."
"..."
"너가 하는 노래 듣기 전까진, 못한다더라."
"...아,"
기어코 꾸역꾸역 쏟아져 나오는 눈물은 주워담을 수 없었다. 이렇게 흥건하게 고여버리면 내가 잠겨 죽을 수도 있을것만 같았다. 너가 아파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픔을 덜어주긴 커녕 알아주지 못했다. 먼저 세상의 아픔을 알아버린 너는 그 아픔을 모두 제 것으로 돌리며 나를 지키려 했겠지. 나는 멍청하게도 그것이 내 아픔인 것을 모르며 딴에 너를 지키려 했던 것이다. 누가, 누굴 지킨다고.
"OO가 너 그렇게 포기 안한거처럼, 너도 OO 포기하지마."
정수정은 한참을 소리없이 우는 나를 가만히 보다가 등을 두어번 두드려주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도 이제 가야지-' 겨우 눈물을 주워담고 고개를 들어 정수정의 뒷모습을 보았다. 두 사람의 틈에서 묘하게 맞지않는 그 균열을 지켜본다는 정수정 본인도 많이 힘들었는지 속이 후련하다며 기지개를 쭉 피고 발랄하게 웃어보였다.
"아,"
"졸업. 축하해."
"그렇게 전해달래."
마지막으로 정수정이 건내고 간 그 한마디는 너의 목소리가 되어 내 귀를 맴돌았고, 나는 고장이라도 난 마냥 참지 못하고 또다시 눈물을 쏟아냈다.
* * *
[그 건물 5층에 있는 학원 다니고있대. 이창섭 너, 애 놀래키고 그러면 안된다!!!!]
알겠다고, 알겠다고. 신신당부하는 정수정의 전화를 끊고 시린 머리무새를 매만졌다. 몇 번의 계절이 지나고 또 한번의 졸업을 앞둔 겨울이 코끝에 다가왔다. 이제는 더이상 너의 향기가 나지 않는 목도리를 고쳐매고 쿵쾅거리는 맘을 부여잡은 채 건물의 계단을 하나씩 올랐다. 보면 뭐라고 하지? 인사는 어떻게 해야할까. 어색하진 않겠지? 옛날처럼 장난치면 되겠지. 너는 이뻐졌겠지, 아니 여전히 예쁘겠지? 키는 좀 컸을까. 마지막생각을 하며 혼자 웃음이 피식 새어나왔다. 작은 키에 꼬맹이라는 애칭으로 꼼, 하고 부르곤 했는데. 그때마다 식식거리며 솜 같은 주먹으로 내 배를 툭툭치던 너의 모습이 눈앞에 선했다. 아, 지금 내 모습이 이상하진 않겠지.
5층에 도착하자마자 달큰한 너의 향기가 다시 올라왔다. 물론 그 향기는 목도리에서가 아닌,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흘러왔다. 이토록 내 고개가 무거웠던가, 어렵게 고개를 들자 복도에서 창밖을 보고있는 너를 바로 발견했다.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아 훅, 하고 숨을 참았다. 묘하고도 아름다운 분위기를 띈 채 바깥으로 뻗은 너의 손 위에는 어느 새 눈이 한 송이씩 내리고 있었다. 눈과 함께하는 너는 여전히 하얗고 예뻤다. 너는 마지막 보던 그날과는 다르게 검은 머리를 위로 예쁘게 묶고있었다. 그런 너의 모습에 나의 시선은 자연스레 너의 귀로 갔고, 그 어색하던 물건이 없는 오롯한 너의 귀를 보며 삭막하던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너가, 혹시 너가. 더이상은 아프지 않은걸까 하는 그 기대감이 커져버려서.
너에게 다가가려 계단을 벗어나려던 그때, 학원 문에서 나온 남자애가 너의 등을 몰래몰래 다가가더니 툭 쳤다. 깜짝 놀라며 뒤로 돌아 남자애를 확인하고는 그리웠던 웃음소리를 내며 무어라 말을 하는 너를 보며, 나의 그 기대감은 하늘에서 땅으로, 그 밑으로 다시 무너져내렸다.
"[서울수화전문교육원]"
너의 말은, 목소리가 아닌. 손짓으로 표현되고 있었다.
| 녀러분! |
1. 아니여러분! 왜이렇게 다들 슬퍼해요! 오늘 이야기 쓰기가 미안할정도로!!! 다음 편에는 정말루 행복한 이야기 쓸게요 희잉‧⁺◟( ᵒ̴̶̷̥́ ·̫ ᵒ̴̶̷̣̥̀ ) 2. 댓글 써주는 예쁜이들 때문에 빨리 오고싶어서 분량이 쫌 적어용. 여기서 끊어야 담편부터 여주맘으로 갈 수 있을거같아서 !!! 3. 번외도 좀 쓰고싶은데 보고싶은 이야기 있으면 댓글로 말해주세요 ! 4. 오늘도 나는 허접해요. 읽어줘서 기다려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앗(͒ ˊ• ૢ·̫•ˋૢ) 5. BGM은 로이킴 님의 북두칠성 입니닷 |


![[비투비/이창섭] 목소리의 형태 03 | 인스티즈](http://file2.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17/07/27/22/5f7feaaf86a1839aa473301382bb1e5d.jpg)
![[비투비/이창섭] 목소리의 형태 03 | 인스티즈](http://file2.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17/07/27/23/e78c62b38864b528d14b9608fd9f7f5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