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M Niia - Hurt You First
[결혼의 조건]
난 돈 많은 시댁을 원했다.
다정한 남편도, 애교 많은 자식도, 싹싹한 시누이도, 착한 시부모님도 다 필요 없으니 지금 당장 일을 그만둬도 3대는 먹고 살 만한 재력 있는 집안을.
그가 딱 그랬다.
그는 자기 부모님의 비위를 맞춰줄 여자를 원했다.
자신과 시댁을 위해 뭐든 다 할 수 있는 여자를.
착하고, 성실하고, 예의 바르고, 고분고분한. 적어도 그런 척이라도 해줄 수 있는 여자를.
어떻게 보면 재미없고 금방 질려버릴 여자를.
그래. 그게 나였다.
어디 가서 못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
마음먹고 들이대면 싫다는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올라갔고, 면접을 봤던 회사에서도 예쁘단 이유 하나만으로 입사했다.
그래서 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았고 제대로 하는 것보다 실수하는 게 더 많았다.
"그거 하나도 제대로 못해서 입사는 어떻게 한 거야?"
"이름씨, 내가 이거 부탁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제자리야?"
"대체 쟤 누가 뽑았어? 얼굴만 반반하면 다야?"
혼날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같은 말뿐이었고 뒤에서는 나에 대한 험담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일도 제대로 못하는 직원을 계속 데리고 있을 회사가 어디 있으랴.
"어, 엄마. 나 다음 주에 내려갈 것 같아."
짤렸다.
몸만 한 상자에 짐을 한 개씩 담기 시작했다.
캘린더, 다이어리, 필기구 몇 개, 작은 탁상시계, 충전기. 그게 전부였다.
약 한 달을 몸담았던 회사에서는 더 좋은 직장을 구하길 바란다며 겨우 기차표를 끊을 만큼의 지폐 몇 장을 건네주었다.
"그동안 수고했어 이름씨."
"이렇게 금방 가버릴 줄 알았으면 더 잘 해줬을 텐데. 아쉽네."
소름이 돋았다.
지금껏 나에 대해 마음대로 욕하고, 온갖 험담을 늘어놓던 그들이 이제 와서 나에게 위로랍시고 형식적인 몇 마디를 건네고 있었다.
다 거짓말쟁이들이야.
회사 밖으로 나오자마자 공용 쓰레기장으로 향했다.
꼴도 보기 싫었다.
여기서 쓴 물건들에는 별 저주가 다 내려있을 것만 같았다.
상자 째로 아무 데나 던져버리자 신고 있던 신발이 눈에 들어왔다.
직장인이랍시고 처음 산 구두였다.
잠시 망설이다 이내 그것마저 벗어버렸다.
마음 같아선 옷도 다 벗어 태워버리고 싶었다.
여기서 있었던 모든 일은 다 꿈이었던 것처럼, 아무것도 남기고 싶지 않았다.
"집은 가야 하니까. 어쩔 수 없지."
조그마한 철제 통에 미세하게 붙어있던 불속으로 다 내던져버렸다.
타닥거리는 소리, 가죽 타는 냄새. 그제야 모든 게 끝난 것 같았다.
사람들이 쳐다보든 말든 버스 정류장에 앉아 몸을 기댔다.
"아. 배고파."
그제야 감각이 하나둘 돌아오는 것 같았다.
발은 돌에 찍혀 상처가 나있었고 스타킹은 여기저기 올이 나가있었으며 어제부터 굶은 배는 고프다 못해 아파왔다.
"성이름 왜 이러고 사냐."
이제 뭐 하면서 살지, 라는 생각이 꼬리를 물고 지구를 세 바퀴 돌았을 즈음 누군가 내 어깨를 톡톡 건드렸다.
"이름씨?"
"어, 이사님."
그게 김태형이었다.
같은 회사에서 일했지만 마주친 건 지나가다 몇 번, 출근하다 몇 번. 그게 다였다.
사장의 내연녀 아들이라느니, 사장 부인의 내연남이라느니, 숨겨둔 자식이라느니, 입양아라느니 별별 소문을 다 끌고 다니는 인물이었다.
확실한 건 사장을 등에 업은 낙하산이고 돈이 꽤 있단 거였다.
"그만뒀다더니, 인간이 되는 것도 그만둔 거예요?"
"...네?"
"아니. 신발을 안 신고 있길래. 그럴 거면 옷도 벗어버리지?"
그는 소리를 꺼둔 채 표정만 보면 참 다정하다 싶을 만큼 생긋 웃고 있었다.
"무슨 말을 그딴 식으로 하세요."
이제 더 이상 그쪽 부하 아니다 이거야. 하는 심정으로 발끈해버렸다.
그런데 그는 약 올리듯 어깨를 으쓱하곤 내 팔을 잡아끌었다.
"점심이나 같이 먹어요."
뭐지, 이 새끼?
"저한테 왜 이러세요?"
회사 근처였지만 가격이 상당해 꿈만 꿔오던 레스토랑이었다.
갑자기 잡아 끌린 팔에 질질 끌려온 곳이, 맨발에 구멍이 잔뜩 난 스타킹을 신은 채 들어온 곳이 이런 곳이라니.
"이거 웰던으로 하나요."
뭐? 하나?
심지어 같이 먹자더니 달랑 자기 거만 시켜놓고 신나게 먹는 꼴이라니.
고기를 썰다 말고 중간중간 나를 쳐다보며 입꼬리는 왜 올리는 것이며, 주변에서 대놓고 쳐다보는 시선은 왜 즐기는 것인지.
"사줄 것도 아니시면서 저는 왜 데려오신 거예요?"
"같이 먹자고."
설마, 같이 '먹자'는 게 아니라 '같이' 먹자는 뜻이었나.
"밥 혼자 못 드세요?"
"그건 아닌데. 내가 밥 먹으러 가는 길에 네가 있었잖아."
서로 몇 살인지도 모르면서 말은 왜 놓는 건지. 원래 돈 많은 놈들은 저렇게 싸가지가 없는 건지. 에 대한 생각이 밀려올 때쯤,
"내가 잠깐 조사를 해봤거든요."
다 먹은 건지 입가를 닦던 그는 가방에서 서류를 하나 꺼내 내게 내밀었다.
뜯어보란 손짓에 꽤나 많은 양의 종이를 꺼낸 나는 황당하다 못해 어이가 없을 지경이었다.
내 인적 사항은 물론이고 지금껏 만난 남자들의 인적 사항까지 모조리 기록되어 있었다.
"지금 저랑 뭐 하자는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에게 내 신상을 털렸다는 게 화가 났다.
손이 하얘질 정도로 힘을 꾹 쥔 나를 본 그는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 봉투를 하나 더 내밀었다.
"열어봐요. 그럼 화가 좀 진정될 테니."
숨소리조차 일정하지 않을 정도로 화가 난 상태에서 그깟 봉투가 눈에 들어올 리가 없었다.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니까요!"
우아한 클래식이 나오던 레스토랑이 일순간 내 목소리로 뒤덮여 사방을 울렸다.
그는 얼굴을 잠깐 찡그렸다 한숨을 내쉬곤 봉투를 열었다.
그가 꺼낸 건, 최소 10장은 되어 보이는 수표들이었다.
그리곤 놀란 내 얼굴 앞에 지폐를 흔들며 씩 웃었다.
"나랑, 계약 하나 합시다."
그의 말대로라면 무슨 짓을 한 건 그쪽이 아니라 내 쪽이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회사 단체 회식이 있던 날, 술에 잔뜩 취해 가게 앞에서 넘어져있던 날 발견해 일으켜준 김태형에게 돈이 많냐고 물었고
그렇다는 그의 대답에 그럼 나와 결혼하자며 떼를 썼다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진짜 결혼을 하자고 하시면 어떡해요?"
"인생 목표가 돈 많은 곳에 시집가는 거라면서요. 안 그래도 지금껏 만나온 남자 대부분이 꽤나 재력 있는 사람들이던데."
"제가 언제요?"
"그날 그랬잖아요. 하도 몸을 흔들길래 난 어디 지진난 줄."
와. 나 생각보다 많은 짓을 저질렀구나.
"난 결혼이 필요하고, 당신은 돈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서로 돕고 살자고요."
그래. 난 저 말에 넘어가선 안됐다.
정국에 뷔온대 |
제목 고르는 거 너무 힘들었어요. 남주도 정말 힘들었어요. 태형이를 원하는 분들이 꽤 계시길래 태형이로 들고 와보았습니다! 남준이는 언제 등장할지 저도 모르겠지만 가능한 한 빨리 등장시켜 보도록 하죠. 다들 크리스마스는 잘 보내셨나요? 저는 그냥 집에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 무슨 소용인가요. 그냥 빨간 날 중 하나일 뿐이죠. 그럼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저랑 같이 저글러스 봐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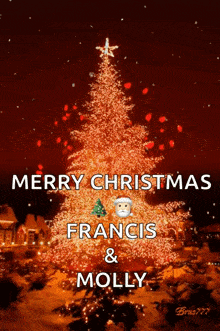


 탑 연기 상상한 것 그 이상임
탑 연기 상상한 것 그 이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