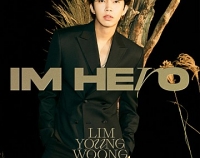![[EXO/경수] 도경수 사장님 (부제: 찌라시) | 인스티즈](http://file.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b/1/2b12fb80705bbea4ff70091819be46cf.jpg)
도경수 사장님
06
부제 : 찌라시
평화로운 주말 오후, 늘어지게 자며 깨도 다시 자고, 또 깨도 또 자고, 자는게 질리기 전까진 뜰 생각이 없던 눈이 지이잉- 하는 진동 소리에 떠졌다.
힘들게 떠진 눈과 인상을 못생기게 구기며 더듬더듬, 보이지도 않는 핸드폰을 이리저리 찾았다. 찾는 동안 한번 꺼진 진동은 이내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나 참, 누군데 이렇게 전화를 못해서 안달이야. 드디어 손에 잡힌 핸드폰을 들어 누군지 확인도 안하고 귀에 갖다댔다. 여보세요.
- 야, 너 남자친구 생겼어?
"뭐야 또... 아침부터 난데없이."
- 아침은 무슨, 딴 소리 말고 말해 봐. 있어?
"없다, 왜. 갑자기 그건 왜 물어보는데."
- 진짜 없어?
"없다니까. 지금 아픈데 쑤시냐? 엉?"
- 아닌데, 이거 아무리 봐도 넌데.
여보세요, 갈라진 내 목소리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남자친구가 생겼냐는 친구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귀에 울렸다. 목소리에서 김은지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잠깐 폈던 인상을 다시 구겼다. 나에게 애인이 없다는 걸 제일 잘 알고있을 년이, 생기더라도 내가 제일 먼저 말 할 사람은 본인이라는 걸 잘 알고있을 년이 웬 질문.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에 떴던 눈을 감으며 하품을 했다. 집중 좀 해달라는 듯이 하이톤의 짜증을 내면서 얼른 내 대답을 촉구하는 은지에게 없다고 대답했다. 안생겨요, 씨발.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 보다 많이 차분 해지고 진지해진 듯한 은지의 목소리에 궁금증이 폭발하고 나도 덩달아 진지한 목소리로 물어봤다, 그건 왜 물어봐.
진짜 없어? 이유를 막론하고, 내 질문을 막론하고, 김은지는 그저 애인이 없다는 내 대답을 의심하고 있다. 없대두, 개년아. 아픈데 쑤시냐? 응?
억울함이 가득 담긴 내 말에 은지는 그제서야 목소리를 낮추며, 이거 아무리 봐도 넌데. 이해 할 수 없는 말을 했다. 뭐가 난데?
- 너 도경수라고 알아?
"도경수?"
- 어, 도경수. 우리같은 사람이 알고지낼 정도로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 질문하는 것도 웃기....
"알아."
- .....엉?
"알아, 도경수. 카페 일 하면서 몇 번 마주쳤어."
너 도경수라고 알아? 대뜸 은지가 던진 질문에 도경수라는 이름이 담겨있어 나도 모르게 눈이 번쩍 뜨였다. 도경수? 재차 물으니 "응, 도경수."
아는...건가, 모르는건가. 모르는 사이는 아니니까 아는 사이겠지? 안다고 하기엔 이름밖에 모르는데, 그래도 대화도 꽤 해봤으니... "알아."
어? 하는 은지의 덜 떨어지고 바보같은 소리에 대답했다. 몇 번 마주친 정도가 아니지만 어쨌든 넌 그렇게만 알아둬.
- 미친, 그럼 이게 진짜 너란 말이야?
"도대체 뭐가 아까부터 나라는 건데. 뭐 어디 나 닮은 사람 사진이라도 보고있냐?"
- 너 도경수 차도 타고 다녀?
"어?"
- 걔 차는 왜 타고 다녀?
"응?"
- 걔랑 사겨?
"뭐?"
- 무슨 사이인데?
아까부터 뭘 보고있는지, 내가 맞느냐 아니냐를 따지고있는 김은지때문에 갈수록 불안한 마음만 늘어가는 노릇이었다. 도대체 뭐야. 뭘 보면서 도경수 얘기까지 나오는거냐구.
너 도경수 차도 타고 다녀? 왜 타고 다녀? 사겨? 폭풍으로 휘몰아치는 은지의 질문에 정신을 못차렸다. 일단은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몸을 일으켜 앉았다.
차를 탄건 맞지만 도경수의 선의에 불과했고 사귀는 건 더더욱 아니다. 어? 응? 뭐? 도대체가 맞다고 할 만한 질문이 하나 없어 멍청한 소리만 계속 나왔다.
무슨 사이냐는 은지의 말에도 대꾸할 만한 대답이 딱히 생각나지 않았다. 내가 도경수랑 무슨 사이냐니, 찍소리도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 DO그룹 사장 도경수, 연인과 함께 차에 올라타는 순간 포착.
".....?"
- 선배한테 저러고 사진 세 장 덜렁 왔어, 너랑 도경수 둘이 도경수 차에 타는 사진, 각자 다른 날로 3장.
"....."
- DO그룹이 좀 큰 기업이냐? 주식 하나로 인생을 좌지우지 하는데, 건수 하나만 잡히면 바로 돌아. DO 정도면 말 다했지.
".....나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돼, 은지야."
- 찌라시야, 찌라시. 기사는 언제 날지 나야 모르지, 안날 수도 있는거고.
"....."
- 사귀는 사이가 아니더라도 기사나면 어쨌든 둘 다 손해야. 알아서 사려. 내가 일단 선배한테 말해 놓을테니까.
도경수 사장님
은지와의 통화를 끝내고 멍해진 정신이 한동안 돌아오지 않았다. 침대에 허리 굽히고 앉아서 이 일을 어쩌나 미치도록 고민했다. 차 한번 얻어탔다가 새 됐네, 니미.
"기업 책임자로 오른 이후로 꼬투리 하나 건질게 없던 도경수라서 더 두고보는거야, 조심 좀 해." 김은지의 단호한 말이 머릿속에 웅웅 울렸다.
은지와 통화를 하던 도중에 날아왔던 [뭐합니까] 도경수의 딱딱한 문자도 이제서야 뒤늦게 확인하고 다시 침대에 엎드려 뒹굴었다. 문자를 왜 해, 하길!!
그래, 내가 도경수랑 워낙 악연으로 시작해서 그렇지, 솔직히 가까이 지낼 만큼 가벼운 사람도 아니잖아. 내 생각에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답장? 안해.
"....왜이래, 진짜."
도경수의 문자를 읽어놓고 씹은지 한 10분 조금 지났나. 좀 잊을만하니 또 우웅 울리는 진동에 핸드폰을 확인했다. [답장 왜 안합니까] 또 도경수의 문자다.
더이상 사적으로 연락 할 이유도 없을 것 같아 또 씹을 생각으로 홀더키를 누르려는데 지잉- 지잉- 지잉- 손에서 진동이 끊임없이 울리더니 끊겼다.
[내가 ΟΟΟ씨 문자 씹었었다고 복수하는 겁니까.]
[아님 그 쪽도 저처럼 좋아하느라 답장하는걸 까먹은 겁니까.]
[답장 안오면 후자라고 생각하고 전화겁니다.]
이런 망할 새끼야. 사람이 자고 있을거란 생각은 못하냐? 답장을 안하면 뭐? 후자라고 생각해? 전화를 걸어? 미쳤어, 미쳤어.
결국 마지막 문자의 단호함에 진짜 전화가 올까 답장을 해주겠노라 결심하고 자판 위에 엄지 손가락 두개를 올려놓았다. 근데 뭐라고 답장을 하지.
두 손가락을 올려놓고 한참을 망설였다. 뭐라고 보낼지 고민하며 자판을 그냥 우다다 눌러도보고, 알아서 뭐하게요 라는 도발도 혼자 해보고.
그냥 자는 중이었다고 보낼까. 제일 무난하게 보내는게 좋겠다 싶어 엄지를 제대로 화면위에 올려놓으면 또 우웅- 하는 진동 소리에 깜짝 놀랐다.
진동 소리에 놀란 것도 놀란 것이지만, 이거. 전화다. 문자가 아닌 전화. 도경수로부터 온 전화. 미친, 이런 미친.
"...여,여보세요."
- 뭡니까.
".....네?"
- 왜 문자를 씹어요, 뭐하냐고 물었잖습니까.
"아,아.... 자고있었어요."
일단은 전화를 받아들고 여보세요, 나도 모르게 어색하게 더듬어버린 말에 경악하며 내 주댕이를 마구 때렸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란 말이야!!
뭐하냐고 물었잖습니까. 전혀 궁금한 것 같지 않아보이는 도경수의 말에 심드렁하게 자고있었다고 구라를 쳤다. "이 시간까지 잠을 잡니까?" 도경수의 질문에 웃음이 섞여있다.
- 오늘 바쁩니까.
"아뇨, 왜요."
- 좀 만납시다.
"....에?"
오늘 바쁩니까, 도경수가 아무렇지 않게 뱉은 질문에 아뇨, 왜요 라고 대답했다. 그렇게 말하고나서 나도 내가 아차 싶어 바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좀 만납시다, 칼 같이 날아온 도경수 말에 이미 늦었음을 알았다. 바쁘냐고 물어볼 때부터 딱 잘라 바쁘다고 했어야했는데, 아, 만나길 뭘 또 만나. 됐습니다.
무슨 하루 종일 굶은 사람이 밥 있는 사람한테 '한 입만 좀 먹읍시다' 하는 그런 말투로 좀 만납시다 하는 도경수 말에 바보같이 에? 했다.
예? 도 아니고 네? 도 아니고. 존나 무슨 일본 여학생 마냥 에?ㅇㅅㅇ? 수화기 저편에서 풉- 하는 웃음소리가 또 들렸다. 웃기냐, 시바라.
도경수가 "에~?" 하며 내 말을 따라한다. 답지않게 솔직히 좀 귀여웠다. 큼큼, 별로 웃기지도 않구만 뭘 그렇게 웃는 담.
- 아무튼,
"....."
- 한시간이면 충분하죠, 화장 하고 다니지도 않던데.
"아니, 저기..."
- 정확히 1시간 뒤에 ΟΟΟ씨 집 앞으로 나와요, 나올 때 까지 기다립니다.
"예? 아니, 도경...."
- 나올 때 까지,
"....."
- 기다려요, 저.
언제 웃었냐는 듯이, 아무튼, 하며 웃음을 깔끔하게 끝낸 도경수는 1시간 뒤에 나오라는 용건을 끝낸 후에 가차없이 전화를 끊어버렸다.
거절 할 새도 없이 본인 할 말만 하고 끊어버리는 행동에 어이가 없어 또 헛웃음이 나왔다.
기다리긴 뭘 기다려, 어디 기다려봐. 누가 나가나.


 초록글
초록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