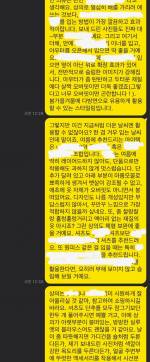"성규 선배,"
"..."
"왜 항상 가만히 있어요."
"..."
"다쳤네요. 저번에 상처도 아직 덜 아물었는데,"
"너 좀 가라."
"싫어요 선배가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가, 내가."
*** *** ***
집단으로 여러명 몰려다니는 놈들은 시도 때도 없이 나를 비롯한 반애들을 괴롭혔다.
작년 초겨울. 이 학교로 전학온 뒤로 잘풀리는 꼴을 본적이 없다. 아, 야속하기도 하지
운동장을 둘러싸고있는 나무들은 앙상한 가지위에 하나둘 꽃봉우리를 품었고 개중에는 벌써 피기 시작한 꽃도 있었다.
봄이 오려나.
"야. 시간됐어."
"..."
놈들은 언제부턴가 점심시간, 하교시간만 되면 같은 걸 달고있는 남자의 몸을 가진 날 탐하려 들었고
얼마전 그 모습을 꼴사납게도 하나밑 후배한테 들켜서 꽤나 골치아플줄 알았는데 녀석은 의외로 입을 다물고 지내더라
오히려 묵묵히 기다리다가 놈들의 손에 내팽겨쳐진 나를 매번 감싸준다.
뭐, 생각해보면 이게 더 골치아픈것 같기도? 기다리긴 왜기다려 변태같이.
오늘도 나한텐 선택권따위 없기때문에 반강제적으로 끌려가는중인데,
그 녀석이다. 장동우
"성규 선배."
"뭐야. 김성규 이제 후배들도 홀리고 다니냐? 어마어마한 년이네 이거."
"..."
장동우 얼굴만 보면 아무말도 안나온다. 물론 부끄럽다거나 수치스럽다거나 그렇진 않다. 같은 사내놈끼리
그냥 꿰뚫어보는 듯한 장동우의 눈빛이 내 입을 꾹 다물게 한다.
조롱하는 놈들의 말따위 이미 한귀로 듣고 흘린지 오래였지만 장동우는 크게 신경이라도 쓰이는지 입이 일자로 굳게 닫힌다.
아. 지독하게도 지루하다, 이 물레방아같은 일상
*** *** ***
"잘했어요."
"내가 너한테 칭찬들을 군번이냐."
녀석은 말없이 웃어줬다.
왜 갑자기 거부했어요? 의사표현이라고는 안했으면서
뭘, 그냥 귀찮아서 몇번 따라가줬더니 그뒤로 괘같이 달려드는거지 뭐.
"진짜... 싫었는데. 다행이에요."
"뭐가."
"그리고 성규 선배 웃는 모습, 진짜 예뻐요."
장동우가 말도 안돼는 소리를 하며 내 머리를 쓰다듬는데 그 손이 투박하면서도 제법 위로가 됐다.
나 그동안 슬펐나? 힘들었었나? 전혀 안그랬는데 왜 눈물이 나는지는 모르겠다.
마치 다정하게 쳐다보는 장동우의 얼굴이 '많이 힘들었죠. 이제 괜찮아요' 하는것 같아서
"동우야"
"어. 선배 제 이름 처음 불러주신거 알아요?"
어쩌면 너는 봄인가보다. 겨울같던 나에게. 언제 봄이 올지, 오지도 않는 봄을 기다리며 그렇게 지내던 나에게
너는 봄이였나보다.
영원히 안올줄만 알았는데, 어느새 봄이 왔다.
- - - - -


![[인피니트/동성] 봄같은 동우×겨울같은 성규 | 인스티즈](http://file.instiz.net/data/cached_img/upload/9/f/8/9f879d55a11bced845d7e31b923ef321.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