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뇽토리/여신] 애증의 소나타 12 - 1 track 08
습관이란 녀석은 참 무서운 거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뇌와 몸과 심장을 점령하고 말거든. 습관과 싸우고 이기라는 누이의 말이 뒤늦게야 공감이 되고 말았다. 다 낡은 흔들의자의 삐걱거리는 소리를 친구삼아 ‘습관’처럼 왼쪽손목에 칼을 겨누웠다. 따듯한 피가 손목에서 빠져나왔다. 해방감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였다. 내 피도 지금쯤 해방감을 느끼며 더욱 빠져나오길 빌고 있겠지. 곤히 자고 있는 이승현을 바라보며 몸을 흔들었다. 삐걱거리는 흔들의자의 소리가 더욱 고조되었다. 내 왼쪽 팔목에서 나온 향긋한 피내음이 날 자극시켰다. 이맘때 쯔음 되면 끊었던 약이 더욱 간절했다. 넘쳐 흐르는 피를 바라보며 입맛을 다셨다. 피 특유의 비린향과 어울리는 약이 있었는데. 파란빛 아름다운 가루를 상기시키며 짙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용…. 도련님?”
“고양이……일어났구나.”
“거기서 뭐 하고 계세요?”
“내 몸 안의 향수가 소리치고있는걸…참을 수가 있어야지.”
너로도 채워지지 않나봐. 온순해진 나의 고양이는 심상치 않은 내 뒷모습을 바라보며 비틀비틀 내게 다가왔다. 도련님…? 지독히도 끈질긴 애칭을 부르며 녀석은 의자를 제 시선으로 돌렸다. 난도질이 당한 듯한 내 왼손목의 혈을 보고 놀랐는지, 이승현은 바닥에 주저 앉고 말았다.
“집…집사! 정집사님!!”
“피의 향은 왜이리 지독하게 아름다운 걸까?”
“집사님!! 정집사!!”
“참을 수 없어…….”
오른손에 들려있던 단도를 이용해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 나의 행동에 놀란 이승현은 소리를 거하게 지르며 밖으로 뛰쳐 나갔다. 그 달림이 정집사를 향한 것인지, 미친 주인을 향한 도피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말이다. 흔들의자의 연주소리가 멈췄고, 내 향수도 바닥이 났다. 호흡이 두려울 정도로 잠잠해지며, 몸 안의 피들이 식어감을 느꼈다. 참 불공평 하기도 하지……. 이렇게나 감미로운 향을, 조금밖에 맛볼 수 없다니. 신도 가혹하여라-. 아름다운 향을 몸 안에 숨겨 놓는 건 반칙이야. 어딘가에서 날 조롱하고 있을 신을 향해 욕을 하며, 더이상은 감상할 수 없는 미칠 것 같은 향을 위해 손을 크게 움직였다. 너덜해진 왼손목이 제 모습을 잃어가며 모습을 망치고 있었지만, 피를 놓칠 수는 없었다. 지독히도 볼상사나운 내 모습이 못났지만, 손은 멈춰지지 않았다. 향수를 만들기 위한 희생은, 참으로 값진 일이다.
-
“손목은 장난감이 아닙니다.”
“……집사.”
“장난감이 필요하시다면, 더 사드릴테니 제발 몸을 망치지 마세요.”
“장난감이 아니라, 향수인걸.”
“……이승현마저 두려움에 떨고 있던데.”
“저런. 어서 달래줘야겠어.”
“그러다 또 달아납니다. 조심 하세요.”
“괜찮아. 또 잡으면 끝나는 일이니깐.”
거추장스럽게 꽂혀있는 링겔을 뽑은 후, 붕대로 칭칭 감겨진 아려오는 왼손목을 바라보았다. 향수는 실컷 맛 보았으니, 이젠 고양이를 맛 볼 차례다. 마약을 끊은 대신, 두달에 한번 쯔음은 이런 절차를 치뤄야만 했다. 요번엔 꽤나 심하게 상처가 났는지 제법 욱신거렸지만, 그 고통마저도 내겐 흥분감을 주는 요소였다. 뻐근한 손목을 돌리며 숨어버린 나의 도둑고양이를 찾아 헤맸다.
“야옹아- 어디 숨었어? 우리 고양이가 언제부터 숨바꼭질을 좋아했더라?”
난 아직까지도 영- 별론데…. 잘 숨어야 해. 찾으면 죽여버리고 싶을 지도 모르거든. 이유없는 객기를 부리며 숨어버린 이승현의 이름을 불렀다. 몇 해 전과 비슷한 상황이였다. 그때마다 멍청한 그 녀석은 새하얀 장롱으로 숨곤 했지. 필름이 지나가듯 스치는 옛기억을 따라 발걸음을 움직였다. 그때와 변한 것 없는 장롱이 내 눈을 자극했고, 그 문을 힘껏 열자 역시 변한 것 하나 없는 이승현이 내 손목을 자극시켰다.
“……흡!”
“우리 고양이, 여기있네.”
“아아…도련님.”
“잘 숨으라고 했는데.”
손목을 그을 때 마다, 더욱 광적으로 변하는 내가 두려운지 고양이는 벌벌 떨고 있었다. 가녀린 몸이 안쓰러워 장롱에서 꺼내 품에 안았다. 작은 고양이는 내가 무서운지, 아니면 앞으로의 상황이 무서운지 떨고 있었다.
“아니면…죽은 하야토의 환상이라도 보이는 건가?”
“…!!”
“그녀석 이름만 나와도 이렇게 놀란단 말야. 자꾸 골려주고 싶어지게.”
“도…련님.”
“왼손목이 자꾸 난리를 피우는 통에, 더는 참을 수 없겠어.”
하야토의 이름에 눈물을 글썽이는 고양이를 위해, 침대 대신 바닥에 고양이를 눕혔다. 딱딱한 콩크리트 바닥에 맨살이 닿는 촉감이 싫은건지 고개를 젖히며 날 안쓰럽게도 올려다 보는 눈을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떨리는 목에 입술을 마주했다. 몇 주만에 햝아보는 녀석의 목은 미친듯이 달콤했다. 지독한 감각에, 혀가 마비될 만큼….
-


 초록글
초록글![[뇽토리/여신] 애증의 소나타 12 - 1 track 08 | 인스티즈](http://file.instiz.net/data/cached_img/upload/f/4/3/f43d2f3b42038f63d0abb8d73c7fa6cf.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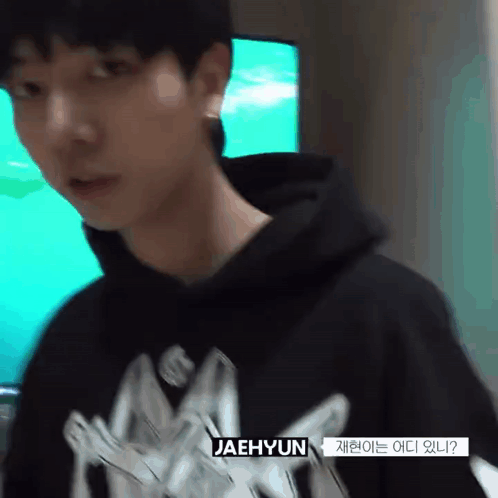
 🍀PM 7:30 LCK CUP T1 vs KT 응원달글🍀
🍀PM 7:30 LCK CUP T1 vs KT 응원달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