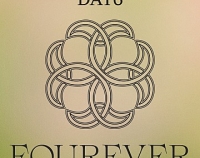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나는 열매가 좋아
피곤해, 존나 피곤해.
녹아버릴 것 같은 몸을 끌다시피 집 안에 안착시켰다. 오랜만에 왔으면서 인사도 안 하고 드러눕냐며 성질 부리는 엄마는 말과 다르게 어깨를 쓰다듬어주는 탓에 졸음이 몰려올 것 같았다. 미안 미안.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엄마에게 사과하며 애교를 부렸다. 밥은 먹고 다니는 거지? 으응. 대충. 근데 왜 이렇게 빠졌어. 폭풍으로 쪘는데...?
내 오피스텔이 아닌 진짜 우리 집의 내 방에 들어선 게 벌써 7개월이 훌쩍 넘은 것 같다. 와, 진짜 오랜만이다. 별로 오래 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마음이 그랬다. 취직 성공으로 기뻐하기도 잠시, 집을 떠나는 게 못내 아쉬웠던 나는 떠나기 마지막 날 홀로 훌쩍 대다 엄마한테 들켜 같이 엉엉 울었다. 엄마도 보고 싶을 거고, 무뚝뚝하지만 남 몰래 지갑에 용돈 넣어주던 아빠도, 치고 박고 싸우기 바쁜 내 동생도 보고플 거라고. 물론 오피스텔에서 혼자 밥을 먹거나 치킨을 시켰을 때, 혼자 잘 때는 항상 보고 싶었다. 티비를 보며 수다를 떨다 잠들던 그때가. 그래서 지금이 마냥 새로웠다.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울까 했지만 부엌에서 나름 돈 버는 딸래미 먹이겠다고 고군분투하는 엄마를 위해 방을 나와 식탁 의자에 앉았다. 지글지글 소리가 반가웠다.
고기 쨔응...
"삼겹살 냄새가 구수하구려, 박 여사."
"회식 때 지겹게 먹는다길래 소고기로 굽고 있다."
"허얼... 박 여사, 완전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의 사랑 고백을 뱉자마자 도어락 소리가 들렸다. 띡띡띡띡띡띡, 띠리링. 열리자마자 보이는 것은 큰 상자를 짊어지며 들어오는 동생 새끼, 세훈이었다.
함정은 존나 무겁다며 틱틱 댈 뿐, 그게 다였다. 너 이 자식... 인사 안 하니...?
"동생. 근 7개월 만의 만남인데 누나한테 뭐 말할 거 없어?"
"친한 척 오지네. 한 달 전에 술 처먹다 봤으면서."
그건 존나 회식 때 마주친 거잖아!!!!
누나를 술꾼으로 만드는 세훈이의 발언에 엿을 날리고 싶었다. 하지만 나름 회사원 누나의 지조를 지키려 하였으나 누구든지 디스하는 저격러 오세훈에 의해 지조는 무슨, 와르르 무너졌다. 부들부들 떨고 있는 나를 지나쳐 엄마에게 향하는 오세훈에게 다리를 걸려 했지만 키 큰 동생에 비해 짧다리였던 나는 (...) 발레 하듯 발 끝만 쭉 폈어야만 했다. 분하다 분해!
"엄마. 오다가 개 주웠어."
"엥? 뭔 개?"
"박스에 넣어서 누가 버렸길래. 불쌍해서 데려왔어."
"미친 새끼. 누나 개든 고양이든 무서워하는 거 알면서."
"닌 어차피 니 집 갈 거잖아요. 근데 너 왜 왔냐?"
"우리 집이라 왔다, 왜!"
"엄마, 쟤 휴가야? 얼른 가라고 해!"
우리 둘의 싸움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박스에 들고왔다는 개새끼를 보러 거실로 향했다. 그거 꺼내면 안 돼!!! 엄마 제발! 내 외침에 그저 알았다며 설렁설렁.
불안함을 감출 수 없어 나의 모든 신체부위를 의자 위로 올렸다. 막 걸음을 뗐을 때 지나가던 개새끼에게 애정을 주려다 얼굴을 뜯기는 사건 때문에 그 이후로는 100m 앞에서 걸어오는 개들만 봐도 덜덜 떨곤 했다. 다행히 지금은 스킬이 생겨 지나가던 길개들과 길냥이들과 눈만 마주치지 않으면 산다는 걸 알아냈다. 그래도 무서운 건 함정......
"얘는 보통 놈이 아닌가보다. 왠 늑대처럼 생겼네?"
"개새끼들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제발 엄마 꺼내지 마..."
"이거 시베리안 허스키 아니야? 나 그런 줄 알고 데려왔는데."
"...시베리안 허스키가 한국에서도 살아?"
"...누나 너는 회사 어떻게 들어갔냐? 사람 맞으시죠?"
시베리안 허스키는 시베리아에서만 사는 게 아니었어...? 27년 내 평생 처음 아는 사실인데?
엄마와 세훈이 둘 다 '저 딴 걸 내 딸이라고', '저 딴 게 누나라니' 라는 얼굴로 나를 뚫어져라 보는데, 민망하지 그지 없었다. 그 와중에 박스에 잘 모셔져 있을 허스키 놈이 폴짝 뛰어 거실 바닥에 발을 디딛는 걸 봐버렸다. 오, 지져스.
"으악!!!!!!!!!!!!! 빨리 저거 안 치워?!"
"저거가 뭐냐 너는? 개도 생명이 있는,"
"이 쪽으로 오잖아!!!!!!"
"어유, 이리로 오자."
엄마의 손길에 제지 당해 이쪽으로 공포스럽게 달려오던 허스키는 엄마 품에 꼭 안기게 되었다. 오장육부 다 해체되는 줄 알았네... 네가 더 무서울 거라며 초를 치는 오세훈 때문에 짜증이 절로 났다. 식탁에 고기가 잔뜩 담긴 접시를 올려놓는 엄마의 행동에 욕설은 발언하지 않았다.
"너는 왜 쓸데없이 개를 데려와서..."
"먹으면서 말하지 마. 존나 더럽게. 그리고 싫음 나가든가.
엄마, 개 이름 뭘로 할까?"
"글쎄. 뭐로 하지?"
"...진짜 키우는 거야? 이렇게 쉽게?"
LTE 속도로 집을 지키는 멍멍이가 되버린 거다. 나중에 고아 데려오면 바로 호적에 넣겠어여...
이미 엄마는 개를 쓰담대며 세훈이와 개 이름에 대해 열띤 토론을 시작했다. 그래... 자취하는 딸래미는 고기나 처 먹어야지... 근데 진짜 맛있다.
한참을 둘이 쑥덕이더니 개 이름을 정했다며 뱉는 말은 존나 뜬금포 돋는 이름이었다.
"왜 그거야?"
"허스키라고 멋있는 강아지라고 생각할 텐데, 그건 얘한테 너무 부담스러울 거 아니야."
"도비는 좀 아니지 않아? 그리고 그거랑 무슨 상관... 차라리 열매 어때?"
"별로."
"그럼 종구 어때?"
"종인이 형 네 개 이름이잖아, 병신아."
"OOO 너는 어쩜 남친이 키우는 개 이름도 모르니."
모를 수도 있지... 아니, 잠깐 깜빡한 것 뿐인데! 사실 나도 고기를 입에 마구 넣으면서도 혼자 개 이름을 생각했었다. 몽구? 아니야, 뭔가 삘이 안 꽂혀. 열매는 왜 싫다는 거야.
종구는 왠지 머릿속에 둥둥 떠다녀서 뱉은 거였는데, 맞다 맞아. 종인이 네 개였지. 이 자리에 종인이가 있었더라면 또 삐쳤을 게 분명하다. 없어서 감사합니다. 안도의 웃음을 지었더니 세훈이 나를 보며 겁나게 쫑알댄다.
"또 지 남친 생각한다고 헤실 대는 것 봐라. 어휴."
"누나 왠만하면 욕 안 하려고 했는데... 세훈아, 지랄도 병이야. 꼬우면 너도 여친 사겨."
"니 지랄은 병 이상이야."
그치 도비야?
내 의견은 묵살되고 도비라고 정해진 강아지를 쓰다듬으며 내 앞담을 까는 세훈이의 뒤통수를 거침없이 내리쳤다. 뒤질라고, 누나한테.
"엄마! OOO이 나 때려!"
"맞을 짓 하잖아!"
"둘 다 조용히 안 해?! 다 커가지고 이것들이!"
*
껌껌한 새벽. 모두가 잠들고 있는 와중, 박스 안에 무언가 꽉 찬 듯 꿈틀거리더니 괴음과 함께 터졌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벌거벗은 남정네가 부들부들 다리를 떨며 쇼파 위로 얹히듯 앉았다. 배고프다. 말하고 나서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까만 주변만이 눈에 비추어졌다. 서투른 발걸음으로 성큼성큼, 아까 OO이가 들어간 방으로 향했다.
새근새근. 이라는 표현이 적절하게도 뒤척임 하나 없이 자는 OO이를 보고 있는 게 벌써 2시간 째다. 손을 뻗지도 않고, 어떻게 해보려는 행동도 전혀 하지 않은 채 그저 침대 앞에 앉아 멀뚱히 OO이를 쳐다보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손을 올려 OO이의 뺨에 올렸다. 아기처럼은 아니었지만 부드러운 볼이 느껴졌다. 비비적 대자 얼굴을 찌푸리는 OO에 놀라 금방 손을 떼버렸다. 그러자 찌푸려진 얼굴도 다시 잠잠해졌다.
"예쁘다."
"..."
"예쁘다."
계속해서 예쁘다, 라는 말을 중얼거렸다. 예전 주인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데려왔을 때 말하던 말이었다. 서로가 뒤엉켜 무언가를 할 때도 남자는 계속 그말을 했던 걸로 기억한다. 예쁘다. 마지막으로 뱉은 후에 다시 정적이 흘렀다.
"나는, 나는."
"..."
"나는 열매가 좋아, 주인."
"..."
"주인, 나는 열매가 좋아."
그 말을 뱉은 후, 침대 아래에 쭈구려 누워 잠을 청했다. OO이가 자는 것처럼, 똑같이.


![[EXO/박찬열]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01 (부제: 나는 열매가 좋아) | 인스티즈](http://file2.instiz.net/data/cached_img/upload/e/a/a/eaaf8db84df2cb401e3227837ef88d7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