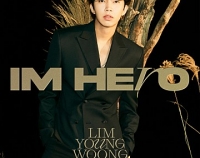하이얀 접선 끝
W. The Sun
도련님―.
부드러운 목소리가 공기 중에 울려퍼졌다.
"늦었구나."
그에 맞춰 울려퍼진 목소리는 이전에 울린 목소리 보다는 한결 두텁고 낮았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분위기는 한없이 부드럽고 자상했다. 마을 가장자리에 위치한 어느 한적한 강가. 그 강가를 따라 흐드러지게 피어난 매화꽃들은 강렬한 향기를 마음껏 흩날리며 주변의 공기를 그득하게 채워가기 시작했다. 무슨 연유로 날 이곳에 부르신 걸까. 혹여 크게 꾸짖음을 듣지 않을까 노심초사함에 제자리에 서서 손 끝만 하염없이 매만지는 종석을 바라보던 우빈은 작게 웃으며 종석에게로 손을 뻗었다.
"무엇이 그리 걱정되느냐?"
"소인은 그저…."
"되었다. 이리 가까이 오거라."
고개를 천천히 들어 자신을 향해 뻗어져 있는 손 끝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종석은 이내 옅게 미소지으며 우빈에게로 다가갔다. 따뜻한 봄과 닮아있는 종석의 모습은 도성에 있는 그 어느 여인들 보다도 곱고 아름다웠다. 무예를 수련하는 호위무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 희고 가녀린 종석의 몸을 감싼 쪽빛 비단 도포는 종석의 하이얀 피부를 한층 더 빛나게 만들었고, 그와 대비되어 붉게 타오르는 종석의 입술은 무어라 말을 하지 못해 떠듬거리고 있었다. 이리 오래도. 끝내 우빈의 불호령이 떨어져서야 걸음을 옮기기 시작한 종석은 푸른 도포 소매를 꽉 잡고 그 매혹적인 갈색 눈을 들어 우빈을 바라봤다.
내가 몸을 바쳐 지켜야 할 분. 나와 같은 사내. 그러기에… 연모해서는 안 될 분. 우빈에게 가까이 다가가서야 다시 바닥으로 떨궈진 종석의 눈은 사내답게 큼직한 우빈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종석아."
예, 도련님. 작게 대답하며 고개를 든 종석의 눈에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우빈의 얼굴이 들어왔다.
"이제 그 검은 잠시 내려놓는 것이 어떻겠느냐?"
"허나, 도련님. 전…."
"괜찮다. 날 해하려는 자는 없어."
그래도 마음을 놓을 순 없습니다. 그리 당하시고도…. 끓어오르는 분을 삼키며 아랫 입술을 깨문 종석의 눈에 붉은 자욱이 어렴풋이 비치는 우빈의 팔이 보였다. 얼마 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누군가가 보낸 자객들에 습격을 당한 우빈은 팔이 크게 베이는 상처를 입은 것 말고는 다치지 않았으나 그 일은 종석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고 말았다. 잠시 머뭇거리며 올라간 종석의 가녀린 손 끝은 우빈의 다친 팔에 살짝 닿았고, 금방 눈물이라도 떨굴 듯 점점 일그러져 가는 종석의 얼굴을 바라 본 우빈은 혀를 끌끌차며 소매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이건…."
"네게 잘 어울릴 것 같아 가져왔다."
"접선…입니까."
우빈에게 접선을 건네받은 종석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펼쳐들었다. 하이얀 접선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것이었지만 그 안에 그려져 있는 섬세한 매화 나무는 그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던, 특이한 것이었다.
"너와 매화. 참 잘 어울리지 않느냐?"
"도련님…."
이것은 필시 도련님이 직접 그리신 그림. 작게 떨리는 손으로 접선을 닫아 손에 쥔 종석의 눈에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종석은 우빈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너무나도 커진 나머지 그것이 기어코 눈물로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끝내 울음을 터트린 종석의 눈물을 안타까운 표정으로 닦아내던 우빈은 울음에 바들바들 떨리는 그 몸을 가볍게 끌어안았다. 이리 울릴 생각은 아니었는데… 끝내 울고 마는것이냐. 부드러운 종석의 머리칼을 쓸어내리던 우빈은 종석을 달래듯 작게 말했다.
"난 괜찮다. 이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니야."
"허나, 도련님…."
"종석아."
"흑…."
"그래, 울거라. 맘놓고 울어도 된다."
이제 참지 않아도 된다. 혹여 꽉 껴안으면 부서질까 조심스럽게 종석을 더 품 속으로 밀어넣은 우빈은 옅게 웃으며 종석의 등을 토닥였다. 이리도 나를 걱정해주는 너를… 내가 어찌해야 좋단 말이냐. 눈을 감으며 매화 향기를 닮은 종석의 향기를 들이마신 우빈은 아무 말없이 접선을 쥔 종석의 손을 마주 잡았고, 그런 하이얀 접선의 끝에는 연모(戀慕)라는 단어가 쓰여있었다.
***
왠지 조선시대 버전으로 쓰고 싶어서 조각글 올려봅니다.
Hㅏ... 망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