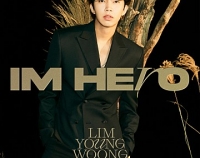수없이 많은 시간이 흐를동안 그 상처는 한 번도 아프지 않았다.
아마도 잊혀짐이였으리라. 그 망각은 끝을 모르고 그렇게 흘러갔다.
아무것도 그리고 아무일도 없는것처럼.
평온이라 말하던 시간이 흐르고 현실에 조금씩 물들기 시작했다.
아픈건 아니지만 괜찮지 않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의 세상이 조금씩 붕괴되기 시작했다.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시작됐다.
바람이 불어오는것도 괜히 아픔이 되는날이 있었다.
터져나오는 울음에 나도 모르게 그 상처를 어루만진다.
아픈것도 아닌데 분명 그리 잊었는데.
버릇이라 말하기에도 미련이라 말히기에도 애매한 그 경계선에 머물러있다.
그건 낮도 밤도 아니요 차가운물도 따뜻한물도 아니였다.
외로웠던걸까. 아니면 그리웠던걸까.
몇번이나 떠올리고 몇번이나 고개를 뒤흔든다.
어찌 이럴수 있단말인가. 어찌 이 마음은 이리도 길을 쉽게 잃는단 말인가.
혼란이 마음 여기저기를 어지럽힌다. 가장 예민하고 가장 숨기고 싶은 곳.
거기부터 이 무너짐은 시작되었다.
차라리 아프지 차라리 더 미친듯 슬퍼하지.
이 낯선 그리움은 무엇이란 말이냐.
이 보고픔은 어찌해야하냔 말이다.
세상이 무너졌다. 그리고 그속에 니가 보였다.
원하던 원하지 않던 그곳에 니가 있었다.
아무것도 없는데.


 초록글
초록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