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저 저 남산 아래 작은 고을
꽃 같은 사람 둘이 간간이 연꽃을 밝히고 살고 있더래요
금슬이 어찌나 좋던지 해님과 달님은
그들을 축복했더라지요
한 꽃은 밤을 밝혀주고 한 꽃은 낮을 황홀하게 했대요-
저잣거리의 어린아이들은 사내아이, 계집아이 할 것 없이 같은 노래를 부르며 깔깔대고 있었다. 심지어는 지나가던 노인네에게도 꽃 같은 사람 둘 노래를 아냐 물으면 그 노인은 조용히 껄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양반가 자제의 자제이건 부모를 일찍 여읜 어린 아이이건 모두 다 아는 노래였고, 농민들도 가끔가다 힘들거나 심심할 때 부르는 노래라 길을 걸으면 한양 내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노래였다.
"아이야"
우현이 이름이 없는 집의 어린 남자 몸종을 불렀다. 그 아이는 낙엽을 쓸고 있던 빗질을 멈추고, 자기보다 큰 빗자루를 살포시 내려놓고는 우현을 향해 짧은 다리로 다다다 달려갔다.
"예, 도련님"
아이는 10살 이란 꽤 늦은 나이에 빠진 앞니를 드러내어 우현에게 환히 웃어 보였다. 오랫동안 감지 않아 기름진 머리를 우현은 또 그 아이가 귀엽다며 쓰다듬어 주었다. 그 아이는 양반가의 빗질이나 하고 앉아있는 아이라고 하기에는 꽤나 많은 여자들을 울리게 생겼다고 생각한 우현이 그 아이를 보며 이상한 생각을 했다.
"도련님, 저를 왜 부르셨어요-?"
아직 어린아이라 그런지 어찌 말을 높여야 하는 지도 몰랐다. 남 대감이라면 아들 교육 잘 시키라며 아이의 어머니를 꾸짖었겠지만, 우현은 상관없었다.
"혹시 저 저 저 남산 아래 고을... 맞나? 그 노ㄹ..."
"알다마다요! 불러....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던 말 다 하시지요,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이는 제가 우현의 말 도중 신이 나 말을 꺼낸 걸 생각하고 몸을 숙일 수 있을 만큼 우현에게 일고여덟 번 숙여대었다. 우현은 갑자기 시작된 아이의 사죄에 오히려 제가 당황해 아이의 어깨를 잡고 말하였다.
"아니다. 괜찮다. 그리하지 않아도 된다. 그 노래를 불러줄 수 있겠느냐?"
"네! 도련님 말씀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 저 저 남산 아래 작은 고을
꽃 같은 사람 둘이 간간이 연꽃을 밝히고 살고 있더래요
금슬이 어찌나 좋던지 해님과 달님은
그들을 축복했더라지요
한 꽃은 밤을 밝혀주고 한 꽃은 낮을 황홀하게 했대요-
"노래를 참으로 잘 부르는구나. 가끔가다 나에게 들려줄 수 있겠느냐?"
아이는 우현의 칭찬에 부끄럽다는 듯 뒷머리를 긁적여댔다. 아, 아니어요... 당당히 우현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며 신 나게 불러댈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얼굴을 붉히며 수줍어하는 꼴은 또 뭐람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그 어떤 노래든지 제가 알기만 한다면 불러드리겠습니다!"
"알기만 한다면 불러준다고...?"
"네!"
아이는 아까 노래를 부를 때와 마찬가지로 크고 동그란 눈으로 우현을 도랑도랑 쳐다보았다. 우현은 그런 아이의 얼굴을 보더니 푸하하- 하고 호탕하게 웃음을 터트렸다. 아이는 진심으로 말하는 제 속도 모르고 괜히 우현이 저를 놀리는 것 같아 기분이 상했다.
"제가 부르겠다는데, 왜 웃으십니까??"
"하하, 아니다. 귀여워서 그러는 거니"
"사내에게 무슨 귀엽다 하십니까..."
아이는 괜히 기분이 좋았지만, 아닌 척 몸을 배배 꼬며ᅳ 한 쪽 입꼬리는 살짝 올라간 채 입을 쭉 내밀고는 우현에게 말했다.
"아이야"
"예, 도련님."
"너는 이름이 없는 것이냐?"
"예, 그러해요. 바빠서 이름을 못 지었다고 하드라구요. 뭐, 아이가 제 이름이니 상관없습니다"
"내, 너의 이름을 지어줄까?"
"정말, 그리해주실 수 있으시어요?"
"그래, 내가 좋은 이름을 생각해보겠다"
주변에 여자아이밖에 없어서 계집아이들이 쓰는 말투와 존칭이 섞인 이도 저도 아닌 아이의 말투를 계속 떠올리는 우현이었다. 이제 가보거라, 나의 말동무가 되어주어 고맙구나. 우현의 말이 끝나자마자 아이는 우현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는 폴짝폴짝 뛰며 아까 우현의 부름에 땅바닥에 버려두고 온 빗자루를 향해 달려갔다.
아이는 그 빗자루를 집어 들고는 아까 우현에게 불러준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우현 도련님은 참 좋고 멋있는 분인 거 같아. 10살의 아이는 15살의 우현을 동경하고 있었다.
![[인피니트/야동] 여기서 기다릴게요-1- | 인스티즈](http://file2.instiz.net/data/file/20141129/0/f/e/0fe529c0bbed9feb695366b98840229b.png)
"동우야"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긴 머리를 동그랗게 모아 아래로 가지런히 묶어놓은 동우가 불을 붙이기 위해 아궁이 안으로 호호 바람을 불어 넣고 있었다. 불을 붙이는 데 집중이라도 했는지 호원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런 동우를 아는지 호원은 동우의 뒤로 가 동우를 안았다.
"악! 아, 이호원. 뭐 하는 거야아-"
"네 서방 왔는데 네 서방 말은 들리지도 않느냐, 장동우 밉다, 미워."
"뭐가 네 서방이야!"
"너는 머리를 이렇게 했고, 나는 상투 틀어 올렸고. 그거면 끝?"
호원이 동우의 묶은 머리를 한 번 가리키고는 제 머리 위에 튼 상투를 가리켰다. 동우가 치- 하며 호원에게서 고개를 돌리고 다시 불을 지피는 데 신중을 가했다. 저거는 툭하면 제 머리와 내 머리를 비교하고 그러네
"동우야"
호원이 동우의 옆에 철푸덕하고 앉았다.
"우리 얘기가 저잣거리에 나돌더라?"
"무슨 얘기?"
호원이 동우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그 노래를 읊기 시작했다.
한 꽃은 밤을 밝혀주고 한 꽃은 낮을 황홀하게 했대요
노래를 끝마친 호원이 동우를 보며 뿌듯하게 웃었다. 그게 어찌 우리들 노래냐며 타박을 주며 호원의 얼굴을 밀어내는 동우였지만, 다시 달라붙는 호원 덕에 다시 배시시 웃으며 이제 붙기 시작하는 불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게 어찌하여 우리 노래가 아니긴. 잘 들어봐. 밤을 밝히는 꽃은 나야"
"어째서?"
"너와 내 밤을 밝혀주는 건 바로 나니까. 나는 양, 너는 음"
"그럼 다른 꽃 하나는"
"그것도 나"
"..."
"낮에 아낙네들을 황홀하게 해주니까"
"저리 가"
"아까 이 노래를 부르면서 기생집에서 나오는 계집아이에게 물어봤는데, 그 아이가 너랑 나랑 낮에 하는 거 듣고선 만든 노래래. 나의 낮을 황홀하게 해주는 건 너니까 낮의 꽃은 너래. 비싼 기생집 계집이라 그런지 표현도 참"
동우가 쭈그리느라 잔뜩 묻은 치마를 탁탁 털며 일어났다. 부엌을 나서니 보이는 건 휑한 나무 평상 하나와 저 멀리로 보이는 산 하나. 사람들은 저 산을 남산이라 부른다지.. 원래 이름이 뭐더라. 알고는 있었는데. 남산 아래 작은 고을
동우가 아까 호원이 부른 가락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정말 그 기생 계집이 이런 데에 소질이라도 있는지 어찌 1번 밖에 듣지 않았는데, 머릿속에서 계속 윙윙대었다. 남산 아래 작은 고을은 무슨, 고을. 우리 둘 밖에 없고 허허벌판이구먼. 여기가 한양인 지도 모르겠다니까.
호원이 동우 옆 평상에 내려와 앉았다. 호원이 저고리 사이로 속곳을 안 입어 살짝살짝 비치는 동우의 속살을 보고선 침을 꼴깍 삼켰다. 동우는 그냥 평상에 누워 맑은 조선 땅 하늘을 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냥 공허하기 그지없었다. 저 멀리서 시장에서 나는 시끌벅적한 소리가 살짝살짝 들려왔다.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도 가끔가다 들려왔다. 우리의 얘기가 이렇게 한양 천하에 퍼질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호원이 보지 않으려도 계속 보이는 건 동우의 하얀 살결. 호원이 동우와는 다른 의미로 하늘을 쳐다보았다. 조상, 저는 어찌하면 좋겠소. 아무래도 동우가 너무 예뻐 오늘 밤도 그냥 넘어가지 못할 듯 하오. 호원이 동우의 배위로 손을 올려 동우의 배를 쓸었다. 제 아래로 느껴지는 따듯한 호원의 손길에 동우가 점점 졸리기 시작하였다. 자면 안되는데... 자면 안ㄴ...
호원이 진정을 하고 나서 동우의 얼굴을 보는 순간 동우는 이미 색색 잠들어 있었다.
"잘 자, 뭐 그래도 밤에 다시 깨겠지"
호원이 동우의 옆으로 발라당 누워 잠을 청했다. 그리고 그 앞 울타리 아래 숨어있던 기생 계집아이는 친구 단향과 함께 낄낄대며 이 거지를 어찌할 꼬 하며 킥킥 웃어대는 중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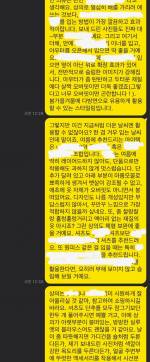



 실시간 셀린느 수지 기사사진 ㄷㄷ
실시간 셀린느 수지 기사사진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