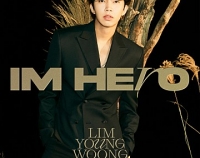똑같은 하루.
오늘도 병원은 바빴고, 나는 뛰어다녔고, 일은 많았으며 시간은 부족했다.
오늘도 어제처럼 흘러가겠지,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퇴근시간이겠지- 생각했다.
예상 밖의 인물을 만나기 전까진.
김석진.
매우 잘나가는 배우였다. 드라마를 보지 않는 나도 그의 작품 제목을 알고 있었고, 가끔 티비를 보는 날엔 광고든 드라마든 그의 얼굴을 안본 적이 없을 정도였으니.
진짜 잘생겼다- 정도의 생각이 적당했다. 나랑 엮일 일도 없을 텐데 뭐 하러 관심을 가지겠는가. 병원에서 만날 줄은 몰랐지만.
호출을 받고 뛰어내려간 응급실에서 마주한 얼굴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잘생기긴 겁나 잘생겼더라.
근데,
"저는 왜 부르신 거예요?"
"네?"
"저한테 호출 왔던데. GS 아니고 OS에 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답답하다.
왜 내 눈치를 보고 있으며 왜 나에게 콜이 들어왔고, 나는 피도 나지 않는 이 사람 앞에 서있어야 하는지. 이럴 시간에 위에서 밀린 처방이나 내렸어야 되는데. 시간이 아깝다.
"제가 부탁드렸어요. 선생님 좀 불러달라고."
"네?"
이게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인가.
"저를 왜요?"
대체 왜.
"선생님 저 모르세요?"
뭐지.
"제가 뭘 알고 있어야 하나요 혹시?"
"와. 저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선생님이 저 알게 되실 때까지."
뭘까.
"선생님. 저 이만 올라가고 OS 선생님 콜 해드릴게요."
"선생님이 해주시면 안 돼요?"
이건 또 무슨 상황이람.
0.1초 만에 돌아온 대답은 엉뚱한 곳에서 흘러나왔고, 다른 선생님들은 눈치만 보더라.
중간에 낀 간호사 선생님들이 난감하실 것 같아, 일하시라고 보내고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최대한 친절하게, 이 사람은 환자다. 나는 의사다.
"환자분, 촬영장에서 쓰러지는 조명을 팔로 막으셨고, 통증이 느껴져서 병원으로 오신 거 맞으시죠?"
"네."
"일단 저는 외과입니다. 환자분은 지금 피도 안 나고, 열상도 없어요. 통증이 느껴지시는 건 타박상일 거고, 그럼 뼈나 근육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쪽은 정형외과에요. 정형외과 선생님이 내려오셔서 봐주셔야 해요."
".........."
"저는 외과라서, 뭘 해드리기가 좀 그래요."
".... 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정형외과 선생님 오셔서 봐주실 거예요. 잠시 앉아계세요."
이 정도면 진짜 친절했다. 잘했다. 와우. 칭찬해 나 자신.
올라가서 하던 일이나 마저 하고 커피나 마셔야...
"저... 선생님."
제기랄.
"네?"
"저 혹시..."
와. 잘생겼다.
"혹시 퇴근 몇 시에 하세요?"
엥?
"어... 제 퇴근시간이요?"
"네. 선생님 퇴근시간이요."
저렇게 빨리 대답하는 걸 보니 내 시간을 묻는 게 맞나 보다.
"정해진 퇴근시간이 딱히 없어요. 일 많으면 못하는 거고, 일 끝내면 집에 가는 거고 그렇죠."
"아..."
"치료 잘 받으시고 조심히 가세요."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의사하면서 연예인 한 번쯤은 만날 수 있지.
오늘 눈 호강했네.
해프닝으로 넘길 수 있었다.
나에게 잘못 왔던 호출도, 아깝지만 보내버린 시간도 전부 다.
다음 날 병원 앞에서 그를 다시 만나기 전까진, 다 괜찮았다.
오래간만에 이른 퇴근에 기분 좋게 병원 밖으로 걸어 나왔는데, 되게 비싼 차가 병원 앞에 서있더라.
누군지 모르겠지만 돈 많으신가 보다. 좋겠다, 하는데 문이 열리더니..
와. 얼굴 진짜 대박이다. 저렇게 생기면 무슨 기분일까.
이 시간에 병원 앞에서 또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병원에 볼 일이 있겠거니- 하고 내 갈 길 가려던 찰나,
"ㅇㅇㅇ선생님!"
지금 들린 게 내 이름이 맞는가?
아니겠지.
"선생님!"
뛰어와서 잡은 게 내 손목인 걸 보니 저 엄청나게 잘생긴 사람이 부른 사람이 나 맞나 보다.
"못 들으신 거예요, 아님 못 들은척하는 거예요?"
"아니, 저 부를 거라고 생각을 안 했... 근데 저는 왜요?"
"선생님 지금 퇴근하시는 거죠?"
"저랑 저녁 먹으러 가요."
와. 이 얼굴로 얘기하면 반칙인데.


![[방탄소년단/김석진] 다이렉트 - 00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file3/2020/03/17/6/8/d/68dcca966ad74ab6e9a156d8b3480d43.gif)
![[방탄소년단/김석진] 다이렉트 - 00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file3/2020/03/17/9/e/8/9e855aeedae022841d237dc01a691cb8.jpg)
![[방탄소년단/김석진] 다이렉트 - 00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19/07/04/2/76a0cf79ca8472372f41ede820fca496.gif)
![[방탄소년단/김석진] 다이렉트 - 00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0/03/17/9/f9e3161cea9c90ff011b9abe8aa8966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