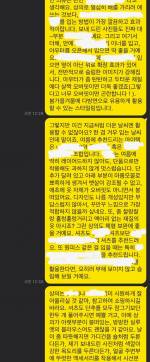uh,good_정의
글쓴이 _ 사라질사람
본글은 절대 픽션입니다.
그 점을 꼭 생각해주세요.
(음악은 필수입니다. 꼭 틀어주세요.)
-결국엔 다 추악한 '진실'이거나 '정의'거나 이 둘 중 하나야.
.
.
.
.
.
.
'도망가요, 제발'
국립 국가안전시설에서는?
2-1. 오늘도 우리는 살아간다.
포비아는 해결방안이 없어보인다. 결국엔 우리처럼 힘없는 일반인은
그냥, 이렇게 살아가다가 끝을 보는거겠지.
어느 한 동굴, 이곳이 어디인지도 지금 해가 떴는지도 모를만큼 어두운 이
동굴에는 연과 태형이 있다.
그들은 이곳에 온지 시간이 오래 됐는지,
하루일과를 자연스레 이어가는 듯 했다.
누워있는 연의 앞에 놓여있는 더럽지만 가득 담겨져 있는
4개의 물병과 그 옆에 자그마한 모닥불이 그들이 이곳에서 어떻게
생명을 연명해 나가는지 보여주었다.
불현듯 연의 뒤에 앉아있던 태형은, 뗄감할 나무들을
가져와 연의 등뒤에 내려놓았다.
"연아, 나 지금 사냥가야 하는데"
"..다녀와, 여기에 있을게"
태형은 연의 대답을 듣고는 얇고, 다 찢어져 낡아버인
자신의 남방을 힘없이 누워있는 연에게 덮어주었다.
그 뒤, 거의 팔뚝까지 다 드러난 자신의 팔에
지난 사냥에서 구해온 청테이프를 칭칭감는다.
단 한치의 빈틈도 없이, 꼼꼼하게.
아마 그것들에게 물리지 않기 위함이겠지.
그것들은 인간이고, 동물이고 상관않고
살육을 하고, 그 시체들의 온갖 내장과 피를 갈취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영화에서나 봤던,
'좀비' 인가 싶었다.
그것들의 감염경로와 감염속도 또한 흔한 '좀비'와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좀비'와 그것들이 다른점은
'무리생활'을 한다는 것이다.
아주 먼 옛날, 그러니까 구석기시대이던가 그때부터 인간은 무리지어 생활을 했다.
그것들도 숨은 끊어졌지만, 지들도 인간이었다 이건지 아니면 그 습성이 남아있는지
무리를 지어 생활을 했다.
어떻게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것들은 무리를 지어 생활을 하기에, 작은 숫자의 인간이 무턱대고 나간다면
감염이 되거나, 죽는 수 밖에는 떠오를 수 없다.
하지만 그 반대로
그것들이 무리를 지어 생활을 하고,
어떤 영특한 인간이
그 무리를 지어 생활한다는 습성을 이용한다면?
_판은 언제든 뒤짚힐 수 있다.
태형은 연이를 혼자 두고 온다는 씁쓸한 마음에
서둘러 다녀오자는 생각으로 빠르게 깊은 동굴을 나와
바로 옆동굴과 연결되어 있는 곳으로 걸음을 옯겼다.
그곳에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한 남성이 태형을 보며 말을 건네왔다.
"어, 태형아 연이는"
"..아직이요, 시간이 더 필요한가봐요."
"..어쩔 수 없지, 지옥같은 시간을 보냈을테니까."
"아..그렇죠 뭐 근데 그건요 가져 오셨어요?"
"당연하지, 이번에는 한번에 끝낼 수 있을것 같아."
"후..지난번처럼 버둥댔다가는.."
"그럴일 없어. 전에 세웠던 가설이 들어맞다는걸 증명했거든,"
"네? 정말요?"
"어, 그러니까 오늘은 큰 수확이 있을거야."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걱정마."
"네, 남준이형,"
-우리가 이기는 게임이 될테니까.
오늘도 역시 꺼지기 직전의 라디오는
듣기 싫은 기계음을 내며, 동굴속에 홀로 남아있는 연의 귓속을 진하게
파고들었다.
-지직_ 국가_ㄴ_국민의_지직__안저_
연은
연은, 그 소리가 듣기 싫었는지 태형의 남방속으로 얼굴을 잔뜩 묻었다.
태형의 남방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가녀린 팔뚝에는 수도 셀 수 없을 만큼의 구멍들이 지저분한 밴드로 덮여있었고,
새하얗던 그녀의 피부색은 찾아볼 수 도 없을 만큼 시간차를 두고 만들어진 듯한 알록달록한 멍들이
그녀의 피부를 덮고 있었다.
연은 울부짖으며 빌었다.
-이 빌어먹을 바이러스따위 그냥 걸려서 빨리 뒤졌으면 좋겠다고.
그녀는 별안간 벌떡 일어나더니, 태형이 간 그 길을 그대로 걷고 또 걸었다.
그렇게 그녀는 자취를 감췄다.
3-1. 내겐 전부였다.
우리집안은 대대로 의사, 판사, 국가 소속 비밀 의약 연구원등
고등지식 함양을 머리에 이골이 나게 중요시하는 집안이었다.
그렇기에 나도 유전으로 내려온 머리가 상당히 좋았고, 더 좋은 결과를 보이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와 연구에
목숨을 걸었다. 내가 미쳐버릴 정도로.
그리고 하나뿐이던 사랑스러운 내 동생 또한 태생적으로 머리가 아주 좋았다.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심각할 수준으로 머리가 좋았고, 9세. 뛰어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해버린다.
말 그대로 졸업해버렸다.
누가 막을새도 없이 그냥 그렇게.
나라도, 대통령도 막지 못했다.
그리고 곧이어 그 아이는 자신의 성장을 버렸다.
고등학교의 졸업장을 거며쥔 것과 동시에
그냥 자기 자신을 놓아버렸다.
꼭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질 않았다. 무얼하는지 아무도 모르게 화장실 딸린
8평의 방안에서 나오질 않았다.
그 아이가 자신의 정신을 놓은지 몇년이 지났을까,
그 아이의 부모님들은 그 아이를 버렸다.
내 사랑스러운 동생을 아무렇지 않게 버려버렸다.
내가 찾을 수 도 없게, 그렇게 영영 버려버렸다.
그리고 새 동생이 들어왔다.
평소와 같이 과외를 마치고 의약 개발팀에 전화를 넣으려
1층으로 내려갔을 때, 그를 처음으로 보았다.
새동생인-김남준을.
어머니는 남준을 집으로 들이며 방긋방긋 웃어보였다.
정말이지 역겨워서 그대로 속을 개워낼 뻔 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계단에 서있던 나를 발견하고는
큰 키와 날렵하고 사나운 눈매를 지닌 김남준을 데려왔다.
소개를 하려는듯 역겨운 미소를 얼굴에 가득 올려둔채로 다가왔다.
"인사하렴 이름은 김남준-
나이는 석진이 너랑 동갑이란다."
-징-징
그러다가 그 여자는 급한 전화라며 급히 집 밖으로 나섰다.
아마 아버지 전화겠지.
그렇게 멍하니 있다가 그애를 지나쳐 그냥 나가려고 할때
그 애가 나에게 말을 걸었다.
"열일곱, 너랑 동갑이야."
그 무겁지도, 그렇다고 가볍지도 않은 목소리에 가던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 그 애를 바라봤다. 그리고 그냥 바라봤다.
"..."
바라본 그 애의 휘어진 눈매는 상당히 짙었다.
'저 새끼도 열일곱 아니네'
그 애의 정신상태를 짐작하며.
갑자기 발을 움직여, 내 코앞까지 온 그 애는
살짝 고개를 비스듬히 숙여 내 귓가에 입술을 가져다 대고
속삭이기 시작했다.
기분이 나빠 그냥 몸을 돌리려는데,
그 애는 가만히 있던 저의 입술을 떼어 목소리를 내었다.
"아, 내 등장이 달갑진 않겠다."
"..."
"동생을 버렸다지?"
"..닥쳐."
"나한테 잘 보여야 할거야."
"..."
"나도 걔 못지않게 머리가 좋거든."
"..."
"그래서 걔가 어디있는지, 너에게 알려줄 수도 있어"
"!!너,"
"그러니까 도와줘. 너도 이 집안 나가고 싶은거잖아, 아니야?"
-내가 널 구원해줄 수 있어.
김남준은 마지막말을 끝으로 내 어깨를 두어번 두드리고는 2층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석진은 집 밖으로 나와 전용 기사님이 대기하시던 차에 올라탔다.
연구소로 가는 내내 석진은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
그냥, 처음만난 새끼한테 자기 자신을 다 들켜버린것만 같아서. 그래서 기분이 나빴다.
안 그래도 연구소 일 때문에 기분 좆 같은데, 저게 사람을 돋구네.
석진은 한숨을 쉬며 자신의 온몸에 감싸던 분노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의 열기를 식히려 마음을 가다듬었다.
하지만 그는
".하아..개시발"
석진은 기분을 조금이라도 가라앉힐 수 없었다.
뭔가 처음 본 그 새끼가 내 구원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꼭 그새끼가 정말 알고있는 것 같아서.
내, 사랑스러운 하나뿐인 동생.
연이의 행방을.
_예고
-김요원은 이름이 뭡니까
-이름 묻는건 금기라고 들었습니다.
-그냥, 묻는거라고 생각합니까
-...
-전 민윤기입니다.
-...아
-그러니 일기장 주시죠, 쏴버리기 전에
그건 덫이었다.
어,긋_구원
마침.
안녕하세요, 글쓴이 사라질사람입니다.
석진선배의 단편, 습작과 이 어,긋으로 한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할 것 같아요.
차기작인 뻐끔도 가끔 가지고 오겠습니다.
늘 남겨주시는 댓글 읽으며, 큰 힘이 됩니다.
작품에 대한 질문은 또한 댓글로 남겨주시면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답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셨기를 빌며,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초록글
초록글![[방탄소년단] uh,good _구원(01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0/04/25/3/804a5eb04ad9647cb48f16c62cf6eb25.jpg)
![[방탄소년단] uh,good _구원(01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19/07/05/19/06dafdc8aa0bb8df7e1ec52ed5499638.gif)
![[방탄소년단] uh,good _구원(01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18/05/13/8/5d0937a182d8e41aff1ddbc6fa432bd5.gif)
![[방탄소년단] uh,good _구원(01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0/07/03/22/778df7276aa45803d73caf38ad28cdeb.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