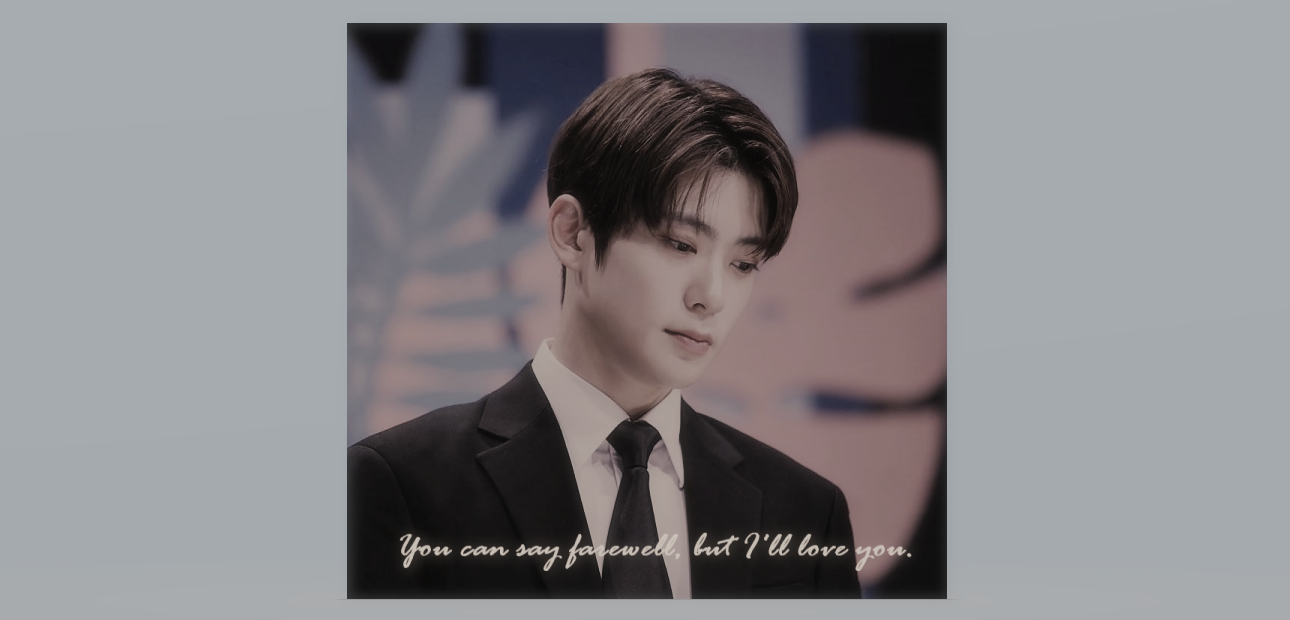나는 자주 그런 생각을 한다.
어쩌면 나도 영화 속 주인공들처럼
누군가를 잊으면 안되는데 잊어버린 것만 같다고,
노을이 지는 강가나, 어둑어둑 해진 호수,
깜깜하지만 별이 반짝 거리는 밤하늘을 보면
왜 인지 모르게 마음이 시큰거린다.
뭉클함이 몰려오면 마치 어딘가에 내가 잊으면 안되는 기억이나,
잊고 싶지 않은 사람을 잊어 버리고 그 깜깜한
기억 언저리를 더듬거리고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든다.
![[NCT/정우] 모든 기억이 지워진다고 해도, 너를 사랑할게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1/01/02/17/99efb1f63fd939ca7d4ce32e0e4b5643.jpg)
답답한 마음을 정리하려고 무작정 떠나온 해안가였다.
노을이 지는 해안가 데크에는 사람들의 발소리보다 잔잔한 파도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이 바닷가도 언젠가 왔던 것만 같다. 낯설지만 익숙하고, 새롭지만 또 편안하다.
처음 오는 곳이 분명했다. 하지만 이곳에서 누군가를 기다려야 할 것만 같았다.
조금만 있다가, 해가 다 질 때 까지만,
한참을 오지 않을 수도 있는 누군가를 기다렸다.
멀리서부터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뒤돌아 보니 한 여자가 나를 빤히 보고 있다.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인데, 낯선 사람인데
나에게 눈을 맞춰 오더니 눈물을 또르르 흘린다.
왜 갑자기 우는 걸까, 나는 얼굴을 살핀다.
![[NCT/정우] 모든 기억이 지워진다고 해도, 너를 사랑할게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19/09/07/22/dad7e5f6c59ba4effce7614602deb752.gif)
우리가 만난적이 있냐고, 저를 아냐고 묻기도 전에
내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에 나는 알 수 있었다.
이 사람 이었나 보다.
내가 잊고 살았던 사람,
내가 잊으면 안되는 사람,
마음 한 구석에 가여운 기억으로 안고 있는 사람.
"모든 기억이 지워진다고 해도, 너를 사랑할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