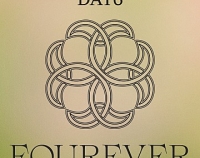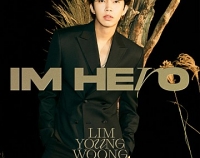느지막한 아침이었다. 하늘 위에는 해가 열 시 방향으로 떠올랐고 창문을 통과해 내린 햇빛은 발가락 부근에서 노닐고 있었다. 남준은 아주 조심스레 침대를 빠져나왔다. 잠시 윤기의 얼굴에 넋을 놓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주 신속하고 조용히 침대를 미끄러져 나와 윤기가 있는 침실 문을 살짝 닫았다.
거실을 가로질러 욕실에 발을 디딘 남준은 흐트러진 머리를 쓱쓱 눌러 넘겼다. 막 방금 자다 일어나서인지 선조차 없던 눈에는 웬일인지 쌍꺼풀이 떡하니 자리하고 있었다. 김남준 일생 첫 쌍꺼풀이었다. 커플이 된 기념으로 자축하는 건지. 어렴풋이 생긴 쌍꺼풀을 매만졌다. 그건 그렇다 치고 방 안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제 연인이 깨기 전에 남준은 몰골을 정돈할 필요성을 느꼈다. 원래 잠도 잘 깨지 않는 성미인데 알람도 없이 일찍 일어난 것 보면 정사가 끝나고 잠이 들기 전에 되뇌이던 면도가 짧은 시간 동안 뿌리 깊게 박혀든 것 같았다.
힘겹던 공방을 어제로써 마무리한 것이 남준은 못내 기뻤지만, 그 기쁨을 좀 더 음미하기도 전에 잠 귀가 밝은 편인 윤기가 깨기 전에 폐인 몰골인 제 얼굴을 어떻게 해야만 했다. 한 번은 일에 치여서 일주일 이상 제대로 못 씻은 얼굴을 들이민 적도 있었지만, 그때랑 지금이랑은 하늘과 땅 차이였다. 섹스 첫날을 이렇게 예의 없는 얼굴로 시작한 것이 미안하기도 했다. 그래도 한밤중에 갑자기 들이닥쳐서는 이 얼굴에 먼저 입술을 들이댄 것 보면 아주 예의가 없진않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남준은 한 손에 쉐이빙 통을 쥐고 힘껏 흔들더니 시원하게 다른 한 손에 크림을 뿌렸다. 그렇지만 이렇게 윤기를 염두에 두었음에도 빠트린 사실은, 남준은 화장실 문을 닫지 않았고, 윤기가 잠든 방문 또한 닫히다 말았다. 때문에 쉐이빙 크림을 뿌리는 소리에 윤기가 잠에서 깬 것을 몰랐다. 윤기가 움직이기 힘든 하반신을 억지로 끌고 나올 때까지 남준은 열심히 크림을 얼굴에 바르고 있었다. 윤기는 얇은 이불보를 몸에 두르고 나와선 식탁 의자에 노곤한 몸을 얹혀 놓았다. 윤기가 앉은 의자에서 고개를 들면 아무런 방해물도 없이 화장실까지 대각선 방향으로 곧게 시야가 트여 있었다. 덕분에 윤기는 남준의 눈에 뜨이지 않고 면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눈을 살짝 내리깔고 면도를 시작한 남준은 윤기의 눈에 사뭇 달라 보였다. 평소에 왁스로 고정하던 머리는 자연스럽게 이마에 내려와서 한층 느슨해 보였다. 원래 일할 때 남준은 빈틈없고 목 끝까지 단추를 채운 듯 단정하고 완벽해 보였다. 실제로 성미가 그렇기도 했고. 윤기도 일에 있어서 무서울 만큼 완벽에 집념 어리는데 그에 못지않게 남준도 완벽을 따졌다. 그런데 둘 다 이렇게 느슨히 풀린 모습이라니. 윤기는 괜스레 피식피식 웃음이 새어 나왔다. 아, 미쳤나 봐.
그렇게 돋아난 수염을 깎아내리는 손길이 움직이는 소리만 고요한 집에 연신 퍼졌다. 윤기는 아직도 잠에서 완벽히 벗어나지 못해서 한쪽 다리를 의자에 세워 올려 지지대로 만든 뒤 팔을 감아 안정적으로 얼굴을 올렸다. 시선은 남준에게서 때어내지 못한 채였다. 금방이라도 잠에 다시 들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저께만 해도 불면증에 시달려 원래도 그렇게 크게 무디지 못했던 성격이 한층 더 날카롭게 벼려져서 주체할 수 없었는데. 윤기는 속으로 탄식했다. 김남준이 확실하게 저를 좌지우지하게 되었구나. 우스꽝스러웠지만 세상사가 가끔은 미쳐야지만 즐겁다고 했다. 어쩔 수 있나. 윤기는 스스로가 제일 멀쩡하고 완전하다고 여기었으므로, 김남준이 필요 이상으로 매력적이라며 자신을 달랬다.
지금도, 무릇 남자라면 줄창하는 면도가 저렇게도 섹시하다. 잘도 생겼네. 애인이 누군지 참, 속 좀 썩이겠어. 그렇게 평소라면 하덜도 않을 생각을 제 손으로 꼬리까지 묶어다가 드나들게 해놓은 윤기가 세수하는 남준을 바라보았다. 면도를 끝낸 남준이 마무리로 얼굴을 물로 씻고 거울에 비친 턱을 보며 가만 쓸었다. 그러다 거울 너머로 자신을 염탐하던 윤기의 비스듬한 시선과 마주쳤다. 놀란 남준이 몸을 틀어 윤기를 보았다.
"들켰네."
덤덤하게 말해 놓고서는 민망한 듯 샐 웃어 보이는 윤기에 한껏 말랑해진 남준이 화장실 샌들을 벗어 던지고선 윤기 앞에 섰다.
"언제부터 봤어요?"
"쉐이빙 크림 뿌릴 때부터."
"안 깨우려고 했는데."
"문 다 열려 있었어 인마."
머쓱한 표정으로 머리를 쓸던 남준이 윤기의 하얀 상체에 드문드문 자리한 붉은 흔적을 보고 손을 뻗었다. 하얀 어깨가 한 손에 움켜쥐어졌다. 어제와 똑같은 자리였다.
"멍들었네, 여기?"
"온몸이 욱신거려서 어디가 멍든 지도 모르겠어."
어제 희열을 못 이기고 윤기의 어깨를 힘껏 잡은 것이 남준의 머리에 스쳐 지나갔다. 희끄무레하게 남준의 손과 멍 자국이 일치했다. 도드라지는 뼈와 전체적으로 얇은 몸체를 보면 미안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만족감이었다. 철옹성 민윤기의 몸에 섹스를 이유로 이런 멍 자국도 만들다니. 충동적으로 윤기의 어깨를 쥐었던 것이지만 만족스러웠다. 나 좀 변태 같나.
남준이 회의감에 잠겨 들든 말든 윤기는 어깨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남준의 옷을 잡아당겼다. 그것으로 남준의 가늘던 죄책감은 산산조각으로 흐트러졌다. 자신을 올려다보는 윤기가 너무 사랑스러웠기 때문이다. 민윤기의 시선이 자신을 향한다. 이보다 짜릿한 게 뭐가 있을까.
"남준아."
"네. 왜요? 뭐 필요한 거 있어요?"
원하는 거라고 하면 당장에 손에 쥐여줄 수도 있었다. 물론 카드 한도 내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남준이 윤기의 앞에 반쯤 무릎 꿇었다. 윤기가 저렇게 계속 보면 남준은 손에 자꾸만 힘이 들어갔다. 너무 예뻐서 견디기 힘들었다. 자신을 올려다보는 동그란 머리의 정수리도. 하얀 얼굴도. 살풋 벌어진 입술도. 못 견디게 예뻐서 남준은 차라리 올려다보는 게 났다 싶었다.
"이제 우리는 무슨 사이야?"
상상치도 못한 질문에 모든 생각 회로가 얼어붙고야 말았지만. 그걸 꼭 물어봐야 아나. 키스도 하고. 뽀뽀도 하고. 섹스도 끝냈는데. 더 뭐가 필요해.
그러나 남준은 무구한 표정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윤기의 면전에다 필터링 없이 그것도 모르느냐고 말하고 싶지는 않았다. 모를 수도 있지. 심지어 이렇게나 귀엽기까지 한데 모르면 어때.
"어제 우리가 섹스할 때. 형이 나를 뭐라고 불렀어요?"
어제? 한창 달아올랐을 때 윤기는 남준을 뭐라고 불렀는지 곰곰이 생각해봤다. 김남준. 남준아. 차마 잇지 못하고 먹혀들어간 이름도 많았다. 워낙 쏟아지는 쾌감과 신음이 많았어야지.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었다.
"준아."
이름의 절반 이상을 날려먹은 호칭이었다.
"나를 그렇게 부르는 건 형밖에 없어요. 그것도 섹스 중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윤기는 그냥 제 손을 파고드는 남준의 손에 같이 깍지를 끼워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한 손으로는 애꿎은 허벅지를 움켜잡았다. 가슴이 너무 간질간질해서 그에 반하는 고통도 같이 줘야 할 것 같은 마음이었다. 괜시리 입술도 물던 윤기가 남준의 이어지는 말에 그냥 모든 행동을 멈췄다.
"그리고 그런 애칭은 애인만 부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나는 그렇게 애칭을 불러대는 사람이 애인 말고는 없었으면 하는데. 그쵸?
남준의 손이 더 죄어오는 것을 느끼며 윤기는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지 준아. 그렇고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