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쳤다.
배고프다.
가족들이 보고싶다.
내 말에 숨겨진, 칼 같이 나를 자해하는 변명들은 내 감정을 깁숙히 쑤셔왔고, 그안에 터지는 눈물들은 더이상 흘릴 시간따윈 없다는걸 잘 알고있지만
또 주저앉아 현재상황에 펑펑 목놓아 울기시작하는 나 였다. 현실직시가 필요하지만, 내 뇌 와 내 몸은, 각자 다른 길을 걷는 사별한 부부처럼
그렇게 목놓아울다, 뚝 그치고 난 다시 일어나 병원안을 떠돌아다닌다. 발바닥이 추적추적하다. 곪아져있던 피 가 맺힌 봉오리가 터진모양이다.
상관않고 난 꿋꿋하게 걸었다. 하지만 걸어도 내 손에 닿이는건 문 손잡이였다. 다시 왼쪽으로 돌아서서가도 문 손잡이가 내 손에 잡혔다.
반복했다. 언제라도 길이 나올까 싶어, 난 누군가 나에게 나갈 기회를 주는데도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괜한 바램을 기다리고있었다. 바보처럼
.
.
.
.
.
.
어렴풋이 다시한번 기억이 나는것이있다.
난 이 병원인지 모를 이 건물에 있었단것, 그리고 내 손을 항상 잡아주고 따스하게 날 안아주던 한 사람이있었다는것.
난 여자친구가 있었는걸까? 항상 나에게 꽃을 선물하고 하트처럼 생긴 입술로 날 향해 웃어주었던 사람이있었다는것.
행복했던 과거 였다.
난 또, 병신처럼 행복했던 과거나 추상하고있다.
.
.
.
.
.
.
.
.
.
누워서 눈을 감고있는 나에게 다가오는 한 발자국소리, 이제 질린다 차라리 죽이라면 죽일테지 귀신이라면 보이지도않는데 별로 무섭지도않다.
내 감정은 매말라져갔다.
"한심하다"
내 귓가에 박히는 가시같은 말 이지만, 나를 필요로 하는 말이다. 하지만 괜히 인상을찌뿌리고 욕을내뱉곤 일어났다.
그 남자는 일어나는 내 팔목을 잡았다. 홱, 하고 빼려고 했지만 그 남자는 내 팔목을 강하게 잡아왔고, 내 입에선 아! 하고 탄성이 터졌다.
남자는 나에게 말했다.
"기회는 내가 주는게 아니야, 니가 만드는거지"
그리고 내 팔목을 잡아쥔채, 남자는 어딘가로 걸었다. 그리고, 내 손에 잡히는건 손잡이였다.
남자는 내 귀에다 대고 말을했다.
"이건 내가 주는 기회야, 니가 만든기회는 이제 없어. 문을열고 너 스스로 나갔으면 했는데, 이제 내가 명령할게 나가"
나 스스로 기회를 내가 만들면 난 쉽게 도전하지못하고
남이 나에게 기회를 주면, 난 그제서야 일을 한다.
그리고 성공이든 실패를 한다.
난 문 손잡이를 손에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고 문을 활짝열었다. 그리고 뜨거운 아스팔트가 내 발바닥에 닿았고, 난 무섭지만 벽 하나 의존하지않은채 앞으로 걸어나갔다.
미칠듯이 밝은 불빛이 따듯하게 내 몸을 감싸고 돌았다.
.
.
.
.
.
.
.
.
.
"태일이형.., 태일이형 어떻게 됬어요?"
"후.. 다행히, 심장은 다시 뜁니다"
"..아..태일이형.., 가..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어찌될지는 저희도 몰라요"
"..네?"
"이태일 환자가 일어나는건, 본인에게 달렸으니깐요"
"이번엔 내가 정말 마지막으로 주는 기회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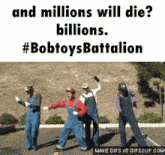


 나의해리에게 이거 왤케 혹평이 많아?
나의해리에게 이거 왤케 혹평이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