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새벽에 익연에 쓰겠다고 했던 성경 선도부 빙의글...ㅋ
은 망글이고 좋네여...☞☜
| 요게 빙의글이예요! :3 | ||
"학번"
3월 초부터 마크 되게 생겼네. 머리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며 선도부 앞으로 다가가자 그렇게 말했다. 말투가 무척 짜증났다. 나를 상당히 귀찮아하는 듯한 말투. 나도 그런 사람에게 곱게 대해 줄 생각은 요만큼도 없었기에 똑같이 대답하고 얼른 교실로 향했다. 10919. 3학년임을 알리는 초록색 명찰에 김성규, 하고 가지런한 석 자가 수놓아져 있었다. 저런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다. 재미없으니까. 반듯한 사람은 반드사게만 살아서 재미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말도 안 되는 탕아는 싫지만. 아무튼 저런 사람은 재미없어서 싫다. 교실에서 가까운 서쪽 현관에서 실내활 갈아신으며 그런 생각을 했다. 그리고 오늘은 꼭 집에 가자마자 엄마한테 명찰 달아달라는 말을 해야지, 라고도.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30분이나 줄어든 등교시간 덕분에 더욱 분주한 아침시간에 엄마한테 짜증을 냈다. 분명 어제 집에 들어가자마자 자켓 벗어두고 명찰 달아달라고 말했는데! 알겠다고 해놓고선 왜 아침에 보니까 명찰이 없는데!
현관문을 쾅, 소리가 나게 닫고 나왔다. 닫힌 문 뒤에서 엄마의 잔소리가 들렸다.
오늘 아침 댓바람부터 엄마함테 짜증내고 나온 벌인가. 내 앞에 가던 애들은 파마를 해도 안 걸리던데 나만 또 걸렸다. 오늘도 김성규, 라는 눈 작은 선도부원에게 이름이 적혔다. 어제 들은 바로는 선도부장이랬다. 공부도 꽤하는 것 같던데, 라고 김성규와 자신의 오빠가 친구라던 짝이 말해주었다. 내 예상대로 정말 반듯, 착실하게 사는 사람이구나.
오늘도 말투가 참 짜증났다. 나를 귀찮은 듯 여기는 것 같았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나도 귀찮다는 듯 대답하려고 했는데 저쪽에서 나보다 먼저 내 학번을 친히 불러주셨다. 당황스러워서 이게 뭐하는 전개래, 하고 눈을 조금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자 손에 뭔가를 쥐어주었다. 그리고 눈짓으로 빨리 들어가라 하였다.
*
시끄러운 와중에 짝의 팔을 붇잡고 멍하니 말하자 당연히 안 들린다는 말만 되돌아왔다. 나는 혼이라도 빠진 듯, 멍하니 김성규에게서 눈을 뗼 수가 없었다. 그는, 빛나고 있었다. 아니, 무슨 은근한 후광이라고 비추는 느낌이었다. 한 시간 반 가량의 공연이 끝나고, 사람들은 즐거웠다는 표정으로 공연장을 빠져나갔지만, 짝은 기다렸다가 자신의 오빠를 만나겠다고 하였고, 나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여전히 멍하니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드디어 사람들이 거의 다 나가고서야 우리는 대기실로 향했다(대기실이라고 해도 말만 대기실이지 그냥 대기하는 뒷방이다). 그곳에서 그들은 땀을 흘리며 쾌활하게 떠들고 있었고, 짝은 그들과 친숙하게 인사했다.
짝이랑 쏙 닮은 그녀의 오빠가 땀을 닦으며, 웃으며 내게 말을 걸었다. 나는 작게 네, 하고 대답하면서 김성규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는 나따위는 신경조차 쓰지 않은 채 무심히 물을 마시고 있었다. 쳐든 턱 끝에선 땀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야, 성규야, 너 좀 봐줘라. 내 동생 친구라는데-. 넉살 좋게 웃으며 그가 말하자, 김성규는 이번에도 무심한 표정으로 무심하게 답했다. 이미 많이 봐주고 있어. 그리고 흰 타올로 얼굴의 땀을 한 번 닦더니, 내 곁을 스쳐지나가며 말했다. 잠깐 나와. 할 말 있어. 조금 시끄러운 분위기에서 나만 들리게끔 했던 그 목소리. 밀도가 높은 목소리에, 나는 다시 한 번 취했다. 봄날의 잠에서 갓 깬 나비 마냥 그의 말에 따라 밖으로 나가자, 공연장 뒷편이었다. 3월 말의 봄바람이 살갗에 닿아 땀을 식혔다.
내 신상정보를 확인이라도 하 듯 되묻는 말에 고개만 주억였다.
뭔 의도지, 싶어 고개를 들자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싫으냐고, 선도부.
무뚝뚝한 내 말에 그는 한숨을 작게 내쉬며 미간을 찌푸렸다. 이렇게 보니 안 그래도 작은 눈 더 작아보인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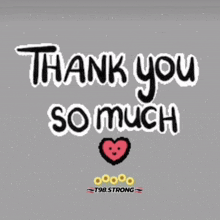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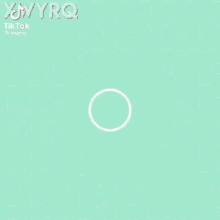

 주지훈 이거 진세연한테 키스신 방향 가르치는 건데
주지훈 이거 진세연한테 키스신 방향 가르치는 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