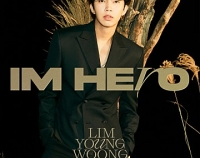"여주야, 너 괜찮아? 얼굴이 완전 새하얗게 질렸..."
"괜찮아. 쉬면 나을 것 같아."
손에 들려있는 것을 숨기기 위해 급히 들어온 방 안.
내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내가 미쳤지..."
털썩, 침대에 누워 그의 일기장을 쳐다봤다.
"어린 왕자라,..."
그 사람에 대해 이름 말고는 아무 것도 모르지만....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다.
시간이 꽤 흘러 낡게 바랜 겉표지를 바라보다가,
"... 미안해요. 당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은데, 그 쪽이 이제 더 이상 없잖아요."
천천히 일기장을 펼쳤다.
*
2011년 1월 13일
이렇게 일기를 쓰는 것은 아주 오랜만의 일이다.
초등학교때가 마지막이었지. 그러나, 솔직한 일기는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나는 어릴적부터 특별했다. 아니, 특이했다.
나는 내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노력 없이 이해할 수 없다.
이를 인지한 것은 꽤 오래 전 일이었다.
의사선생님과의 만남이 이어지고,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나는 기대만큼 변하지 못했다.
내 특성을 아무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이후, 나는 입을 다물었다.
나와의 대화를 재개해보려 노력하던 그는 어제 내게 일기쓰기를 추천했다.
어떤 방식이든 감정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고.
그의 말이 얼마나 맞을지는 모르지만, 꽤 타당한 말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의 두번째 제안은 바로, 나에 대해 솔직하게 써보라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앓고 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소시오패스.
*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던 손은 어느새 눈에 띄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가 사실이든 거짓이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선뜻 책을 덮지 못했다. 첫 장에 그대로 멈춰서는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
나는 책을 두고 그대로 문 밖으로 나섰다.
*
"뭐? 뭘 가져와?"
"... 일기장."
"너 미쳤어? 재수없게 왜 죽은 사람 일기장을 가져와? 그리고 그거 사생활 침해야! 아니다, 죽었으니까 아닌가... 아무튼!"
내 손에 든 일기장을 본 룸메는 경악했다.
그래, 내가 생각해도 미쳤지.
"지금이라도 돌려놓는게 맞을까?"
"당연하지, 그걸 말이라고...!"
"근데... 나 궁금해. 솔직히 말하자면, 나 그 사람 좋아했던 것 같아."
"뭐?"
"미친 소리로 들릴 거 아는데, ... 니가 그 사람을 못 봐서 그래."
"... 왜, 잘생겼었냐?"
... 눈치 되게 빠르네.
"... 어. 근데 잘생긴 것 말고도... 그러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우라가 있었..."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 그 사람이랑 겨우 두 번 만난 거 잖아. 아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 그래도 이름은 안다, 뭐."
볼멘소리를 내뱉고도 스스로가 한심했다.
아는 건 이름밖에 없는데. ... 근데 솔직히 이름도 잘생겼...
... 나 진짜 미쳤나봐.
"자랑이다, 이것아! ...니 마음인데 내가 그걸 무슨 수로 말리겠냐. 근데 거기 있는 거, 감당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응."
"... 근데 너는 지금 감당하고 싶지?"
룸메의 돌직구에 순간 멈칫했다.
그렇다. 나는 그가 여전히 궁금하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더 궁금해졌다.
... 그에 대해 더 알고 싶다.
"... 응."
"그럼 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일기장 정도 읽는다고 해서 죽을 죄를 짓는 것도 아니잖아."
"..."
"그리고 혹시 알아? 니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을지."
"뭐?"
예상치 못한 룸메의 말에, 나는 눈을 빠르게 깜빡였다.
"그 사람 어린 나이에 너무 빨리 갔잖아. 이루지 못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도..."
"고백 못 해 본 한을 그렇게라도 풀라고. 너 지금 한 맺혀서 이러는 거야."
"뭐?"
"그리고, 나한테 말하는 건 좋은데, 내 눈 앞에서 저 책은 치워.
나 미신, 저주 이런 거 완전 잘 믿는 거 알지? 이제 얼른 니 방으로 꺼져, 이 정신나간 룸메이트야!"
*
다시 들어온 방 안.
침대 위 펼쳐진 일기장을 보고 한숨을 푹 쉬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조금 무섭다.
드라마, 영화 이런 데서 나오는 소시오패스는... 잔혹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니까.
이걸 당장 덮고 원래 자리에 두는 게 맞는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누가 들으면 미쳤다고 할테지만... 내가 봤던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죽이거나, 그랬을 사람은 아닌 것 처럼 보였다.
...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걸지도 모르지.
머리를 헝클이고는 그대로 누워 다시 일기장에 눈을 돌렸다.
*
2011년 2월 7일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기까지 약 한 달.
평범한 이들에게는 두려움과 설렘이 함께 할 시간이겠으나,
나는 내가 어떤 감정을 느껴야하는지 다시금 배워야하는 시간일 뿐이다.
잘 다려진 새 교복을 보면서 나는 이 교복이 갈기갈기 찢겨진 모습을 상상한다.
그러나 나는 내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3년 전 중학교를 입학할 때 그랬듯이,
다른 사람들의 호감을 살 수 있을 만한 물건들이 내 눈 앞에 쏟아졌고
나는 마네킹처럼 서서 그것들을 내게 갖다대는 어머니를 마주했다.
그러나 나는 그가 갖다대는 수많은 물건이 아니라,
그의 눈에 새겨져 있는 흉터를 바라봤다.
그리고 떠올린다. 내 다리에 놓인 또 다른 흉터를.
2011년 2월 17일
아주 오래 전, 의사선생님이 나에 대해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엿들은 적이 있다.
나의 경우는 조금 독특하다고 했다.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나를 '정상적'으로 살아가게 만든다고.
'정상적'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그러니까... 내 속 안에 드는 차가운 감정들을 억누를 수 있다는 의미인 것 같았다.
그러니 그 외의 사람에게도 어머니에게 느끼는 애착을 느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어머니는 그 말에 희망을 걸고 있는 듯 했다.
오늘 그는 나에게 친구를 사귀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누군가와 우정을 쌓아보라 말했다.
나는 우정이 뭐냐고 물었다.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고, 아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 했다.
내가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
*
그의 일기 내용은, 역시나 낯선 얘기들이 가득했다.
내가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
내게 너무도 당연했던 단어의 의미나 감정은
그에게는 배우고 이해해야하는 것이었구나.
곧 일기에 펼쳐질, 그의 고등학교 생활이 순탄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 눈에 훤했다.
하지만... 내 예상은 틀렸다.
그 뒤 펼쳐진 일기의 내용은
그의 우정이었으나 사랑이었던,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다.
* 안녕하세요! 별빛이피면 입니다.
분량 조절에 실패해(...) 원래는 한 편으로 예정되어 있던 것을 두 편으로 쪼개서 가져왔어요!
바로 다음 02를 읽어주시면 된답니다.(재휸쓰 등장을 예고해드렸었는데... 02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ㅠㅠㅠ 죄송해요엉엉)
부족한 글을 읽어주시는 모든 분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