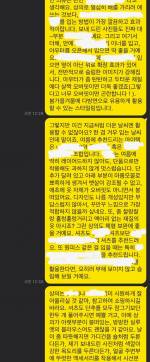#48.
술집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해수욕장 벤치에 앉아 부서지는 파도 소리를 듣는다. 불꽃놀이에 한창인 사람들이 모래사장에 각각 크기가 다른 발자국을 남겼다. 같은 곳을 맴도는 파도와 사람들의 소음과 그 사이를 파고드는 고요함이 맞물린다. 내 쪽으로 가까이 다가앉은 그가 먼저 정적을 깼다.
- “아무 생각 안 하고 논 건 이번이 처음 같다.”
- “애들이랑 오길 잘했지?”
- “네 술주정이 가끔 쓸모가 있네.”
- “너의 일탈을 위한 나의 빅픽처를 칭찬해.”
- “어제 보여준 그 원피스는 언제 입을 건데.”
-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어.”
불타오르는 주먹맛을 굳이 너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 단단한 주먹을 얼굴 앞에 들이밀며 협박한다. 그는 피식 웃으며 주먹을 거둬 곧장 깍지를 꼈다. 주차 공간을 찾아 해수욕장 주변을 맴도는 차들의 클락션 소리가 밤을 깨운다. 등대의 불빛이 진해질 무렵, 그에게 묻고 싶었던 말을 꺼냈다. 아주 예전의 일이었지만.
-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 “뭘.”
- “고3 때 교무실에서 내가 담임한테 막말했던 거. 너한테 그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은데.”
- “그때 나 교무실에 있었어.”
- “……뭐?”
- “구석에서 담임한테 양호실 간다고 뻥치고 있었는데, 왜 임용고시에 인성 검사 없냐고 누가 이 악물면서 얘기하더라.”
그게 너였는데. 캄캄한 하늘을 바라보던 얼굴이 내게 향한다. 눈꼬리를 접으며 웃는 그가 벤치에 등을 기댔다. 내가 기억한 그와의 첫 만남이 과학실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라는 중이었다. 악에 받쳐 토해내는 나와, 그 모습을 같은 자리에서 바라본 그가 우리들의 진정한 첫 만남이었을 줄이야. 분노에 달아오른 얼굴과 목소리를 듣고 있던 그의 표정은 어땠을까. 첫 만남이라 생각했던 과학실에서 조차 그는 이미 날 알고 있었기에 조금은 경계를 풀고 내 이름을 부른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
- “그럼 과학실에서 마주쳤을 때 아는 얼굴이라 반가웠어?”
- “반가웠다기보다는 좀 놀랐지.”
- “왜?”
- “꿈 같았으니까. 이름 알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이루어진 게 말이 안 되잖아.”
창틀에 앉아 내 이름을 조용히 내뱉던 목소리가 생생했다. 그 모습에 나마저도 꿈이라고 생각했으니, 우리는 결국 서로의 꿈 안에서 얘기를 나눴던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 “그날 둘 다 과학실에 없었으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
- “…….”
- “같이 앉아서 바다 보는 건 상상도 못 했는데.”
- “…….”
- “그때도 지금도 다 꿈 같다.”
잡고 있는 손을 내려다보며 지그시 눈을 맞춘다. 우리가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도 살아 있었을까 하는 조금은 슬픈 물음들. 애써 발장난을 치며 분위기를 환기한다.
- “결국은 만나서 이름 알았잖아.”
- “…….”
- “결국은 같이 살고.”
- “…….”
- “지금 같이 바다도 보고.”
하늘과 바다의 경계를 구분 지을 수 없을 만큼 깜깜한 세상 속에 펑-, 터지는 불꽃이 머리 위를 돈다. 한참 전에 멈췄어야 할 내 시간이 그와 함께 다시 돌고 있다. 한 손에 든 폭죽이 포물선을 그리며 단발의 환영을 낸다.
- “오늘 여기 잘 온 것 같아.”
- “나도.”
- “너 아까 폭죽 무서워하지 않았어?”
- “연기 때문에 눈 아파서 그래.”
- “속아 줄게.”
- “진짜라니까.”
당황할 때마다 나오는 저 사투리는 계속 안 고쳤으면 좋겠다. 폭죽 대 연기에 인상을 찌푸리던 그는 마지막 한 발까지 하늘에 터트리고 나서야 환하게 웃었다. 다음엔 폭죽 말고 쥐불 놀이나 하자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인다.
- “다음 학기도 방학인 학교는 없나.”
- “전공이 방학인 학교가 분명 하나쯤은 있겠지.”
- “불꽃놀이는 부전공이고.”
- “총장은 너고.”
- “학생은 너.”
닮아가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님을 손수 깨닫게 해준다. 남은 폭죽을 소진하고 나서야 다시 술집으로 돌아갔다. 소주병에 숟가락을 꽂아 구수한 타령 한 소절을 뽐내는 민규가 단연 눈에 띄었다. 석민과 승관은 불가사리 보컬과 예비주자답게 화음을 쌓았다. 어느새 승관의 손엔 쌈장에 찍은 오이가 있었고, 녀석은 아무래도 거하게 취한 모양이었다.
OH MY RAINBOW
;Caramel Drizzle
Chapter 24.5 〈전환 2>
#48.
진짜 안 취했어. 진짜야. 내 눈 봐봐 얘들아. 버둥거리는 거대한 민규를 거실 바닥에 억지로 눕힌 후 자장가를 부르는 승관의 이마에 힘줄이 섰다. 주정뱅이 취급한다 이불 밖을 빠져나오려 애쓰던 민규는 승관의 반복 재생에 그만 넉다운을 당했다. 입까지 벌리고 자는 민규의 코 옆에 수성펜으로 왕 점을 찍은 석민이 큭큭댄다. 한심하게 쳐다보던 지훈마저 석민과 합세해 민규 옆에서 꿈뻑꿈뻑 조는 승관의 이마에 지렁이 세 줄을 그렸다. 간지러움을 참지 못한 승관이 게슴츠레 눈을 뜬다. 내일 아침 알람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 “이제 2차 가는 거냐.”
- “너는 좀 자라.”
- “캐리어에 노래방 새우깡 있는데 어때?”
- “그럼 지렁이만 빼고 2차 가자.”
지훈의 도발에 석민이 콧구멍을 벌렁거린다. 승관은 귀를 벅벅 긁으며 방으로 들어가 부스럭 소리를 냈다. 큰 쟁반에 맥주와 소주를 담아 밖으로 향하는 석민을 따라 지훈과 나와 승관이 순서대로 숙소를 빠져나갔다. 민규는 코를 골며 배를 긁었다.
- “이제 진짜 여행 온 것 같지 않냐? 여름 냄새 죽인다.”
- “약간 고기 굽다가 탄 냄새.”
- “맞아 그거! 이쥰, 너 오랜만에 나랑 좀 맞는다?”
- “처음 아냐?”
-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새끼야.”
말은 저렇게 해도 술병을 좌우로 흔들어 회오리를 봐야 운수가 좋다는 지훈의 막말을 들어주는 녀석이다. 석민은 캐리어에 있는 마른오징어를 깜빡했다는 말과 함께 다시 숙소로 돌아갔다. 이럴 거면 아예 캐리어를 달고 나오지 그랬냐는 지훈은 석민의 윙크를 받고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평상에 드러누운 승관이 깊은숨을 뱉는다. 그것의 적나라한 형상이 보이지 않는 계절, 여름이었다.
- “하늘은 볼 때마다 똑같은데 시간은 자꾸 가네.”
- “요즘은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서 싫어.”
- “개강 계획은 다들 세우셨는지요?”
- “그게 뭔데?”
- “왜 네 대답이 시간 가는 것보다 더 슬프냐.”
- “개 강해져.”
- “아까 낮에 이지훈이 약 찾던데 빌려서라도 줄 걸 그랬다.”
승관이 주먹을 내밀자 지훈이 그대로 자신의 주먹을 박는다. ‘새우깡, 누가 더 많이 먹나’ 대회에 홀로 참가한 나는 술보다 과자를 욱여넣고 시선을 회피했다. 잔을 채우는 승관의 모습이 유난히 고독하다. 지훈은 말없이 술을 넘겼다.
- “대학 입학하고 나서 뭐 했는지 기억나냐? 나만 기억 안 나?”
- “정신이 좀 없었지.”
- “돈 개 많이 냈는데 기말 끝나니까 완전 백지야.”
- “벼락치기 앵간히 좀 해라.”
- “형님, 인생에 술과 벼락치기를 빼면 뭐가 남겠슴까?”
말 많은 고독을 빨아대던 승관이 잔을 비운다. 진짜 세상에 들어가기 직전 마지막 울타리 안에 갇힌 스무 살들의 대화 주제는 불행히도 ‘어떻게 먹고살 것인가’였다. 학문에 눈을 뜨고 진리를 탐구하는 교육의 참된 의미는 벌써 흐려진지 오래다. 적어도 이곳의 스무 살은 그랬다.
- “야, 솔직히 학교 보고 성적 맞춰 온 거지 누가 전공에 뜻이 있어서 왔겠냐. 취업률 높으니까 왔고 A대니까 왔지 진짜 관심 있어서 입학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 수업 듣고 있으면 진짜 답답해. 이게 내가 원했던 인생이었나 계속 의심한다니까.”
- “이제 1학기 지났는데 뭘.”
- “그러다가 4년 몽땅 사람들도 있다잖냐. 그 사람들이 바보였겠냐? 이 길이 아닌가 했다가도, 너처럼 조금 더 버텨봐야지 하다가 결국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거나 전문 대학 다시 들어간다고. 요즘은 거의 선자라서 더 슬퍼. 경쟁률 보면 차라리 다시 태어나는 게 더 빨라.”
지훈이 쌓던 새우깡 탑이 우르르 무너진다. 잔해를 주워 먹는 승관이 폭-, 한숨을 내쉰다. 석민 다음으로 세상 편하게 살 것 같았던 녀석의 고민이었다.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나오지 않는 답을 찾는 건 꽤나 고통스러운 일이다. 머리카락을 쥐어짜며 신음을 내던 승관이 지훈을 보며 입을 비죽 내민다.
- “이쥰, 넌 좋겠다. 진짜 건축이 좋아서 간 거잖냐. 아버지도 건축하시고 너도 졸업하면 바로 회사 들어가면 되겠네. 승승장구다 완전.”
- “너 취했어.”
- “지금 제일 부러운 사람이 너야. 좋아하는 일도 일찍 찾고 능력도 되니까 얼마나 좋냐.”
- “…….”
- “이런 말 진심 맨정신에 못해서 그래. 진짜 부러운데 한편으로는 제일 자랑스럽다 친구야.”
지훈이 부럽다가도 자랑스럽다는 승관은 술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잠이 들었다. 간간히 폭죽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엉키는 새벽, 지훈은 차마 마시지 못한 승관의 잔을 넘기고 진한 숨을 뱉는다. 골아 떨어진 녀석 위로 담요가 덮인다.
- “이 길이 맞나 싶은 건 꿈이 있어도 마찬가지지.”
……
- “하루에도 수백 번.”
꿈을 일찍 가진 사람도, 미처 가지지 못한 사람도 고뇌하는 밤이었다.
Epilogue.
조금 더 있겠다는 내 말에 지훈이 승관을 둘러업고 숙소로 향했다. 저 멀리 지훈을 보며 신나게 달려오는 석민이 다리가 없고 머리가 없는 오징어 몸통을 흔들었다. 잠에서 깬 민규와 간단히 한 잔만 한다는 것이 병을 비울 때까지 마셨다며 멋쩍은 미소를 지었다. 평상을 정리하는 내 앞에 앉아 새우깡을 훔쳐 먹던 석민이 복잡한 내 얼굴을 흘긋거리며 눈치를 봤다.
- “여주, 무슨 일 있었어?”
- “아니.”
- “울 것 같어.”
- “아니야 그런 거.”
남은 맥주를 비우고 조금 전 승관이처럼 평상에 누워 깜깜한 하늘을 담았다. 별도 그대로, 달도 그대로인데 하늘 아래는 정말 복잡하네. 형상 없는 숨이 여름밤을 채운다. 매사 활기차던 석민도 오늘따라 말이 없다.
- “서쿠, 넌 졸업하면 뭐 할 거야?”
- “아직 생각 안 해봤어.”
- “호텔 일 할 것 같아?”
- “그러지 않을까? 전공이잖어.”
이번엔 지훈이처럼 새우깡 탑을 쌓는다. 석민은 집중을 다 해 공을 들였다. 하지만 순간의 바람에 의해 무너지는 공든 탑, 석민이 짧은 아쉬움을 보인다. 옆 펜션에서 들리는 왁자지껄한 웃음소리에 비로소 속마음이 묻힌다.
- ‘야, 솔직히 학교 보고 성적 맞춰 온 거지 누가 전공에 뜻이 있어서 왔겠냐.’
……
- ’그러다가 4년 몽땅 날리는 사람들도 있다잖냐. 그 사람들이 바보였겠냐?’
사실 내 전공 관심 없어.
- ‘이 길이 맞나 싶은 건 꿈이 있어도 마찬가지지.’
……
- ‘하루에도 수백 번.’
……꿈도 없고.


 초록글
초록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