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뇽토리/여신] 피카소의 고충
빨라지는 손놀림을 멍하니 바라보다 나도 모르게 다리를 움직여버리자, 사람들이 모두들 작게 탄성을 지른다. 승현씨, 움직이면 안돼요. 언제부터 지키고 있었던 건지 책을 읽고 있던 교수가 안경테를 올리며 지적했다. 고개를 끄덕일 수도, 대답을 할 수도 없어 그냥 눈을 두번 꿈뻑였다. 여러개의 눈들과 손들이 작은 내 행동 하나에도 반응을 하고 있다. 겉눈질로 시계를 바라보자, 5분도 채 안남았다. 후- 드디어 끝났구나. 속으로 300초를 샌 후 난 몸을 간신히 펼 수 있었다. 오늘은 특별한 제출하는 평가가 아닌지, 몇 여자들은 그림을 나에게 선물했다. 낯이 익은 사람들은 음료수따위를 놓아주며 자기 번호를 적기도 했다.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그림을 선물하는 사람은 잦았지만, 번호를 받은 경우는 처음이라 그냥 웃기만 하자, 그림과 함께 있는 연락처를 내 가방에 쑤셔 넣는 여자도 몇몇 있었다.
“맨날 이거해요?”
“네?”
수줍게 웃던 여자들이 떠올라 꽤나 들떠 있었지만, 여자 따위에는 관심 없는 척 가방에 수북한 종이들을 귀찮다는 표정으로 챙기고는, 벗어놯던 자켓을 주섬주섬 입고 있는 나에게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인 남자가 다가왔다. 맨날 이 일 하냐구요. 모레도 해요? 임팩트 있는 얼굴과는 다르게 식상한 질문에 어물쩍 대답을 하고, 삐뚤어진 책상을 맞추고 있자, 남자는 대충 찢은 스케치북 한장을 돌돌 말아 나에게 던지듯 선물하고는 없어져버렸다. 아까 가방에 다 넣어서 이제 자리 없을텐데…. 작은 가방에 간신히 들어간 두터운 종이들을 바라보며 걱정을 하기도 전에, 어느 장식 없이 말려만 있던 종이가 땅에 떨어지며 펼쳐졌다. 자연스레 그림을 주으며 확인한 내 반나체의 그림은 확실하게 특이했다. 몇번씩 받아봤던 같은 구도의 그림인데, 남자의 인상과 오묘하게 매치되는 선이였다. 나름 깐깐한 내 안목에 드는 그림에 만족하며 감상을 할 때 쯔음, 교수가 날 불렀다.
“승현이 인기 많네?”
“인기는 뭘요….”
“수고했어. 저번달 보다 두둑하게 넣었으니깐, 이쁜 옷 사입고.”
“매번 감사합니다. 그럼 모레 뵈요.”
그래, 몸 좀 풀고. 굳혀있는 내 어깨를 몇번 돌려주던 교수가 등을 툭툭 치고는 강의실에서 나갔다. 교수 마저도 없는 텅빈 강의실을 쭈욱 둘러보다, 발에 닿는 둥근 촉감에 몸을 숙이자, 누군가 실수로 흘리고 갔을 1/4도 체 안쓴 콩테가 있었다. 이게 그 잘난 미대생들이 쓰는 콩테인가? 몇번 만지작 거리자 손에 묻어 엄지와 검지가 시꺼매져, 대충 바지에 비벼 닦고는 콩테를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강의실을 나가는 발걸음이 받은 금일봉에 비례하지 못하게, 무겁기만 하다.
*
막노동을 하는 것도 아닌데, 늘 금일 알바를 끝내면 몸이 축축 늘어진다. 집에 도착하자 마자 녹아버린 아이스크림처럼 침대에 흐르듯 내려앉았다. 싸구려 매트리스가 삐그덕거리며 수명이 다했음을 알리고 있었다. 버릇처럼 베개를 끌어 안으며 눈을 감았다. 분명 몸은 피곤한데 정신은 반짝하다. 눈을 껌뻑이며 숨을 내쉬자 수백개의 눈들이 떠올랐다. 머리를 저으며 잠에 들으려고 애썼지만 ― 내 오래 전부터 꿈이였던 미대와, 지금 내 처지. 비까번쩍하는 교수의 차와, 나의 23번 버스. 아름답게 빛나는 미대생들의 손놀림과, 나의 초라한 나체. 분명 같은 공간에서 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른 걸까? 하는 ― 되도않는 신세타령과 어지럽게 흩날리는 미대생들의 눈빛이 내 숙면을 괴롭히고 있었다. 내일 편의점 알바를 하려면 어서 일찍 자야할텐데- 입으로 중얼거리며 난 애써 눈을 꽉 감았다.
*
오늘따라 난감한 포즈에 꽤나 힘이 들어, 쉬는시간이 되자 마자 난 바닥에 주저 앉고 말았다. 자리를 지키고 있던 몇몇 사람들이 힘 없이 쓰러지는 내 몰골을 보며 수근덕거렸지만, 그런 자잘한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등부터 시작된 땀줄기를 닦아내며 저려오는 다리를 주물렀다. 멀리서 책을 읽고 있던 교수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을 뿐이였다. 핸드폰 액정을 빠르게 눌러 보니, 쉬는시간이 십분 채 남지 않아있었다. 또 시작이겠구나- 싶어 한숨을 내쉬는 내 앞으로 유리병 한개가 밀려 들어왔다.
“더워 보여서요.”
“……감사합니다.”
내가 꽤나 불쌍해보였는지 후드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자가 내 어깨를 두드리며 자리로 돌아갔다. 어쩐지 기분이 묘해져 유리병에 담겨진 오렌지 주스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네 입장에선 내가 참으로 딱하겠지. 시간이 다 되었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 난감한 포즈를 엉거주춤 다시 취했다.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 파들파들 떨려왔지만 손 끝 하나라도 움직이면 죽일 태세로 쏘아보는 교수 때문에, 난 꼼짝할 수 없었다. 슬쩍 시간을 보니 시작한지 팔분이 간신히 넘어가고 있는데, 여덣시간은 한 듯이 벌써 힘이 들었다. 주스라도 좀 마실껄- 하는 후회에 회색 후드 모자를 찾으며 시선을 돌리자, 그만 눈이 마주쳐 버렸다.
“아…….”
입가에 점. 그림을 버리듯 주고 간 남자였다. 후드 안의 얼굴이 똑바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 나를 보고 있겠지만, 어쩐지 관심을 받는 것 같은 기분에 눈을 꽉 감아버리자, 제법 먼 거리에서 있던 남자의 웃음이 들려왔다. 그닥 신경을 쓰고 있지도 않았는데, 작은 비웃음이 왜 이렇게 크게 들리는지. 얼굴이 화끈해져 슬쩍 눈을 뜨고 마주하자 남자는 싱글 웃는 얼굴로 힘내요- 라며 시선으로 내 어깨를 다시 한번 두드렸다. 마치 조롱당하는 것만 같은 분이 들어 얼굴이 한층 더 붉어지고 말았다. 한번 더 비웃을 것이 뻔했지만, 견딜 수 없던 난 눈을 다시 한번 꽉 감았다.
*
아니나 다를까 일이 끝나자 마자, 제출하는 학생들과는 다르게 남자는 내 옆으로 편하게 다가오더니 둘둘 말은 종이를 내게 건넸다. 이틀에 한번 꼴로 일을 하는 나에게 이주일 동안 빠짐없이 그림을 건네던 남자의 얼굴을 올려다 보며, 이제는 자연스럽게 종이를 받았다. 역시나 그림 속 내 얼굴은 분홍색이였다. 한숨을 내쉬며 그림을 확인하자, 마치 장난꾸러기 같은 웃음이 귓가에 들어왔다.
“걱정 마요. 제출하는 그림에는 멋있게 그렸으니깐.”
“네. 감사합니다.”
“어깨도 좀 넓게 그렸는데.”
“…….”
받아들은 종이를 신경질적으로 가방에 쑤셔 넣으며 흘러내린 남방을 고쳐 입었다. 내 동선을 한참이나 지켜보며 흥미로운 표정을 하던 남자가 나의 눈초리에 어깨를 으쓱하며 가방을 매고는 교수에게 인사를 하러 갔다. 어수선한 공간에 나와 인사를 할 겨를도 없어 보이는 교수를 멍하니 보다, 별 미련 없이 강의실을 나왔다. 남자에게 받은 그림만 해도 다섯장이 넘어가고 있었다. 따지고 본다면 선물을 다섯개나 받았는데 답례는 커녕 서로 통성명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이따금 신경이 쓰였지만, 다행이도 큰 아쉬움은 없었다. 이상할만큼 가벼운 발걸음으로 교수의 외제차를 바라보며 23번 버스에 올라탔다.


 초록글
초록글![[뇽토리/여신] 피카소의 고충 | 인스티즈](http://file.instiz.net/data/cached_img/upload/5/1/f/51ff8b5946fc9f9623c32b98b89b8b17.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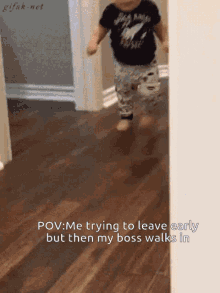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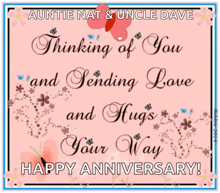


 new ver 게이들 취향순위 표인가바
new ver 게이들 취향순위 표인가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