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성 터지는 밤이나 새벽에 볼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저는 김달빛입니다.
<그대가 머무는 달빛 아래서> -02
*
내가 할 일은 그저 숲 속을 걷고 또 걷는 일. 자주 이렇게 걸으면서 주변 구경을 한다.
내 머릿속을 온통 푸른 빛으로 채우려 한다. 그러다가 공허함이 밀려온다. 이런 공허함도 내 일부겠거니 생각하지만
적응할 수 없다. 혹여 익숙해지더라도 내게는 피해야 하는 '감정'이다. 공허함.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그런 '감정'에 휘둘리며 십여 분 걸었을까. 날이 밝아오기 시작한다.
벤치가 보여 잠시 앉는다.
푸르다. 푸르다.
다시 걸음을 옮기려 일어섰을 때, 내 옆에 누가 앉아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아차렸다.
쳐다보게 된다. 무언가 차갑지만 따뜻할 거란 분위기를 풍긴다. 어째 성종이와 같은 느낌이 들면서도 다르다. 확연하게.
내가 지긋이 쳐다보자 나를 향해 고개를 든다.
"저기요. 왜 쳐다보세요? 불만 있어요?"
날카로운 말투로 나를 쏘아붙인다. 나의 과거를 보는 것 같다. 가시를 세운 채 다른 사람을 경계하던.
그러나 경계만큼이나 수용이 빨랐던. 나는 나를 본다.
이른 아침부터 참 따끔거리는 분이시네.
"아니요. 그냥 그쪽이 눈에 띄네요."
이 말을 하면서 왜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생각해본다. 그저 내뱉은 말일 뿐인데.
다가서고 싶어진다. 그러나 그는 대답하지 않는다.
더 말을 걸어볼까.
"아침부터 너무 날카로우시네. 시간 있으세요?"
"그쪽한테 줄 시간 없으니까 그만 가시죠?"
"여기 주소로 와주시겠어요? 그쪽 매력 있어요."
종이에 주소를 적어서 그의 옆에 놓는다.
"하. 참. 저 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 갈 길 가시라고요."
그를 보며 한차례 싱긋 웃고 뒤를 돌아 집을 향해 걷는다.
이름도 모르는 이를 초대한 것이 지나칠 정도로 좋았다. 그저 이방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 아니라
왠지 새로운 감정이 생겨나고 있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도 나는 확신한다. 그가 꼭 올 거라는 걸.
다른 사람들이 봄을 맞이하고 여름으로 달려가고 있다면 나는 봄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 같아서,
메마른 나에게 사랑이 찾아온 것 같아서,
그게 특별한 사랑일 것 같아서,
오랜만에 슬픔을 잊는다.
오랜만에 기쁨이 찾아왔으니.
나는 그 기쁨의 봄을 환영한다. 웃으면서.
미쳤나봐요. 요즘 새벽에 올리는 일이 많네요.
날카로운 그는 누규일까요.
누규게요. 다들 아실 거 같은데.
여튼
이번에도 댓글 부탁드려요.
이젠 새벽에 안올릴게요. 몸이 만신창이.. 요새 글이 좀 짧아지는 거 같네요.
더 노력하겠슴다.!! 아자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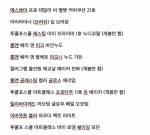






 카톡할 때 진짜 짱 싫다는 것
카톡할 때 진짜 짱 싫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