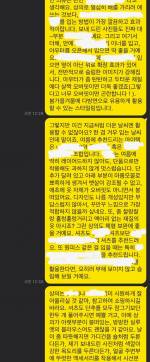- “...하,” “야, 성이름 괜찮아??” 작은 탄식을 내 뱉고 보인 건 하얀 천장이었고 금방 난 기억 할 수 있었다. 사고가 있었다는 걸. 옆에서 호들갑 떠는 정쌤을 무시한 채 일어나 앉았고 팔을 가만히 들여다 보았다. “아니, 글쎄 그 미친 사람새끼는 술 먹었으면 곱게 집에나 있을 것이지 어디 의사한테 손을 대 손을,,! 야 성이름 걱정하지마, 내가 아는 변호ㅅ..!” “선배.” “어, 어!” “저 의사하는데 지장있고 그런 거, 아니죠?” “다행이 너브(Nerve, 신경)는 안 다쳐서 너가 조금만 신경쓰면 금방 나을 거야.” “...” “야, 야!! 김교수님이 너 흉터도 안 남게 한다고 얼마나 애쓰셨게!” “..네.” “ㅈ..좀 쉬어! 아, 너 당분간은 응급실 말고 입원 환자들 병실로 가서 가볍게 체크 정도만 하시란다.” “알겠어요.” “아! 그리고,” “..?” “이재욱 선생, 이재욱 선생이 바닥에 너 쓰러지자 마자 들고 뛰더라.” “...” “사람 참 딱딱하고 정 없어 보이더니 무슨 애인이라도 되는 마냥 놀래서 눈물까지 흘리겠더라.” “아,,” “울었다는 건 아니고 뭐, 감사 인사 전하라고-“ “네, 선배..” 그렇게 혼자 남은 병실에서 어쩔 수 없이 나는 건 옛날 생각이었다. 어떻게 생각해도 이재욱에게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대학교때다. 우리는 죽어라 공부해서 의대에 들어왔고 역시나 들어가서도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소홀히 해서는 절대 상위권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는 내가 다니는 학교 총장이셨고 내가 상위권을 유지하지 못 하면 교수님, 심지어는 학생까지도 손을 볼 것이 분명했기에. 죽어라 공부했다. 아버지가 올려주는 상위권은 절대 하기 싫어서. 사람들까지 다 쳐내며 올려주는 1등이 싫어서. 그렇게 악바리로 공부하던 기말 고사 준비 수업 중, 나는 고비를 느꼈다. 온 몸이 떨리고 수업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식은 땀이 나고 손이 떨려 필기를 할 수도 없었다. 이대로 있으면 정말 옆으로 나가 떨어질 거 같아서 무턱대고 옆 사람 손을 잡았다. “..저기, 119 신고 좀,,” “...!! 괜찮으세요?” 신고를 부탁하고 나서 바로 쓰러졌고 그 뒤로는 기억이 안 난다. 눈 뜨고 나서는 역시나 보이는 하얀 천장에 아버지. 그 뒤론 겨를이 없어서 날 도와준 사람이 누군지 알아볼 생각 조차 하지 않았다. 쓰러져 하지 못 한 공부가 산더미였고 역시나 더러운 1등은 하기 싫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난 2등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너희 반에 이재욱이라는 친구 있니?”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알아보니 그 친구가 항상 1등을 하더구나.” “그래서요?” “이겨야 하지 않겠니? 이기지 못 하면 치우기라ㄷ..” “아버지!!!” “네가 하지 못 하면 내가 할 거다. 내 딸인데 당연이 최고여야 하지 않겠니?” “제가, 제가 할게요.” “...” “그 친구 이름이 이재욱..이라고 하셨죠?” 사실 난 과에 같이 다닐만한 친구가 없었다. 공부하기에 난 내 생활도 너무 아까웠고 밥 먹고 자는 시간이 모두 그랬다. 그러니 친구를 만날 시간은 당연히 없었고 이재욱이라는 친구를 알 리가 없다. 아버지가 또 사람을 쳐내려 한다. 아버지의 그 무식함이 너무너무 싫어서 내가 그에게 다가가 공부하는 방법이라던지 모아놓은 자료라던지 공유 좀 하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 잘못 된 생각이 아직까지 날 후회하게 만들었다. 나 역시 아버지와 다를 게 없었으니까. 지금은 아닐지라도 그땐 난 재욱이를 수단으로 생각했었으니까. 더 이상 그때의 일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고 절대안정의 판넬을 무시한 채 IV (정맥주사)를 떼어 버렸다. “뭐야, 성이름. 절대안정 못 봤어?” “괜찮으니까 나왔죠, 선배님! 멀쩡합니다!!” “얼굴이 하얗게 떴구만, 무슨!” “저 원래 피부 하얗습니다, 선배님~” “하여간 저거, 한 번을 안 지지.” “아 선배, 그 남자애 팔 잘 꿰맸죠?” “당연하지-“ “..그 아버지는요?” “안 그래도 병원 측에서 공무집행방해로..” “됐어요, 그냥 두세요.” “어? 그만 두라고?” “네, 뭐.. 온전한 정신 상태도 아니었고, 그냥 정신과랑 협진해서 상담 한 번 받게 하세요.” “어, 어.. 그래 네 뜻이 그렇다면 뭐.” “이재욱 선생!” “네, 정쌤.” “나 뭐 하나만 물어봐도 돼?” “말씀하세요.” “그때, 성이름 선생 사고 때.” “...” “왜 난 뭔가, 재욱 선생이 평소랑은 달라 보였지?” “뭐가 듣고 싶으신 거세요.” “아니- 하하, 난 그냥 뭐랄까 사연있어 보였다랄까.” “의사로서 할 일 한건데요.” “하하,, 그렇지? 내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어- 사연있는 남자 뭐 그런 거 요새 많잖아?.. 허허,” “...” “(눈치)” “정쌤!!!!” “어, 왜요.” “지금 문제가 좀..” “문제? 무슨 문제요?” “607호 폐암 환자요! 이름쌤이 주치의이신데 어레스트가 와서..” “그래서!!! 빨리 말 해.” “이름쌤이 CPR하시고 계세요..” “....” “....” “... 어, 이재욱 선생..!!!” 곧바로 재욱은 달리기 시작했고 정쌤도 급하게 따라가며 병실에서 마주한 상황은 최악이었다. 식은땀을 흘리며 CPR울 하는 성이름이는 문제 될 게 아니었다. 환자복 가슴쪽이 피로 적셔진 것이 문제였다. 그 피가 성이름이의 손목에서 나오는 것, 수술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실밥이 다 터져 나오는 피, 그게 이 병실 안을 최악으로 만들었다. ——————
이런 글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