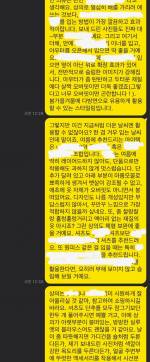〈!--StartFragment-->
그날은 유독 바람도 미친년 대갈빡처럼 불어댔고 기온은 떨어질대로 떨어진 흔한 1월 어느 날의 날씨였다.
독서실을 갔던 게 화근일까 나오다 너를 만난 게 화근일까
“야, 니가 이 시간에 무슨 일이냐?”
“너랑 같은 일이지”
“공부했다는 구라는 빠이빠이입니다만”
“진짜거든”
“네,네 어련하시겠어”
“근데 안 춥냐”
“얼어 죽을 것 같아”
“....데려다줄까?”
“엥? 웬 기사도?”
“싫음 말던가”
만일 내가 그 호의를 받지 않았더라면
“근데 너네 집 가는 길이 원래 이렇게 어두웠냐?”
“가로등 나갔는데 안 갈아주시더라고”
“뭐, 넌 얼굴이 무기니까 딱히 신경 안 써도...”
“황천길 하이패스 끊어드려요?”
“에이, 농담도.”
그 길을 가지만 않았더라면
“야”
“왜”
“수영장”
“...디진다”
아니면 내 볼을 만지던 네 손을 내쳤다면
“너 볼 디게 빵실하다”
“아니까 그만 주물러”
“이런 볼 좋아해”
‘쪽’
"미친놈아 지금 뭐하자는.."
“좋아해.”
“.....”
“좋아한다고, 내가. 너를”
우린 그저 좋은 친구사이로 남을 수 있었을까?
더보기
|
안녕하세요! 처음 글을써서 많이 부족하지만 재미있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주뵈요! 춰둘 내용을 여기에 입력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