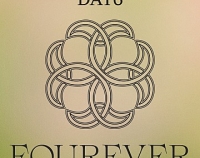"밥 먹어."
"......"
평소와 별반 다르지 않은 적막함이었지만,
그 날의 부엌은 조금 더 어색하고 불편했다.
그 어색함이 우리들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다.
젓가락이 식탁에 한 번 탁- 하고 부딪히는 어색한 소리만 났다.
그 소리가 신경쓰여 애써 외면하던 그애의 모습을 바라봤다.
밝은 갈색으로 물들인 그애의 머리칼이 빛났다.
함부로 손을 뻗을 것만 같아서 조용히 밥그릇에 고갤 쳐박았다.
이번엔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으며 있는데도 신경이 쓰여,
결국 한 번 더 그애를 쳐다봤다.
젓가락을 잡고 있는 그애의 손가락은 참 길었다.
탁-
"나 먼저 일어날게."
결국 못 참고 먼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나의 등 뒤로 무언가 자꾸 꽂히는 듯 했지만 애써 외면한 채, 내 방으로 향했다.
나는 방 구석으로 들어가지도 못한 채 문 앞에 기대어,
내 손으로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를 엇가르며 깍지를 껴봤다.
절로 손끝에 힘이 들어갔다.
"...나 나갈테니까.."
"...!.."
"밥 마저 먹어. 식탁 안 치웠어."
"......."
갑작스레 문 뒤로 들려오는 나긋한 목소리가 간을 쿡 하고 찔러왔다.
충동적인 맘으로 내 방문을 벌컥 열어버리고는 나를 향해 뒤돌아선 그애에게 입을 떼지 못했다.
덜덜 떨리는 입술로 뭔가 입모양을 만들어내려 하지만, 소리는 밖으로 잘 나오지 않았다.
"...가... 가..지...."
![[EXO/루한/빙의글/단편] 4인용 식탁 | 인스티즈](http://file.instiz.net/data/cached_img/upload/3/4/b/34b3de7556418ceae2f2dd3eec062fe4.jpg)
"......"
'마' 자가 붙기도 전에 성큼 다가와서 나를 꽉 껴안았다.
생각보다 품이 단단해서 나도 모르게 살짝 몸을 기대었던 것 같다.
어깨츰에서 그애의 향이 새어나왔다.
그게 내 머리를 어지럽혀, 나도 모르게 그애 등에 손을 올려 꼭 붙들게 만들었다.
나를 부술듯, 강하게 끌어안은 팔이 내 입술처럼 덜덜 떨려오고 있었다.
"엄마 결혼하려고."
"...응?"
처음 엄마에게서 그런 소리를 들었을때는 조금 놀랐다.
그 말 자체 때문이 아니라, 남들보다 조금 더 가까운 우리 모녀 사이에서 그런 말이 나왔을때,
당황한 내가 더 놀라웠던 거다.
"역시 좀... 그렇니?"
"아니~이!... 아니야!
근데 어떤 사람?"
"뭐 그냥.... (웃으며) 평범한 아저씨."
그리고는 쭉 그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엄마가 행복한 얼굴로 내게 그 이야기들을 해주었을때는 마냥 기뻤다.
드디어 엄마도 새 출발을 하는 구나,
나도 남들처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생기는 구나.
하지만 난 엄마와 처음 아저씨를 만나자 마자, 생각이 바뀌었다.
"......"
"아 참, 너한테 얘기 해준다는 걸 깜빡했다.
아저씨도 아들이 있어."
![[EXO/루한/빙의글/단편] 4인용 식탁 | 인스티즈](http://file.instiz.net/data/cached_img/upload/a/9/f/a9fe5489589d2d63f290e11e683fa81f.jpg)
그렇게 마음의 준비도 하기 전에 맞딱드린 얼굴은 참 허여멀건 했다.
내가 평소 좋아하는 남자다운 느낌이 아닌 '소년' 이었음에도,
내 속은 쿵쾅거려 멀미가 날 지경이었다.
앞으로 한 집에서 살거라는 말에 머리마저 아파오는 듯 했다.
말하기 우습지만, 그렇다.
난 그애한테 첫 눈에 반해버렸다.
그것도 엄마의 남자를 소개 받는 자리에서.
우린 아무 말 없이 거실 TV 앞에 앉아서 멍하게 있었다.
언제 엄마가 돌아오실까 불안했지만, 평소보다는 훨씬 편안했다.
그애의 손이 너무 따뜻했기 때문이다.
"오늘 춥다.."
"......"
TV 소리를 뺀 정적을 먼저 깨버렸다.
그애의 상냥한 눈이 나를 향하자, 난 시선을 내려버렸다.
내 옆에 앉아있던 그애가 내 뒤로 와서 나를 꼬옥 안아줄 적에는
정말이지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아 꼼짝도 못했다.
"...언제 오신대..?"
"...9시."
"......"
가만히 나를 뒤에서 끌어안고 있던 그애가,
고갤 옆으로 기울여 나를 바라볼 적에는
무언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아 눈을 피하지 않았다.
하지만 곧 그 말을 듣자마자, 난 속눈썹을 내렸다.
"...그런데 나를 붙잡으면 안되지."
"......"
내가 밤마다 그애 생각을 하면서 야한 짓을 한 건, 그때부터였다.
샤워를 마치고 내 방으로 들어가려다, 그애 방 문 앞에서 걸음이 멈춰졌다.
돌아서려다, 문 너머로 그애 숨소리가 들려왔다.
"흐읏...."
그건 그냥 잠꼬대 같은 소리가 아니었다.
난 머릿 속에 저절로 그애의 모습을 떠올렸다.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문을 열어 보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다.
"...무슨 생각해?"
"....아니... 아니야."
하마터면 '야한 생각' 이라고 말하려다, 입술을 잘끈 씹었다.
기울였던 고갤 들며, 다시 나를 꽉 끌어안아왔다.
그리곤 내 등에 자신의 머리를 기댄 채로 내게 물었다.
"..언제부터였어?"
"........너 처음 봤을때부터."
"......"
그 생각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다만, 내 말이 고백처럼 들리지는 않을까 싶어 불안한 것이었을 뿐.
그애는 아주 아픈 얼굴로 웃으며 다시 고갤 기울여, 나와 눈을 마주했다.
![[EXO/루한/빙의글/단편] 4인용 식탁 | 인스티즈](http://file.instiz.net/data/cached_img/upload/f/f/5/ff5cf6c4e3ce09b54a73f7499f158d50.png)
"...나도."
말은 했지만, 그애와 나는 더 이상 어쩌지를 못했다.
그저 서로를 멍하게 바라보며, 서로의 몸을 더 꼭 끌어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애는 내 생각과 같은 말을 했다.
"...나는 잘됐다고 생각해."
"......"
"난 아빠 사랑해.
그래서 만약 우리가 먼저 만나고,
그 분들이 나중에 만났다고 하면..."
난 날 끌어안은 그애의 팔을 꼭 붙잡으며 말했다.
"..알아."
"......응."
그리고는 한참동안 말이 없었다.
그냥 시간이 이대로 멈췄으면.. 이라는 말이 정말 와닿는 기분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있지 않았던 건, 아마 서로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선을 넘을까봐.
다신 돌아오지 못할 선을 넘을까봐.
"...너는 뭐 좋아해?"
"......"
"뭐 좋아하는 거 없어?"
".....지금은..."
"...?"
"...지금은 이상한 말 나올 것 같으니까
나중에 떨어져서 다시 물어보자."
내 말을 알아들은 건지, 그애는 피식 웃었다.
그리고 엄마와 아저씨가 돌아오신 얼마 후,
엄마의 제안으로 우린 가족사진을 찍으러 외출에 나섰다.
사진관으로 가는 차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애써 외면하며 창 밖만을 바라봤다.
백 미러로 우리 둘을 본 아저씨가 먼저 입을 여셨다.
"너네 말 좀 해라.
한이 너는 평소에 잘도 떠들면서..."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었지만,
차 안의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다.
우린 부모님 앞에서 차마 서로를 볼 수가 없었다.
거의 다 온 것 같다는 엄마의 말에, 차 안은 그제서야 조금 긴장이 풀린 듯 했다.
"어서오세요~"
인상이 푸근한 아저씨가 우릴 맞이했다.
부모님께서 먼저 문을 통과하시고 내가 들어서려하자,
그애가 뒤에서 유리문을 잡아주었다.
그애 얼굴을 나도 모르게 올려다봤다.
"가족사진 찍으려고요."
엄마의 목소리에 나는 조용히 그애에게서 눈을 뗐다.
사진관 아저씨가 부모님을 앞 의자에 앉히시고, 우리를 뒤로 세우셨다.
사진을 찍으려는데 우리 둘을 향해 말씀하신다.
"뒤에 두 분! 좀 가까히 붙으세요~"
"......"
"뭐해, 빨리~"
엄마의 재촉에, 나는 한발자국 옆으로 다가갔다.
아저씨가 앵글을 확인하시며 말씀하셨다.
"자, 찍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그애가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리고는 내게 조그맣게 입모양을 보여주었다.
![[EXO/루한/빙의글/단편] 4인용 식탁 | 인스티즈](http://file.instiz.net/data/cached_img/upload/7/6/d/76dd7364c092280d235a042427ca20f5.jpg)
"우리 처음 찍는 사진이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