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가 걸오 도련님께 결례를 저질러도 될련지요?"
"난 계집질 하는 취미는 학을 뗀 지 오래인데, 무슨 연유로?"
"도련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물 자식?"
"연모하는 사내에게, 이 초선이는 모든 것을 걸기로 하였사옵니다."
"대물이 초선의 머리를 올려줄 단 하나뿐인 지아비이다? 혹은 기둥서방?"
"둘은 천지차이인 게지요."
"본론부터 말하겠습니다."
"도련님을 보는 걸오 도련님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서요."
"대물 도련님을 마음에 두셨습니까."
"글쎄다. 내가 그 놈을 왜,"
"그렇다면 이년의 협박은 곧 경고입니다."
"어련하시겠어. 끝까지 듣고,"
"제 입김 하나면 걸오 도령을 반궁 밖으로 내쫓을 수 있단 뜻입니다."
"계집, 말 하는 꼴하고는 물귀신 못지 않게 오싹하구나. 대물 녀석은 어떻에 이 불여우를 구워삶았지?"
"불여우라니, 옳지 않습니다."
"너야말로 옳지 않다. 과하기 짝이 없지."
"네가 지지리도 싫어하는 장의를 등에 업고서라도 날 견제해보겠단 게냐."
"그럴 필요 없으니 물러나. 난 노론과 엮기는 게 굉장히 불쾌해. 그깟 대물 하나로 내 인생을 족치기 싫어."
"허나 네년은 대물 옆에 근접하지 못했으면 좋으려만?"
"대물은 초선의 사치를 부양할 능력 못 된다. 자기 하나 챙기기 급급해 구사일생 살아난 사내에게 짐이 되고 싶나?"
"그런 건 상관 없습니다."
제 스스로 도련님께 거리를 두고 있으니까요.
저는 그저, 투자를 할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불여우가 아니고, 꼬리가 열댓개 되는 십미호라는 호칭이 더 좋습니다."
저에 비해 겨우 불여우란 연약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이보세요, 걸오 도련님. 이 계집은 치마단 아래로 스쳐 보이는, 남정네들을 홀릴 꼬리를 감추고 있답니다.
제 꾀임이 통하지 않는 남자는 오로지 대물 도련님, 제 일생일대의 목표입니다.
"걸오 도련님이야말로 제 도련님 출사길에 해가 되시는 인물입니다."
"고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사옵니다,"
"도련님의 곁에서 떨어지세요."
"아니 그런다면 걸오 도련님께서 '지지리도' 싫어하시는 노론과 엮기게 될 테니까요."
"망나니 짓으로 아버님의 체면에 먹칠을 하고 싶진 않으시겠지요."
이미 더럽힐 대로 더렵혔겠지만. 하물며 걸오 도련님이라도 반궁을 나갈 의사는 없으리라 믿습니다.
"……."
"아직 전 걸오 도련님을 엎을 패는 들지 않았습니다."
"소녀의 말이 과했다면 용서하세요. 이 년 질투심에 멀어, 눈꼴 시린 경쟁자들을 제거하고 싶은 심정이니 통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걸오 도련님도 알잖습니까. 반사랑을 하는 우리는 공통점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길로 사모하는 여인의 마음의 반쪽이라도 헤아려 보시지요.
저는 누가 노리든 원하는 것은 얻고 맙니다. 사랑은 쟁취하는 것입니다. 기생으로 살면서 배운 건 그 하나랍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장안의 명기, 초선이 아니야?"
"모란의 향을 맡은 충蟲들이 꼬이는 군요."
"초선이! 지금 나를 벌레라고 칭하는 겐가?"
"그럴리가요. 여림 도련님께서 잘못 들으셨겠지요. 도련님을 비롯한 충忠신들을 뜻하는 언입니다. 그럼 소녀는 이만. 결례가 많았습니다 도련님."
눈치가 말짱 꽝일 리 없는 여림은 그저 눈웃음으로 받아져추곤 말을 잇지 않는다. 초선의 기운이 매서웠으니 여림이 깝죽대었다간 화만 불러일으킬 듯 해 보였다.
초선이 걸오의 곁을 스쳐 지날 때 속삭였다.
서늘한 바람같이, 황혼의 꽃나비같이.
'안녕히 계십시오, 홍벽서 나으리.'
"걸오, 보아하니 눈으로도 쌈박질 벌일 모양이던데 자네에게 초선이 뭐라하던가?"
"두고두고, 오래 볼 사이라더군. 재미 없지만 기생년과 줄다리기나 하게 생겼어, 제길."
접선을 펄럭이는 태형은 요염한 초선의 뒷태를 훑다 싱긋 웃었다.
"그 아이, 오늘 행색이 아주 화려해. 오늘을 벼르고 벼르다 온 모양이야. 눈꼬리가 아주 하늘 아래 모든 남정네들을 홀릴 지경이로이. 역시 천하의 초선이일세."
"다홍 치마 안 속에 코박고 죽고 싶네만 이번 생은 그럴 운명이 아니라 아쉬워."
"대물은 그 대단한 초선이를 보고 묵묵부답이니 내 속이 다 답답할 수 밖에."
"선비 중 선비인 대물을 꼬시려고 드는 기생들을 견제하려고 초선이 직접 대령한 게 아니 한가?"
"게다가 필시 대물이 초선보다 가랑을 더 신경 써서 화가 난 상태일세."
"걸 네가 어찌 알아."
"다 지켜보고 있었다- 이 여림이 말야."
초선은 꽤 분함을 못 이긴 얼굴이더군.
그렇지 않고서야 대물이 선물한 비녀를 꽂고 왔을까. 마치 연인의 사생녀를 짓밟으려는 모습이었다. 남자에 눈이 멀어서 쌍심지를 켠 천하의 초선이 토자린 모란 마냥 붉었다.그녀의 다홍 치마는 누구보다 붉고 아름다웠으며 질투의 대상이었다. 그런 초선이 연모하는 도령은 초선의 마음의 절반이라도 아려나.
"생긴 대로 살아야지, 보기보다 귀여운 구석이 있네."
"그 말인 즉슨, 자네, 걸오! 초선이에게 마음이 있는 건가! 안 되네! 초선은 대물 밖에 모르는 바보천치일세!"
"뭔 똥같은 소리야. 야! 달라붙지마! 꺼져-!"
"난 오래 전부터 자네를 연모하고 있네. 초선이가 아닌 나를 탐해주시게나. 육담집에 자네를 그려넣고 싶어."
"미친놈. 다른 년놈은 건드려도 넌 절대 안 건드려."
"왜? 난 왜 안 된단 말이오? 섭섭하기 짝이 없네. 난 자네의 죽마고우, 양물도 본 사이 아닌가!"
"그래서 더 안 된다! 기분 나쁘게 예쁜 자식은 대물 하나로면 족해."
"칭찬인가?"
"농이다 이 자식아."
"감동…. 입술에 진하게 뽀뽀 하나라도 해줌세. 이리 오게! 오늘따라 자네의 품에서 흥청망청 하룻밤을 보내고 싶어."
퍽. 결국 윤기의 주먹에 턱을 맞고 날아간 태형. 중이방 앞마당에 엎어져 감동 서린 눈으로 쳐다보는 태형이 윤기는 징그럽기만 하다. 변을 당하고도 야시시하게 낄낄 대는 태형에게 기겁한 윤기는 풀어헤친 옷섬을 주워 입었다.
태형이 오고 시끄러워진 한편, 비단 그녀의 질투라 해도 윤기는 그녀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오늘만이 날이 아니니 어떤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지 위태롭다. 오늘이란 날이 묶어 엮기게 된 연이 재수 없으리라 생각했다.
'안녕히 계십시오, 홍벽서 나으리.'
'내가 홍벽서란 것을 알고 있으렷다.'
둘 다 숨기는 패가 동일한 것 같았으니 말이다.
진흙이 묻은 옷을 삐죽 입을 내민 여림이 잔여물을 털어내다 무릎을 집고 과장된 몸짓으로 일어난다. 곧이어 접선을 촤락 피더니 바람을 불러일으키며 천역덕스레 여유를 부린다.
"가랑은 부용화와 만담을 피우느라 정신 없고, 헌데 대물 녀석은 어디로 갔는가?"
"곧 날이 쏟아질 것 하이, 둘 다 폭삭 빗물에 젖어버리겠구먼."
-성균관 스캔들 각색본 방탄 ver 연재한다면; 간단한 조각,
파란만장, 조선 성균관 유생들의 사연들.
너무 어렵나요… 연재를 하면 용어 정리도 쉽게 해드릴 건데 어렵다면 다시 고민을….
전 예전에 고려 시대 배경으로 어떤 글을 연재한 적이 있어 많이 어렵지는 않으나… 이 시대사를 꿰뚫어봐야 해서 어려움이 있네요.
이게 스토리 중간에 잘라서 아마 어렵게 보이겠죠? 괜찮… 우리 함께 다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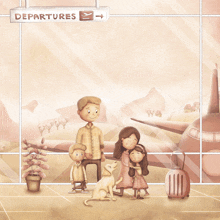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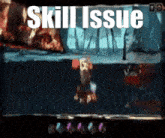
 생선회는 아닌 회... 다 드실 수 있나요?
생선회는 아닌 회... 다 드실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