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뷔홉] 자기야 下 | 인스티즈](http://file.instiz.net/data/cached_img/upload/e/3/f/e3f01793e4f587aca7d7ac637666cec6.gif)
![[방탄소년단/뷔홉] 자기야 下 | 인스티즈](http://file.instiz.net/data/cached_img/upload/d/b/3/db3c63de16f6aba2a9c795a489f6d7ff.gif)
「싫어하는 척 하긴.」
정호석이 배시시 웃었다. 내가 그렇게도 좋아하던 천진난만한 미소에, 어느 순간부터 어린아이의 순진함과 농염한 색기가 공존하게 된 까닭을 나는 아직까지도 알지 못한다.
*
정호석은 다음 날 바로 짐을 챙겨 무작정 내 자취방으로 들어왔다. 한 켠에 얼마 되지 않는 짐보따리를 덩그러니 놓아 둔 채로, 황망하게 그저 정호석을 바라보고만 있는 나를 바라보며 정호석은 말했다.
오늘 아침은 뭐 할까?
예전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일상이었다. 연애하던 때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를 않았다. 같이 살게 된 이후부터 정호석은 마치 제가 내 안사람인 양 행동했다. 학교를 다녀오면 정호석의 저녁밥이 기다리고 있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호석의 아침밥이 기다리고 있었다. 원래 아침밥을 먹지 않았으나 나는 아침밥을 먹는 것이 습관처럼 굳어지기 시작했다. 정호석은 내 방이 너무 더럽다며 주말 한낮에 제 소매를 걷어붙이고는 청소기와 걸레를 집어들었다. 학교를 다녀오자 몰라보도록 깨끗해진 방은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또한,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무서웠다. 정호석을 밀어내지 못하는 내 자신이, 그리고 익숙함이라는 형태로 내게 점점 스며들어오는 정호석이.
「날도 좋은데 밖에 놀러갈래?」
「…….」
모지게 말을 하고 정호석을 당장이라도 이 방에서 내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정말로, 나는 정말로 그러고 싶었다. 하지만 고개를 돌려 바라본 정호석의 얼굴은 아이마냥 순진했고 여름날의 연둣빛마냥 싱그러웠다. 아주 잠깐이었으나 나는 정호석에게서 내가 한 점의 다른 감정조차 없이 순수하게 사랑했었던 정호석을 보았다.
나는 정호석을 보면 무너져내렸다.
어느 상황에서건 그러했다. 어쩌면 이미 알고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정호석의 얼굴에는 아름다움이, 천진함이, 퇴폐가, 전부 묻어나왔지만 또한 애잔함이, 그리고 가련함이 있었다. 정호석을 이루는 모든 요소가 내게는 지독한 처연함으로 다가왔다. 그 처연함은 나를 집어삼키고 나를 물들였다. 정호석 없는 일상이 이제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공허해지고 있었다.
「태형아아.」
정호석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정호석이라는 인간에 중독되어 버린 것 같았다.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할 수 없는 자신을 김태형은 알고 있었으나 소용 없는 거부를 김태형은 계속해서 시도했다. 마음을 완전히 열고 그대로 정호석을 제 품에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도 위태로워 금방이라도 깨져 버릴 정호석이 김태형은 무서웠다.
애증의 클리셰, 마치 마약 같은.
정호석을 과다복용했다. 지나친 과다복용에 현기증이 올 것만 같았다. 독한 부작용을 수반하는 정호석을 김태형은 들이마시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으나 어느새 폐부 깊숙이 파고든 정호석은 김태형을 좀먹고 잠식했다. 끊으려 시도했고 끊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결코 끊을 수 없고, 뒤돌아서면 갈구하게 되는.
「씨발…….」
너무도 사랑했으나 너무도 미웠다. 정호석이.
*
시간은 정처 없이 흘러만 갔다. 정호석은 점점 추락했고, 타락했으며, 퇴폐되어 갔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아름다워져 갔다. 끝을 보일수록 짙게 피어오르는 잔인한 아름다움은 정호석을 끝내는 완전히 삼켜버렸다. 정호석은 여전히 사랑스러웠으나 그 예전의 싱그러운 아름다움을 잃은 지는 오래였다. 정호석은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은 탐욕이었고, 집착이었으며, 새빨갛게 타오르는 정열이 아니라 새카맣게 가라앉는 끈적임이었다.
그리고 그런 정호석을 김태형은 사랑했고 또한 증오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랑의 깊이는 깊어졌으나 그 의미는 퇴색되어 빛을 잃었다.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증오인지도 인지할 수 없을 만큼 얽히고설킨 실타래 같은 감정의 소용돌이에 김태형은 휩쓸렸다. 그런 자신이, 정호석을 밀어내지 못하는 자신이. 김태형은 혐오스러웠다.
*
「자기야.」
나른히 누워 자기야.
「자기야.」
끊임없이 김태형을 갈구하고 원하는, 그리고 누구보다도 김태형이 자신을 놓지 못할 거란 걸 아는 정호석.
「나 사랑해?」
「씨발, 그만하랬지.」
부러 도발한다. 태형의 속을 살살 긁으며 저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도록.
태형이 제 앞에 놓여 있던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는 호석에게로 눈을 돌렸다. 멀쩡한 의자를 놔두고 바닥에 쓰러지다시피 몸을 기대고 앉아 자신을 올려다보는 호석의 표정에서는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었다. 그저 꿈결 같은 웃음만을 입가에 걸친 채로 호석이 도르륵, 눈동자를 굴렸다.
태형아, 너 나 사랑하잖아. 왜 솔직해지지를 못해, 불쌍한 내 남자…. 그냥 사랑한다 말하고 한 번 안아주면 될 것을, 왜 나를 이토록 쥐어짜고 아프게 해. 파멸에 이르러도 둘이면 기꺼이 한 발짝 그곳에 다가설 수 있는데, 너는 왜 그러질 못하니. 파멸이 무서워? 추락이 두렵니? 그러지 말아, 나의 가련한 어린아이. 함께라면 무엇이든 두려울 것이 없는데 너는 왜 지레 겁먹고 다가오지를 못 하는 거야.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는데.」
너한테 왜 이러냐고?
「언제까지 이럴래.」
글쎄, 태형아…
분노와 안타까움이 그득 묻은 목소리는 애처롭게 떨렸다.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는지도 알 수 없을 만큼 피폐해져 버린 정호석을 김태형은 증오했고 또한 미치도록 사랑했다. 호석의 갈 곳이 없는 듯 이리저리 굴러가던 눈동자가 태형의 눈동자와 정면으로 마주쳤다. 동글동글, 선하고 고운 얼굴에 배인 어딘지 모를 퇴폐에 태형은 숨이 막히는 듯 했다.
마주친 태형의 얼굴에서 호석은 자신을 향한 열망을 읽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을 향한 경멸과 증오를 읽었다.
태형아, 사랑하면 그냥 손을 뻗어서 움켜쥐어. 깨지든, 망가지든. 그 사랑이 어떤 형태로 변하든 일단 그것을 손에 잡아 가두면 사랑이라는 본질은 미약하게나마 네 것으로 남아 있게 마련이야…
「언제까지 이럴 거냐고?」
호석이 웃었다.
태형아. 쥐어, 꽉. 내가 더 이상 발버둥치지 못할 만큼 세게, 으스러지도록.
「자기야, 무슨 소리야.」
호석이 눈을 느리게 감았다 떴다. 웃음기는 어느새 울음기와 섞여 묘한 표정을 자아내고 있다.
「날 이렇게 만든 건 너야.」
-자기야, 完


 초록글
초록글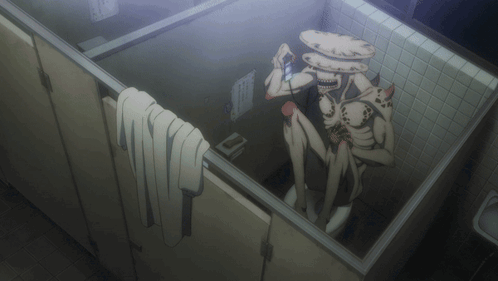

 와 말할수없는비밀 손익 80만이래
와 말할수없는비밀 손익 80만이래